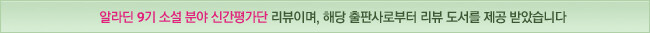[천 명의 백인신부]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천 명의 백인신부]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천 명의 백인 신부
짐 퍼커스 지음, 고정아 옮김 / 바다출판사 / 2011년 7월
평점 :

절판

어린 시절 나의 책받침과 연습장 표지, 그리고 방안 벽면을 줄곧 차지했었던 여배우 “피비 케이츠(Phoebe Cates)”가 영화 <파라다이스(1982)>에 출연할 당시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베드윈 족장이 낙타 25두와 양 100마리로 여주인공 피비 케이츠를 사겠다는 제안을 했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아내를 돈이나 가축으로 사는 일이 중동과 아프리카 유목 부족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니 문화적인 차이 면을 감안한다면 그런 제안을 영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 어린 마음에 이 기사를 읽고 나도 피비 케이츠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볼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다 - 도 이겠지만. 그런데 미국 서부 개척 시절 한 인디언 부족이 백인 정부에 천명의 백인 신부들을 말 천 필과 평화를 댓가로 달라고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요구는 거절되고 아메리카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대학살로 이제는 보호 구역에 갇혀 지내는 소수 민족들이 되어 버렸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인디언들의 요구대로 백인 신부들이 인디언들에게 보내졌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이겠지만 소설적 허구로는 충분히 이야기꺼리가 될 만한 그런 재미있는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상이 실제로 소설로 만들어졌다. 바로 “짐 퍼거슨”의 <천명의 백인 신부(원제 One Thousand White Women /바다출판사/2011년 7월)>이 그 책이다.
작가는 “저자의 말”에서 이 책은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진 전적으로 허구의 산물이라고 전제하며 이 소설의 씨앗이 1854년 포트 래러미에서 열린 평화 회담에서 북부 샤이엔 족의 족장이 미국 군 당국에게 천명의 백인 신부를 선물로 달라고 요청해왔고, 말할 필요도 없이 백인 당국은 요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평화회담은 결렬되고 샤이엔 족은 돌아갔으며 “당연히” 백인 신부는 가지 않았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소개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당연히” 안가는 것이 아니라 백인 신부들이 가는 데서 출발한다. 다만 시대적 설정과 등장인물들은 허구로 설정해서 말이다.
실제 사건보다는 20년이 지난 1874년 9월, 샤이엔 족의 ‘온화한 주술 대족장’ 리틀 울프는 백인들과 영원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부족 대표단을 이끌고 수도 워싱턴까지 기나긴 육로 여행을 했다. 국회 의사당 건물에서 열린 회담에서 족장은 말 천 마리와 평화를 댓가로 천명의 백인 신부를 선물로 달라고 요구한다. 당연히 회의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양쪽 진영은 일촉 즉발의 상황에까지 치닫게 된다. 간신히 수습되어 질서를 되찾은 후 샤이엔 족 대표들은 퇴장 - 위대한 족장은 그 선두에서 당당하게 걸었다 - 하고, 그날 밤 워싱턴에 이 불경한 제안이 퍼지면서 시민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아내와 딸들의 외출을 금지했으며 도덕적 분노가 가득한 선언을 한 하원과 이교도에게 팔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행정부의 재빠른 반응이 이어지고 이틀 뒤 분노한 시민들의 조롱과 야유를 뒤로 한 채 리틀 울프 일행은 수도를 떠난다. 실제 역사라면 이 시점에서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흥미로운 - 실제였다면 말도 안 되는 -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난다.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샤이엔 족의 신부가 되겠다고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자문위원들이 실용적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각의 다른 장관들 또한 이런 계획이 ‘인디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옹호하면서 결혼 계획이 은밀히 추진된다. 리틀 울프 족장이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난 1875년 3월 초 샤이엔 족의 신부가 되겠다고 자원한 백인 여성 1차 지원단 48명은 기차에 몸을 싣고 철저한 비밀에 싸인 채 북부 대평원을 향해 워싱턴을 떠났다. 이렇게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프롤로그”가 끝나고 시작되는 본문에서는 백인 신부단의 일원인 25세 “메이 도드”가 쓴 일기 형식으로 기차를 타고 인디언 마을로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미천한 신분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메이는 자유 - 아이 한 명을 낳아주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조건 - 를 위해 샤이엔족에게 가기로 결심하고 기차에 오른다. 여행 중 인솔자인 버크 대위에게 연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인디언 마을에 다다른 메이는 신부 선택에서 대족장 리틀 울프에게 선택되어 그의 부인이 된다. 이미 두 명의 부인이 있던 울프 족장은 메이에게 둘째 아내의 시중과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맡기게 되고, 메이는 행복한 시간들과 때론 위기의 시간들도 겪으면서 서서히 인디언 사회에 동화(同化)한다. 그러나 평화와 두 문명의 연결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인디언 신부계획은 인디언들의 캠프 근처에서 금(金)이 발견되자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으로 내몰기 위한 군대가 파견되면서 양 진영의 평화협정은 깨져 버리고, 계획 또한 1차에서 끝나버리게 된다. 진정으로 “인디언”들의 신부가 된 메이와 백인 여성들은 이런 현실에 가슴 아파한다. 과연 메이와 백인 신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소설의 장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역사 속의 어느 사건이 실제와는 다른 결말을 낳게 되면서 역사가 바뀌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 일종의 “가상역사소설(假想歷史小說, 또는 대체역사소설)로 볼 수 있겠다. 역사적 사실(Fact)에 허구(Fiction)를 결합한 "팩션(Faction)" 소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책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하는 가정을 전제로 했으니 엄밀히는 가상역사소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종종 팩션 소설들도 허구가 지나친 나머지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탈출해 유럽으로 건너와 특정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는 어느 소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겠다. 물론 예수의 부활(復活)을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 도 있으니 팩션 소설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장르 구분이야 어떻든 첫 시작인 <프롤로그>부터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 책은 주인공 “메이 도드”의 일기가 시작되는 본문에서는 도대체 인디언에게 시집을 간 백인 여성들이 어떻게 적응할까 하는 궁금증에 마지막까지 눈길을 결코 떼지 못하고 내처 읽게 만드는 참 재미있는 소설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너무나도 이질적인 문명(文明)에서 살다온 백인 처녀들이 인디언 부족과 결혼하여 동화하는 과정은 실제 역사가 아닌 이상 작가의 상상력과 가치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예컨대 서구 문명의 우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던가 아니면 인디언 문화의 신비로움만을 부각시키는 형식에 치우치기가 쉽고,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또는 억지스럽게 그려내기가 십상이었을 텐데 실제였더라도 책 속에서 묘사하는 여러 갈등과 위기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했겠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개연성이 느껴진다. 그렇다 보니 작가가 분명 허구임을 밝히고 시작했음에도 혹시 미국 정부가 애써 감춰온 실제 역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 - 인디언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이 꽤나 사실적이고 개연성이 있지만 첫 시작에서 메이 도드의 증손자 "J.윌 도드”의 <들어가는 글>에서 시작되고 본문이 3인칭 시점이 아니라 메이 도드의 일기 형식의 1인칭 시점으로 이뤄진, 소설의 “형식”적인 면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 이 들 정도인데, 출판사 소개글을 보면 독자들이 메이 도드가 실재 인물이냐는 물음에 작가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실망했다고 하니 이런 착각을 나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학살이라고 불러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인디언에 대한 박해를 고발하는 것일 수 도 있겠고, 세계화라는 명목하에 이제는 “지구촌(地球村)”이라는 명칭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국가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분명한 “차별(差別)”이 존재하는 현실을 과거 서부 개척 시절 인디언에 대한 박해와 무엇이 다르냐는 냉소로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 굳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고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작가인 “짐 퍼거스” 는 이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듯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고 하니 말이다. 아뭏튼 이 책,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 그래도 혹시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 그런 상상이겠지만 소설적 허구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또한 작가의 당부대로 굳이 어떤 의미나 감동 포인트를 찾을 필요 없이 이야기만으로도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