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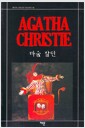
-
마술살인 ㅣ 애거서 크리스티 미스터리 Agatha Christie Mystery 52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정성희 옮김 / 해문출판사 / 1990년 6월
평점 : 


원제 -
They Do It with Mirrors, 1952
작가 - 애거서 크리스티
미스 마플의 소녀 시절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 아주 예전에, 플로렌스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던 시절, 마플에게는 친하게 지내던 자매가 있었다. 그 중 언니인 루스는 미국에서 살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활동적으로 지내고, 동생 캐리
루이즈 역시 세 번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조용히 영국에서 사회 활동을 하며 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플을 만난 루스는 얼마 전에 만난 동생 캐리
루이즈의 신변에 무슨 위험이 느껴진다고, 제발 동생을 봐달라고 부탁을 한다. 마플은 흔쾌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처음에는 캐리 루이즈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데 골치가 아팠다. 그녀가 입양한 딸이 남긴 딸 지나와
남편, 첫 번째 남편이 남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들, 두 번째 남편이 남긴 두 아들 그리고 자신의 친 딸까지 캐리 루이즈는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과 함께 소년원에 가야할 소년들에게 여러 예술이나 기술을 가르치면서 재활에 힘쓰고 있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두 번째
남편의 아들들이 지나에게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흐음, 친척끼리 결혼을 하는 나라이니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에서야
뭐…….
제목에 적혀있다시피, 이 소설은 실재와 환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도 한다. 그러니 눈으로 보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접한다.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남이 전해준 얘기, 외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
보지는 못하고 몰래 엿듣는 대화 같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생각하고 추측하고 판단한다. 과연 그것이 진실일 확률은 몇 %가 되겠는가?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믿고 싶지 않은 진실에 마주칠 수도 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말하고 있다. 의연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난 어떤 부류의 사람일지 잠시 생각해보았다. 음……. 난 어쩌면 회피하는 인간일지 모르겠다. 좋은 게 좋다는 주의니 말이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미스 마플이 호칭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다.
캐리 루이즈……. 미스 마플은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루스를 제외하고는 그녀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있어서 그녀는 언제나 캐롤라인이었다. 그리고 빌레버 양에게 있어서는 카라였다. 스티븐
레스테릭은 언제나 그녀를 마돈나라고 불렀다. 윌리는 그녀를 예의바르게 세러콜드 부인이라고 불렀으며, 지나는 그녀를 '그랜담'이라고 불렀다.
-84.p
문득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부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예로 들면,
조카들은 언제나 나를 '고모'라고 부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나 용돈을 받으면 '고모엄마'이다. 어머니는 나와 둘만 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시지만, 조카들이 있으면 '고모야~'라고 하신다. 고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시다. 동생은 '누나'이고, 오라버니는
'동생', 큰올케는 '아가씨', 그리고 작은 올케는 '언니'라고 부른다. 애인님에게는 '애기' 내지는 '자기야.' 이다.
문득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부르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이 나를 부르는 이름에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기대라든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라는 동요가 떠올랐다. 한 사람을 보는 입장에 따라 그를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개라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졌다. 난 남이 불러주는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아, 그래서 예전부터 철학자들이 중용과 조화를 중시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