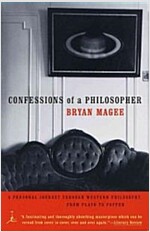
브라이언 매기의 <철학자의 고백>.
목차 페이지 다음에 (이것은 헌사도, 제사도 아닌 것이. 그러나 그것들의 형태로) 경고가 나온다:
"이 책은 철학, 그리고 철학사와 한 인간의 만남, 그 이야기를 통해 독자를
철학과 철학사로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책 속의 자전적 요소는 미디엄이지 메시지가 아니다."
the autobiographical element is medium, not message.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책을 꺼내 와선 이 문장 보고 다시 웃게 된다.
책 사고 받아봤을 땐 이 대목에서 하트와 웃음이 동시에 터졌었다. 아 맘에 든다... 최고다. 그러고 읽기 시작하면서는 좀 빠르게 실망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저 문장만큼은 나도 적어도 열 번은 (변주하는 것도 감안해서) 말로도 하고 쓰고도 싶다. 지금 이 얘긴 미디엄이지 메시지가 아니에요.
찾아보고 싶었던 내용은, 아마 비트겐슈타인에 본격 관심이 일던 무렵에 대한 회고였던 것같고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서 놀라던 경험. 철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대상을 오해한다. 전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사상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은 전혀 이해되지 못하면서 그 사상에 대한 해석, 논평의 전통이 수립되는 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는. : 대략 이런 얘길 하는 대목이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지금 책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깊이 공감하면서 뭔가 노트를 남겼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서, 검색해 보았으나 이것도 무결과.
사실 위의 정반대도 진실일 것이다. (꼭 철학에서만이 아니라) 합당한 이해를 받으리라고 결코 기대할 수 없을 무엇이 합당 혹은 그 이상의 이해를 받고야 마는 일. 인류 정신의 생산인 한 인류 정신의 유산이 되는 일. 그래서 인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일(도 실제로 종종...)
앞쪽의 예로 방금 생각나고 만 것이,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이 가사노동을 미화한다며,
열내던 어떤 논문. 영어권에서 바슐라르 연구가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가운데 눈에 띄는 연구들이 저런 방향이다. <물과 꿈>은 여성적 원소의 정복을 수행하는 가부장제. 바슐라르 = 전통적 철학자 = 가부장 편견. 김현이 거의 질투하며 공감했던 "독신자의 꿈"은 어디에?
어쨌든 조금만 공부가 깊어져도 해석, 비평의 전통은 완강한 편견의 전통이기도 하다고 알아보이는 때가 적지 않을 것같고, 그래서 매기의 위와 같은 말에 순간 깊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같다. 편견을 이해로 교체하고 싶다면, 전통의 바깥에서, 대상과 내가 직접 많이, 깊이 만나길 택해야할 것: 이런 얘기로 이 글을 끝내고 싶었는데 이보단 더 잘 말하고 싶었으나 더 잘 말할 수 있을 길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 그럼 이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