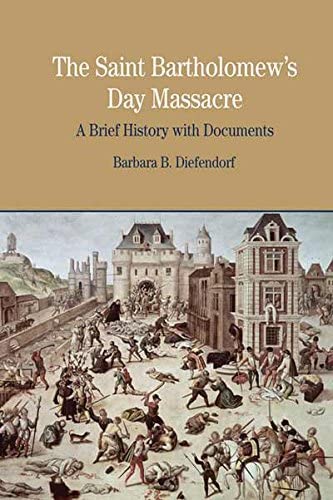
<인간희극>엔 발자크 당대 (혁명기부터 시작하여?) 파리가 배경인 작품들이 다수긴 하지만
역사소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카트린 드 메디치를 탐구하는 <카트린 드 메디치에 대하여> 이런 제목 소설도 있다.
이 소설은 세편의 단편들로 구성된 장편? 그런 형식. 그 세편의 단편들은 카트린 드 메디치에서 시작하여 (1편), 그녀의 시대에 정치적 삶을 살았던 어느 인물과 그의 가족의 짧은 역사 (2편), 대혁명 직전 파리에서, 눈밝은 사람이라면 메디치의 후예라 알아보았을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장 폴 마라의, 어느 귀족 만찬에서의 만남 (3편).
이 중 특히 3편의 결말.
.... 좋습니다. 발자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왕당파고 카톨릭 신자였고.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그 둘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경험의 전모에 열려 있는 정신.
그것의 한 예.
인간 경험의 전모에 열려 있다.
이건 작가에게는 반드시 장점이 아닐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다.
전모에 열려 있되 어느 한 경향으로 치우칠 때 뛰어난 작가가 되는 거 같기도 하다.
에드거 앨런 포와 멜랑콜리. 카프카와 (*이 빈칸을 채우시오). 버지니아 울프와 (*이 빈칸도 채우시오).
그런가 하면, 작가/예술가보다 오히려 학자의 경우, 특정 경향으로 치우침 없이 넓고 깊이 열려 있을 때, 그럴수록, 좋은 학자가 되고 좋은 저술을 남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듬.
문학이나 철학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거 같지만
사학은? 역사학자라면? 인간의 욕망, 시대의 변화, 사회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좁은 역사학자와 전혀 그렇지 않은 역사학자. 인간이 무엇을 추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나에 대해 민감하게 아는 역사학자와 아닌 역사학자. .... 누구냐에 따라 정말 전혀 다른 역사들이 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