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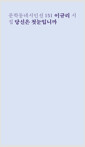
-
당신은 첫눈입니까 ㅣ 문학동네 시인선 151
이규리 지음 / 문학동네 / 2020년 12월
평점 : 


이규리의 시집은 처음 읽는다. 시집을 읽으면서 이규리만의 독특한 울림, 단어로 써놓고 보면 별 특색 없이 다가오지만 이이의 문법을 통해 전해지는 고독, 고통, 죽음, 상실, 불확실, 단절 등 삶의 비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는 발견했다고 오해했을 수도. 그리하여 시집의 총량은 매우 우울. 무엇이 시인을 우울하게 만들었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시집을 다 읽고 마음속에 허탈과 허무의 후유증이 남는다면 그건 문제일 수도 있다.
이이를 소개하는 많은 자료가 시인의 생년을 밝히지 않았으니 나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이의 연배가 둘째 누나 정도인 걸 알고 조금 놀랐다. 요즘 젊은 시인인 줄 알았다가. 시인으로 등단을 좀 늦게 해서 그런 듯.
상자
상자들을 두고 그들은 떠났다
아래층에 맡겨둔 봄을
아래층에 맡겨둔 약속을
아래층에 맡겨둔 질문을
아래층에 맡겨둔 당신을
아래층이 모두 가지세요
그 상자를 나는 열지 않아요
먼저 온 꽃의 슬픔과 허기를 재울 때
고요히 찬 인연이 저물 때
생각해보면 가능이란 먼 것만은 아니었어요 (전문)
하여튼 내가 읽은 바는, 그들이 떠나 이제 이 집 또는 건물에는 나 혼자 남았다. 그들은 가버리고 ‘나’한테 적어도 네 개의 상자가 남았는데 ‘나’는 그걸 열지 않는단다. 봄, 약속, 질문, 당신. 즉 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거의 모든 것 중에서 ‘나’에게 남겨진 부분들. 그들도 봄, 약속, 질문, ‘나’의 일부분을 다른 상자에 담아 가져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나’한테 남아 있는 것들도 모두 아래층에 맡기고는 그냥 가지라고 해버린다. 인연이 저물 때, 그들과 ‘나’ 사이엔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나’는 이제 봄, 약속, 질문 등의 친밀한 이미지가 제외된 완벽한 고독과 폐쇄에 놓이게 된다. 이래놓고 가능이란 꼭 멀지만은 않단다. 즉 발 끝에 이런 벼랑이 놓일 수 있다고? 아, 나의 시 독법은 여전히 유치하구나.
이 시에서 의문 하나. “고요히 찬 인연이 저물 때”에서 ‘찬’은 무슨 뜻일까. 가득은 아니지만 빈 곳을 어느 정도 채운 상태[盈]일까 아니면 냉정한 인연일까.
이번엔 표제 시 <당신은 첫눈입니까> 전문을 읽어보자.
당신은 첫눈입니까
누구인가 스쳐지날 때 닿는 희미한 눈빛, 더듬어보지만 멈칫하는 사이 이내 사라지는 마음이란 것도 부질없는 것 우린 부질없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친 일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낱낱이 드러나는 민낯을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날 듯 말 듯 생각나지 않아 지날 수 있었다 아니라면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더욱 부질없어질 뻔하였다 흩날리는 부질없음을 두고 누구는 첫눈이라 하고 누구는 첫눈 아니라며 다시 더듬어보는 허공, 당신은 첫눈입니까
오래 참아서 뼈가 다 부서진 말
누군가 어렵게 꺼낸다
끝까지 간 것의 모습은 희고 또 희다
종내 글썽이는 마음아 너는,
슬픔을 슬픔이라 할 수 없어
어제를 먼 곳이라 할 수 없어
더구나 허무를 허무라 할 수 없어
첫눈이었고
햇살을 우울이라 할 때도
구름을 오해라 해야 할 때도
그리고 어둠을 어둡지 않다 말할 때도
첫눈이었다
그걸 뭉쳐 고이 방안에 두었던 적이 있다
우리는 허공이라는 걸 가지고 싶었으니까
유일하게 허락된 의미였으니까
저기 풀풀 날리는 공중은 형식을 갖지 않았으니
당신은 첫눈입니까 (전문)
뭐 눈이 다 그렇지. 보기엔 좋은데 더듬어보는 순간 부질없이 녹아버리는 것. 그리하여 시인에게 눈, 특별히 첫눈은 부질없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 이 시를 굳이 소개하는 건, 시집에서 이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의 정체를 고통스럽게 날것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참아서 뼈가 다 부서진 말’로 이규리는 ‘슬픔’, ‘허무’, ‘우울’, ‘어둠’을 꺼내고 그걸 첫눈인 것처럼 뭉쳐 자신의 방에 두었다고 한다. 부질없는 슬픔, 허무, 우울, 어둠.
하긴 시인에게 나이가 무슨 대수냐. 이게 2020년 12월에 출판한 시집이니, 시인의 연륜 역시 대단한 공력을 지녔을 때. 이미 세상을 살아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시인은 마치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보였던 ‘힘든 것’들의 소묘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시 연배 탓일까, 다행스럽게 이규리의 시들은 심지어 내가 읽기에도 그나마 무난하다. 기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시집에 실린 시들 가운데 어느 하나 우울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때는 섬뜩하기도 하다. 예컨대.
종이꽃
순두부를 뜨는데
태어나기 직전의 말랑말랑한 목숨
슬픈 익명이
미끄러진다
그때, 이렇게 몽글몽글했을까
순두부를 뜰 때면 숟가락을 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미끄러진 태아에 대해 생각해
희고 말랑한 것 말갛고 혹한 것
순하지 않은 순두부
울음을 터트린 순두부
말랑말랑한 볼을 하나 둘
꼬물꼬물하는 손가락을…… 아홉 열, 가시덤불에 던졌으므로
나는 열 번 형장에 올라야지
열여섯은 파랑 서른둘은 격랑
아들은 99.9퍼센트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구름의 손으로 떨어뜨린 글자
누군가 서류를 쓰윽 들이밀며
이들은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낙하 혹은 낙화
종이꽃은 꽃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었는데
몽글몽글 순두부
아마포가 나를 확 덮어버리는데 (전문)
아, 나 순두부 좋아하는데(하긴 싫어하는 음식 있으면 세 개만 대봐라). 이 시를 잊을 때까지는 순두부를 먹지 못할 거 같다. 순두부가 ‘태어나기 직전의 말랑말랑한 목숨’이라니. ‘순두부를 뜰 때면 숟가락을 피하는 것’이고, 순두부가 출산 직전의 목숨이라면 숟가락은 뭐? 나중에 열 번 형장에 올라야 한다니까 아이를 세상에 억지로 꺼내는 겸자도 될 수 있고, ‘낙하 또는 낙화’라고 했으니 낙태수술 할 때 쓰는 이상하고 끔찍하게 생긴 도구일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 나오려는 목숨을, 마지막 연을 보라, ‘아마포가 나를 확 덮어버’린다고 했다. 여기서 아마포는 당연히 숨이 멎은 다음 얼굴에 씌우는 천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순두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애초에 이 시집에서는 즐겁거나 행복한 결합은 없다. 이규리의 결합 방식을 보자.
거즈의 방식
진물이 말라붙은 거즈를 보면
그들은 어느새 한몸이 되어 있다
굳이 누가 원했다 하기에도 좀 애매하다
그렇게 말도 없이 애를 낳고 살림을 차리고
시간이 지나면
의미는 쏙 빠지고 이야기만 남지 않을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데려와 생각날 때마다 흔드는 이들은
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누구나 불행한 상처만 기억하니까
불행할수록 기억이 많아지니까
마데카솔 광고는 처음처럼 돌아온다 돌아온다는데
누구라 처음을 알까
고쳐 앉으며 돌아누우며 비루한 지상의
상처를 믿어보는 것
영리한 사람은 기억하고 선량한 사람은 이해하겠지
물집이었던 시간에
칸칸 세 들어
우린 이전을
이미 살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전문)
한 몸이 돼도,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이어 진물이 흘러 거즈를 가져다 붙여야 한 몸이 된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붙은 진물과 거즈마저 의미가 없어지고 이야기만 남는다고 주장하는데, 시인도 둘이 한 몸 되어 살아봤을 터, 나 같으면 이야기도 없어지고 현상만 남았다고 할 듯. 그러나 독자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시인은 세월이 흘러봤자, 자기들이 상처고, 진물이고, 거즈였을 때도 알고 보면 그저 각자가 맺힌 물집에 불과했었다고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이규리의 시들은 내게 덜 낯설었다. 심지어 비록 오독misreading이겠지만 시를 읽고 말하고자 하는 걸 찾아내려고 하기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내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다. 시들이 과하게 고통스러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이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 다만 시인은 나 같은 독자도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