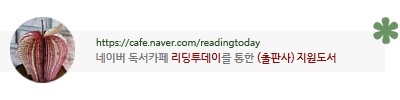수확자
닐 셔스터먼 (지음) | 이수현 (옮김) | 열린책들 (펴냄)
죽여야 한다.
어떠한 편견도 악의도 없이
-수확자, 표지글에서
"올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은 죽음을 전혀 예상되지 않는 순간에 대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얘기한다. 남녀노소, 나이와 성별의 차별도 없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도 없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런데 죽음마저 정복된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죽음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저주일까, 축복일까.
현실의 우리는 재물을 산처럼 쌓아도, 세상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도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 하거나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 신을 믿는 인간들은 죽음이 정복된 세상에서도 신을 믿고 의지할까? <수확자>의 '사망 후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인 음파교도들을 비웃고 죽음을 집행하는 수확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그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인다.
탄생처럼 죽음 또한 누구나 맞아야 하는 운명이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게다가 회춘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 무작위 혹은 통계상이라는 이유로 수확자의 선택에 의한 인위적인 죽음을 맞는다면 죽음의 공포는 어떤 것이 더 클까? 수확에 불복할 경우 가족 전원을 수확한다는 계명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계명이라고 수확자 스스로들을 합리화시키지만 가족을 인질로 잡은 테러리스트와 다른 게 무엇인가. 그렇기에 수확자는 그 어떤 직업보다 윤리의식과 양심이 필요하다. '그 스스로가 수확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최우선 조건인 이유이기도 하다. 수확자 패러데이와 수확자 퀴리가 수솩자 고더드의 무리와 수확을 집행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보이는 차이는 수확을 당한 이들의 죽음이 숭고한 희생이 되었느냐, 무차별 학살의 희생양이 되었는가 하는 천지차이의 결과를 보였다.
권력에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질병, 즉 인간 본성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수확자들이 자기 일을 좋아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 수확자, 본문 116페이지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일까. 그 어떤 마약보다도 취하기 쉽고 중독되기 쉬운게 권력일까.
누군가의 삶을 거두는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힘의 무게를 양심과 연민으로 감당하던 수확자들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스스로를 수확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그 힘에 취해 의무와 책임을 권리와 특권으로 세를 넓히려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왔다. 선더헤드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수확자들과 관련된 일에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할 순 없지만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패해가는 수확령의 미래를 방관하지는 않는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었던 변화'가 되려는 시트라와 사자들의 도살자, 독수리들의 처형자'가 되려는 로언.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이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