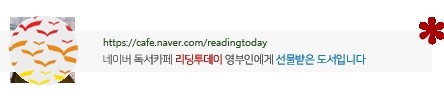폴과 비르지니 /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즌2
조르주 상드 (지음) | 조재룡 (옮김) | 휴머니스트 (펴냄)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 헤어지자. 고통을 주는 것 외에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즌2 <그녀와 그> 329페이지
사랑, 사랑, 사랑. 그놈의 사랑.
여기를 둘러봐도 사랑, 저기를 둘러봐도 사랑. 넘치고 넘쳐나 흔하디 흔해져버린 사랑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도 있다지만 너무 흔해져버린 탓에 제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저마다 제 사랑만은 진실하다고 외쳐대니 진실한 사랑에 대한 기준과 가치도 애매해지고 사랑의 홍수와 외침 속에 사랑은 길을 잃고만다. 감성을 자극하는 유행가 속의 사랑은 이별과 배신, 남겨진 사람의 상처가 주를 이룬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지만 아픈만큼 만신창이가 될 뿐이다.
표지를 보고 홀딱 반해버린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즌2'의 <그녀와 그>. 표지만큼이나 아름답고 설레는 사랑이야기였으면 좋았으련만 자기가 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커녕 기억도 하지 못하는 로랑의 사랑은 지켜보는 사람조차도 어지럽게 만든다.
테레즈를 향한 로랑의 사랑은 (자신은 줄곧 사랑이라 주장하지만)내게는 아무리 보아도 엄마를 졸라대는 어린양 이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우정을 앞세우고 다가와 그녀의 사랑을 얻은 뒤엔 자유를 운운하는 로랑의 생떼에 가까운 이기심은 사랑이라는 말이 과분하다. 어쩌면 로랑의 이 어린아이같은 철없음에 테레즈가 마음을 열었던 것도 같다. 사기결혼의 아픔과 빼앗긴 아들의 죽음으로 펼쳐보지 못한 모성애를 로랑을 돌보면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일수도.
파머를 만나 이제야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정서적 안착을 하려나 싶었지만 너그러워 보였던 파머도 사랑 앞에선 질투를 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테레즈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며 집착에 가까운 맴돔을 하는 로랑을 대하는 테레즈의 태도가 파머에겐 확신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잘못 후에 로랑이 보이는 매번의 뉘우침이, 매번의 감사함이, 매번의 사랑 고백이 그 순간순간에는 진심이었다는 것이 파머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부모가 없는 소녀, 아이가 없는 어머니, 남편이 없는 아내.
자식으로서, 어버이로서, 배우자로서의 행복을 누려본 적 없는 테레즈의 인생이 가엽다. 연인으로 다가온 남자가 누이와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바란다면 이 또한 불행이 아닐까.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질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순탄하고 아름다울리 없다.
파머의 아내가 되면 로랑 때문에 고통받을까 두렵고, 로랑의 동반자가 되면 파머 때문에 고통받아야 했던 테레즈. 둘 모두를 끌어 안으려 했던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착한여자 콤플렉스의 일부는 아니었을까. 잊지 못한 아들의 그리움에 대한 보상심리까지 얹어서.
파머는 연인으로서는 테레즈의 곁을 떠났지만 키다리 아저씨로는 남았다. 끝까지 질투와 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로랑에 비해서는 신사답다. 죽은줄로만 알았던 아들과의 만남은 테레즈가 지지부진했던 로랑과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했던 모성애는 제갈길을 찾은 듯 보인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지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