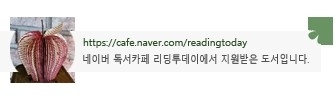-

-
프랑켄슈타인 (양장) ㅣ 앤의서재 여성작가 클래식 3
메리 셸리 지음, 김나연 옮김 / 앤의서재 / 2022년 3월
평점 :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지음) | 강화길 (옮김) | 앤의 서재 (펴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아니 근래에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 사고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었다.
인면수심의 범죄들을 보며 흔히 "개만도 못하다",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이다"라고 한다. (가만히 있던 개는 뭔 날벼락인가)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괴물에서 한 살 한 살 나이들어감에 따라 정의하게 되는 괴물의 범위는 좁혀들지 않고 점점 더 넓어진다. 괴물이라고 불리는 범죄와 범죄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혼탁해져 가는 것인지 가끔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내쳐진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은 낯선 생명과 신의 영역을 넘본 댓가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했던 오만했던 프랑켄슈타인. 세상은 이 둘의 외모와 사회적 배경을 기준삼아 괴물과 지식인으로 나누었지만 저지른 행위만 놓고 본다면 괴물이라는 비난에서 이 둘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생명을 주었다는 점에서 무명의 그에게 프랑켄슈타인은 부모와도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탄생의 순간부터 바로 그 부모와도 같은 프랑켄슈타인에게 거부당하고, 원했던 태어남이 아니었음에도 외모가 흉측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그런 그에게 연민과 동정이 생기지만 좌절감과 외로움에서 시작된 분노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던 것까지는 두둔해 줄 수가 없다.
프랑켄슈타인의 죽음 앞에 괴물이라 불리던 그의 선택 또한 죽음이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는 않지만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죽음은 무명의 그가 느끼는 고립감의 최절정이지 않았을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포기되지 않아서 프랑켄슈타인의 곁을 맴들며 투정부리듯 반항심에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저질러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른 누구보다도 프랑켄슈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실패를 경험하고 지친 사람들이 결국은 부모의 곁에서 쉬어가듯 말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각종 범죄의 가해자들은 거의 불우했던 어린시절을 공통적으로 말한다. 가정안에서의 학대와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왕따와 불공정한 체벌 등이 자신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불우했던 과거의 어린시절이 현재의 범죄에 면죄부가 되어야 할까?
흔히들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그러나 비호감의 외모를 가진 이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기회조차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신과 다른 것을 '틀리다'로 규정하고, 틀린 것을 '나쁘다'고 몰아세우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제는 모두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