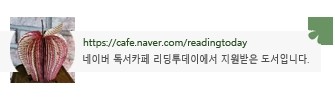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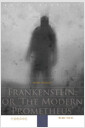
-
프랑켄슈타인 ㅣ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1
메리 셸리 지음, 박아람 옮김 / 휴머니스트 / 2022년 2월
평점 :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지음) | (옮김) | 휴머니스트 (펴냄)
어려서부터 공포 덕후였다면 아니 굳이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영화나 뮤지컬, 하다못해 어린 시절 동화책으로라도 몇번씩은 접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너무나도 유명하고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영화인들에 의해 재해석되며 여러 버전으로 영화화 되었던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가 열 여덟살에 썼다는 과학과 공포가 콜라보 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성인이 되어 완역의 소설로 다시 읽으니 단순 공포소설이 아닌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200년 전의 열 여덟살 소녀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모두들 꿈을 꾸지만 메리 셸리는 꿈을 글로 옮겨 문학으로 탄생시켰고, 그 소설 속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창조의 꿈을, 괴물로 불렸던 한 생명은 사랑받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우리는 새 생명을 잉태하면 태명을 지어 부른다.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존재로 축복받는 생명들과는 달리, 흉측한 외모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물로 불리며 거부당하는 그에게는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는 괴물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내면마저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펠릭스의 헛간에 숨어 살며 그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고 남몰래 도움의 손길도 뻗칠줄 아는 심성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싶었던 그가 사람들에게 보낸 선행과 친절은 언제나 고통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원했던 건 작은 친절과 사랑, 공감일 뿐이었는데, 흉측한 외모때문에 괴물로 정의된 그는 진짜 괴물이 되어갔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탄생이었음에도 창조자에게서조차 거부당한 그의 심경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한 아이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자신을 만든 창조자로부터 버림받은 괴물과 그 괴물에게 사랑하는 이를 모두 잃은 프랑켄슈타인, 이 불행은 누구의 잘못인가. 외모만을 보고 그를 괴물로 정의내린 인간들과 외로움이 뒤틀려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름조차 없는 그 중에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과학과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프랑켄슈타인' 주변사람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뤘다. 자신의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태어남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죽음은 자신의 의지로, 방법 또한 본인의 선택으로 그는 끝내 이름없이 사라지기로 결심한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마지막까지도 괴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후회만이 있을 뿐, 그를 버린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 연민은 끝까지 볼 수 없다. 그런 감정들 마저도 동류의 인간들에게만 느껴야 하는 것일까?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그토록 철저한 버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무명의 그가 내면마저 괴물로 변하는 일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온정을 보였더라면 내면마저 괴물로 변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과거의 소설 속이 아닌 지금의 현실에서 누군가를 행동보다 외모, 피부색, 국적, 배경 등을 이유로 '우리'라는 울타리에서 밀어낸 적이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누가 진짜 괴물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