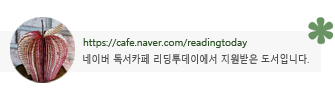[열린책들 창립 35주년 기념 MIDNIGHT세트]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똘스또이 (지음) | 정지원 (옮김) | 열린책들 (펴냄)
<10. 어쩌겠어, 죽은 걸. 어쨌든 나는 아니잖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대하는 주변인들의 모습에서 애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료들은 그의 빈자리로 인해서 이루어질 인사 이동과 직위 변경으로 인한 승진과 봉급 인상에 관심이 더 크고, 아내는 남편의 사망으로 국가에서 받아낼 지원금 중 놓치는 것이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
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러 모인 자리에서 제각각 자신의 잇속을 계산하기 바쁘고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할 따름이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언제라도 그 죽음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그것은 이반 일리지에게 일어난 일이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아니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일상에서 많은 죽음을 듣고 보게 되면서도 죽음은 늘 남의 일인양, 영원만큼 긴 시간의 끝에 있는 일인냥 미뤄두고 살아간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는 조건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이반 일리치는 아내의 임신 이후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질투와 바가지, 트집과 불평 불만의 아내에게서 벗어나고자 그가 선택했던 것은 삶의 무게 중심을 일로 옮겨놓는 것이었다. 달리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임신과 아이들의 거듭되는 사망으로 아내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듯 싶은데, 위로와 사랑 대신 바깥으로만 도는 남편이 나라도 이뻐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승진과 봉급 인상, 새로운 도시로의 이주는 이들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다툼도 줄어들고 이반 일리치는 새 집 단장에 모처럼 행복감을 느낀다. 권태롭던 일상에 무언가 집중할 만한 새로운 일이나 취미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열성적이었을까?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다친 옆구리는 점차 고통이 된다. 여러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도 속시원한 해답이 없고 주변에서도 그러다가 나을거라고 말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자신에게 드리운 죽음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때문에 죽었을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확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시름시름 그를 병들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스스로를 시들고 말라가게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했던 아편과 모르핀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 갔다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망상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지.
<105. 사람들 눈에 나는 올라가고 있었어. 하지만 정확하게 그만큼씩 삶은 내 발아래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꼽지만 행복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다. <103. 즐거웠던 삶에서의 좋았던 순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는 이반 일리치의 자문자답에 한참 시선이 고정된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걸까? 죽음을 대면했을때 지나온 삶에 회한은 없을까?
죽음의 공포를 묘사한 수작이라는 레프 똘스또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잘못 살아온 삶이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울 수 있음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