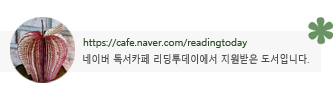[열린책들 창립 35주년 기념 NOON세트] 푸른 십자가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지음) | 이상원 (옮김) | 열린책들 (펴냄)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의 "푸른 십자가".
고전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브라운 신부 시리즈가 꽤 유명하다고 하던데 내게는 낯선 제목과 생소한 작가라 [열린책들 창립 35주년 기념 NOON세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읽게된 책이다.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채로 몇 페이지 읽기 시작하다가 일반적인 고전문학과는 흐름이 다르기에 뒤쪽의 작품 소개를 보니 추리소설이었다. '아! 이래서 스토리의 진행이 달랐구나'하고 이해가 되니 그 다음부터는 빨려들어 단숨에 읽게 되었다.
"추리소설의 고전"하면 떠오르는 셜록 홈즈 시리즈와 푸아로, 미스 마플 등 범인을 쪽집게처럼 찾아내는 탐정들과 뤼팡처럼 나쁜 남자의 매력을 내뿜는 사연있는 범죄자가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푸른 십자가'에서는 탐정도 범죄자도 아닌 신부님이 주요 인물이 되어 사건을 풀어나간다. 아니, 풀어나간다는 말도 딱 맞는 표현은 아니다. 일반적인 추리소설은 범죄현장에서 추리가 시작되지만 '푸른 십자가'의 브라운 신부는 우연히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게 되었다거나 범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등 다른 이야기 전개를 보인다. 더구나 예리한 관찰력과 준수한 외모, 명석한 두뇌회전과는 거리가 먼 작은 키와 소시민적 평범함을 두른채 말이다.
첫번째 단편인 '푸른 십자가'에서는 범죄자 플랑보를 뒤쫒는 발랑탱 청장을 서두에 주인공으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브라운 신부를 촌스럽고 천진해서 보살펴야할 인물로 그려낸다. 두번째 단편에 가서야 진짜 주인공은 발랑탱이 아닌 브라운 신부였음을 깨닫게 된다.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예리한 브라운 신부의 매력은 대체불가 브라운 신부스러웠다.
왜 주인공의 신분이 탐정이나 경찰이 아닌 신부인지
'날아다니는 별들'에 이르러서야 조금 알 듯도 하다. 범죄자의 체포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죄에 대한 벌, 인과응보보다는 참회와 반성을 통한 새로운 시작, 혹은 갈데까지 가더라도 바닥은 치지 않도록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이아몬드를 훔친 플랑보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는 청년과 그를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이 깨질 위기에서 브라운 신부만의 방법으로 누구 하나 불행해지지 않고 엔딩을 맞이한다.
그 후에 플랑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지막 이야기,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플랑보는 탐정이 되어 등장한다. 브라운 신부의 진심은 플랑보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이다. 앵거스는 플랑보를 가리켜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정직하고 뛰어난 탐정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지만 마지막 살인사건을 해결해 낸 이는 역시 브라운 신부였다. 이쯤되면 초반에 보여진 브라운 신부의 허당미는 연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눈 쌓인 언덕길을 살인자와 여러 시간 걸으며 브라운 신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그 살인자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보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