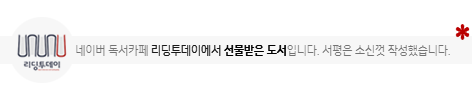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건네는 섣부른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안다, 이해한다'는 말은 얼만큼의 진심을 담고 있을까? 걱정했다는 말을 건네는 그 안에 진짜 걱정보다는 "내가 너를 걱정했다"는 생색이 담기지는 않았는지.
비극과 슬픔, 아픔이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막상 맞닥뜨렸을때 그 충격과 고통이 덜해질 수 있을까?
힘내라는 위로 대신 '점이라도 찍을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된다고 얘기하는 그녀의 말에 공감한다고 하면 너무 섣부를까...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를 입에 달고 살며 맘 놓고 울 수도 없었다는 그녀를 가만히 말없이 토닥여 주고 싶다.
감정에도 크기가 있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비교들을 해댄다.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만고만한 무리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너희보단 낫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남는 것이 뿌듯함은 아닐 것이다.
타인의 불행이나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의 불행이나 행복도 언제나 불안할 뿐이다.
<138. "예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고가 가능하다. 어둡고, 괴롭고, 추한 작품을 보고 누군가의 감각을 깨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예술의 가치가 있다."
추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추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고통과 슬픔으로 채워진 인생도 인생이라는 진실에 닿는다.
꽃길만 걷는 인생이 아니라고 해서 인생이 아니라고 삶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지 않는가 말이다. 쓴 맛을 본 뒤에 닿는 혀끝의 단맛이 더 달콤하듯이...
아픈 그녀의 글을 읽으며 오히려 내가 치유받고 오히려 내가 위로 받는다. 격정적인 호소글보다 담담하게 담아낸 일상이 더 많이 공감되고 울린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과거의 힘들어 하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위로와 응원을 할 수 있듯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지금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그에 따는 불안을 떠넘겨 미안하지만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있을 미래의 나에게.
사랑의 시작은 관찰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나를 애정어린 관찰을 해 본적이 있었던가?
아프다고 해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지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살 필요는 없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정해진 죽음을 피할 도리는 없다. 어차피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해서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다 여기고 죽은 듯이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미리 죽음을 예고 받았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
기쁨은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선혜 씨의 말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된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이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행복으로 가는 다른 길임을 이제는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