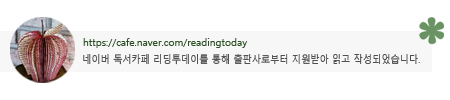-

-
티핑 더 벨벳 ㅣ 세라 워터스 빅토리아 시대 3부작
세라 워터스 지음, 최용준 옮김 / 열린책들 / 2020년 12월
평점 :




티핑 더 벨벳
세라 워터스 (지음) | 최용준 (옮김) | 열린책들 (펴냄)
동성애는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 워터스의 "빅토리아 시대3부작"이라 불리우는 '핑거 스미스', '끌림', '티핑 더 벨벳'이 외설이 아닌 문학작품으로 인정받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여기고 읽기 시작했다.
<티핑 더 벨벳>은 그녀의 나머지 두 작품과 비교해도 그 수위가 가장 높다.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톰'.
톰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던 키티는 매셔로 살아오던 인생을 뒤로 하고 낸과 결별하며 월터스와의 결혼으로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 낸시가 받은 충격과 배신은 다른 어느 연인들의 사랑과 비교해도 덜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키티에게 사회적 매장과 손가락질이 뻔한 삶을 계속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다만 자신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낸시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하는게 먼저 아니었을까?
낸시가 키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자친구였던 프레디와 결혼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낸시가 매셔로, 톰으로, 남창으로 점점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것을 꼭 키티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평범한 긴 세월보다 쾌락의 500일을 선택하며 다이애나의 전속 창녀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낸시 본인이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아버린 것도, 친절한 밀른 부인과 그레이스의 곁을 떠난 것도 낸시였다. 그러나 나는 낸시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감정의 방향을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었다면 세상의 동성애는 애초에 없었을지 모른다.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거짓된 삶을 선택한 키티, 너무 부유해서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다이애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플로렌스 그리고 상대에 따라 여러 색깔로 변하는 낸시.
매셔로 이름을 날리던 때에는 유명 배우 낸 킹으로, 다이애나에게는 전속 창녀로, 플로렌스에게는 그녀의 사회적 후광에 가리워진 그녀의 여자로 살아간다.
'티핑 더 벨벳'. 제목에 숨겨진 진짜 속 뜻을 알고는 무척 놀랐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은 지금보다 더 구속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시대에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이성인 남성보다 동성인 여성에게서 받으려 했던 것 같다.
톰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톰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이었다고 낸시에게 말해주고 싶다. 현실을 제쳐두고 사랑에 함몰되어서도 안되고, 사랑은 배제된채 쾌락만을 쫒아도 안된다고.
낸시가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을 놓아버리는 모순을 보았다. 동성을 사랑하는 낸시가 사랑을 찾는 동안 그녀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순. 키티에 대한 동경과 선망에서 시작된 동성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한 목적도 방향도 없어 보였다.
플로렌스를 만나 진실한 감정을 나누며 낸시는 드디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간다. 소식을 끊었던 가족에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결심을 하고 돌아와 달라는 키티를 통해 플로렌스와의 사랑을 깨달으며 방황이 끝난다.
범죄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세상의 잣대와 다르다해서 비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남들과 다른 조금 특별한 사랑을 하는 그들을 조금만 더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세상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