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전성기의 고구려나 로마제국의 영토를 갓 물려받은 황제라면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하고 싶은가?
자신의 광활한 영토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경계선부터 확인하는 것도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계선을 확정짓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 최전선이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지금의 최전선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 인식의 최전선이다.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인간 인식의 경계선이 정해진다. 현대 문명을 흔히 과학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전선에 선 과학이 매번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덕분이다.
그 중에서도,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선 중의 최전선을 꼽으라면 단연 'LHC'가 돋보인다. LHC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의 약자로서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ERN, 유럽핵연구평의회)가 보유한 인류 최대의 입자 가속 및 충돌 실험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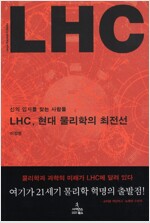 |
| ▲ <LHC, 헌대 물리학의 최전선>(이강영 지음, 사이언스북스 펴냄). ⓒ사이언스북스 |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LHC 실험이 무엇인지, LHC가 왜 중요한지를 일반 비전문가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안내서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나온 이강영의 <LHC,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LHC>, 사이언스북스 펴냄)은 그런 안타까움의 오랜 가뭄 속에 쏟아진 단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최전선에서 한창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장수가 틈틈이 정리한 난중일기가 장계와 함께 막 한양에 도착한 셈이다.
LHC는 지하 100m에 건설된 둘레 27㎞짜리 입자 충돌 장치로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시킨 양성자를 자기 질량의 약 7000배 되는 에너지로 충돌시킨다. 규모와 성능 면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 최대의 과학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양성자가 고에너지로 충돌하면 양성자는 부서져서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나 접착자(gluon)가 튀어나와 높은 에너지에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현상들은 양성자의 충돌 지점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입자 검출기에 그 흔적을 남긴다. 이때의 충돌 에너지는 대략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태어난 지 약 1000억 분의 1초~1조 분의 1초 되던 때의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LHC는 초기 우주의 상황을 인공적으로 재현해서 들여다보는 일종의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약 400년 전인 1609년, 갈릴레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60배율 망원경으로 달과 우주를 관측하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렇게 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앞 다투어 갈릴레이 앞에 줄을 섰을 것이다. (사실 망원경 앞에서 줄을 서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LHC라는 망원경(혹은 현미경이라고 해도 좋다!)이 보여줄 장면은 400년 전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다.
이강영의 <LHC>는 이 스펙터클하고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백과사전식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1부에서는 물질의 근본을 추구해 온 인류의 역사를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 초 핵물리학까지 개괄한다. 2부는 현대 입자 물리학의 세계를 그 주역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3부에서는 LHC가 있는 유럽의 CERN의 역사를 정리해 두었다. 마지막 4부는 LHC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의 장점은 입자 물리학의 역사가 장면 장면마다 생생하게 잘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저자가 이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자 가속기의 역사와 구조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이론과 실험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LHC가 공식 가동을 시작했던 2008년 나 또한 LHC와 관련된 졸고를 책(<신의 입자를 찾아서>(마티 펴냄))으로 낸 적이 있었다.
그 책에서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표준모형 같은 물리 이론을 중심으로 LHC 실험의 의미를 다루었기 때문에 LHC 자체나 가속기 물리학의 역사, 여러 과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등을 담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다. 신작 <LHC>는 그런 갈증을 모두 해소해 주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저자인 이강영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이 10년도 훨씬 더 되었기 때문에 평소 그가 과학자나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 무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던 터였다. 저자의 해박한 지식의 근거는 일차적으로 방대한 독서 덕분이다. 과학과 관련된 책은 그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해설이 줄을 잇는다.
게다가 그는 기억력도 비상한 면이 있다. 예컨대 어느 해 대학가요제에서 누가 어떤 상을 수상했고 그해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누가 활약을 했는데 한국시리즈 몇 차전 몇 회에서 이런 플레이를 했으며 같은 해 무슨 바둑기전 결승전에서 누가 맞붙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이다. <LHC>에는 그의 그 모든 이야깃거리가 아주 꼼꼼하고도 풍성하게 널려 있어서 (전공자들도 잘 모를 법한 이야기들도 가득하다!)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람은 소통의 동물이다. 뭔가 재미있고 신기한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인기를 끄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다. LHC 실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과학 이벤트이다. 나도 그랬지만, 아마 이강영도 이 엄청난 구경거리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면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척척박사가 있어서 항상 동네 꼬마들이 몰려들어 그로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듣곤 했었는데, <LHC>는 그런 이웃집 형님이 들려주는 신기하고 재미난 과학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LHC 실험의 인류사적인 중요성에 비해 일반인들이 그 실험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는 <LHC> 같은 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과학이 전반적으로 푸대접받고 대중화되지 못한 탓도 크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사회 일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 면에서 이강영의 <LHC>는 학계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해 본다.
과학은 21세기의 교양이라는 말이 있다. 책 한 권 읽는다고 갑자기 교양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행여 스스로가 현대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한 권의 책이 그 자괴감을 상당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