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자본주의]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인지자본주의]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인지자본주의 -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ㅣ 아우또노미아총서 27
조정환 지음 / 갈무리 / 2011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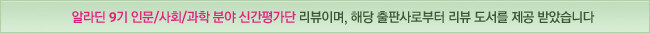
570여 쪽에 이르는 대작이다. 자율주의-맑시스트로 알려진 저자 조정환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이론적 사유를 발전시켜 책으로 묶었다. 그 과정에서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 2011년 일본 대지진 및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혁명운동이 그의 사유에 틈입하여 촉매제가 되었다. 저자는 흔히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혹은 소비자본주의로 일컬어진 제3기 자본주의를 ‘인지자본주의’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본과 노동, 시간과 공간, 계급과 지성 등의 개념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주권의 형태와 혁명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탐색하려 했다. 그리하여 이 책은 “권력, 사회, 예술의 인지적 전환에 관심을 기울인 이 연구들을 ‘정치경제학 비판’과 결합하고 그것들을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의 전통 속에 자리 잡게 하면서 그것들이 놓일 새로운 지평을 열어줌과 동시에 좀 더 명확한 정치적 방향성을 부여하려는 시도”(23-24)의 산물이다. 내용이 방대하여, 이 리뷰에서 다 다루지 못한다. 흥미롭게 읽은 부분만을 소개해본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자본주의에서 공간의 재구성”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메트로폴리스’다. 벤야민, 아감벤 등의 사유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이 책은 메트로폴리스를 “일국적일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삶의 배치이자, 자본의 장치”(223)로 정의한다. 그가 규정하는 메트로폴리스는 “노동의 실질적 포섭, 비물질노동, 그리고 다중”(227)이라는 세 개념의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네그리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생활양식, 집단적 소통수단’이라는 조건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메트로폴리스라는 공간은 ‘능동적 저항주체’가 형성 가능한 공간이 된다.
2008년의 촛불운동은 이러한 다중적 네트워크 장치로서의 메트로폴리스에서 탄생한 능동적 저항주체로서의 시민이 가시화되어 혁명의 가능성을 예고한 사례로 읽힌다. 이는 인지자본주의가 희망적으로 기대하는 ‘지성’의 상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단초가 된다. ‘지성’의 문제는 11장에서 다루어지는데, 그간 사회주의 운동이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실천하면서도 지성에 있어서는 평등보다 불평등을 옹호”해왔던 것이야말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적 주장이다. 전위, 노드의 중요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를 지도력 부족, 조직화의 실패 등으로 환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중’ 개념에 근거한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화”(384)이다. 전문가들의 헤게모니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은닉되는 비밀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절대적인 전제로 받아들이는 사회구성체는 보수주의와 맞닿는다. 예컨대 2008년의 촛불을 우중의 출현으로 보는 ‘전-반’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그 예이다. (이는 저자가 오랫동안 상호비평관계를 유지했던 서동진과 결정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다. 최근 인지자본주의에 대해 서동진과 조정환이 제출한 비판과 반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결국 ‘맑스주의’의 정통성에 대한 이해와 오독 논쟁으로 치우쳐버렸다. 이런 이론투쟁은 두 논자의 인식론적 기반에 기인한 문제인 만큼 그로의 귀결은 자연스럽지만, 새삼 놀라운 것은 이 현학적인 논의가 인터넷 진보매체 <프레시안>을 통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과연! cf. 서동진, 「마르크스주의, 미래학의 유혹에 빠지다?」, 프레시안, 2011. 5. 13; 조정환, 「마르크스주의 진화를 가로막는 진짜 ‘적’은?」, 프레시안, 2011. 6. 3)
보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이 인문학의 보수화 및 고전 붐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CEO를 위한 인문학,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등 인문학의 범사회화 현상이 왜 대안이 아닌지를 밝히는 대목에 공감한다. 인문학의 위기가 찾은 출구가 기업과의 ‘제휴’라는 것은 곧, 인문학적 사유가 국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의 일부로 배치”(394)되고 소비되는 것과 다름없음을 저자는 분명히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고전이 지닌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점함으로써 “고전이 해방과 자유를 찾는 다중의 공통어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오히려 고전으로부터 삶에 명령질서를 부과할 가능성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의 정당성을 찾아내려는 작전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흥미롭다. 물론 작금의 고전 붐의 원인이 모두 이러한 분석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전’이라는 컨텐츠의 정력적인 개발을 통해 ‘인문학적 포즈’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의도를 설명하기에는 유효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노드나 전위의 절대성이 자명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다중’의 개념이 전제하는 ‘대중’에 대한 희망적인 믿음은 어떻게 실현가능한가. ‘다중’은 ‘다중’의 그야말로 ‘다층적인’ 면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인문학의 신보수주의화가 아닌, 인문학의 미래, 인문학이 ‘다중지성’으로서 기능하는 것, 동시에 ‘다중지성’이 ‘인문화’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저자가 구성한 ‘다중’의 실체는 ‘인지자본주의에서 계급의 재구성’을 논한 9장에서 논의된다. 저자는 ‘프리터, 프리커,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을 ‘호모 사케르’(아감벤), ‘쓰레기’(바우만) 등 국가로부터 배제된 부정적 형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택한다. 그는 이들의 ‘버려짐’, ‘불안정’ 등이 아니라 이들의 ‘자유로움’, ‘유동성’과 같은 특성에 주목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개념을 재구성한다. 이 ‘불안정’과 ‘자유’라는 양극의 스펙트럼은 자본주의의의 질적 변형에 기인한 것이다. 실상 제3기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인지자본주의는 고용노동 뿐만 아니라 “‘고용되지 않은 거대한 노동들(여성, 아동, 노인, 청년, 죄수, 실업자, 예술가 등의 활동들)’에 의존”(314)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체화하는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의 여부가 곧 삶의 안전을 좌우한다는 이 전제야말로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의 위계와 분절을 촉발하여 혁명적 주체화를 저해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고용이 곧 삶의 안보를 결정한다는 자본주의적 인식론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요는 ‘다중’이다. 새로운 주체로서 ‘다중’의 신체는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지배를 지엽적인 것,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507)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