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읽고 있는 책은 누군가 추천한 책이거나 관심있는 분야라 따로 메모해 놓았던 책들이다. 특히 이 두권의 책은 정말, 재미있다. 철학이 일상과 어떤 연관이 있고, 철학적으로 사고하는게 어떤건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일상과 철학이라는 범주는 나의 책 연대기로 보자면 알랭 드 보통에서 시작하는데 어렴풋이 감만 잡고 있다가 이유선의 책을 통해 개화했다고나 할까. 아직 그 꽃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이유선이 제시하는 '철학을 통해 생각하는 법'은(저자는 그저 에세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리처드 로티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절대적인 사조나 지향점 없이도 생각의 결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소시민의 삶을 다룬 부분과 책의 제목이기도 한 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는 다른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둘을 같은 맥락으로 읽어내려가면 두개의 생각을 묘하게 관통하는 정서가 보인다. 결국 소시민으로 살아도 남들에게 지탄받거나 자신의 삶을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려면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태평하게 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어떻게보면 당연한 진리를 까맣게 잊고 어떤걸 선택하도록 강요받은적이 참 많았던 것 같다. 이유선이 보여주는 글쓰기의 장점은 생각을 강요하거나 행동에 옮기기를 촉구하지 않는데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이르게 하는 점이며 그러면서도 재미까지 있다는 것이다. 고민하면서 재미까지 느끼기란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다.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는 구조주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내용만 서술하거나 저널리스트의 숙고 대신 글쓰는 기계 같은 일본의 전문 분야 저자들의 책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 저자가 우치다 타츠루라는게 맘에 걸렸지만 이 책은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킬만큼 매혹적이다. 구조주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푸코나 라캉의 이름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그들의 책을 읽자니 낯선 용어에서 어려운 문체까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치다 타츠루는 구조주의의 개념에서 시작해 각각의 학자들의 중심 사상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방대하거나 논점이 분산돼서 읽다가 쉬이 지치는 철학책 대신 간략하고 읽기 편한 형식으로 말이다. 푸코의 '성의 역사' 부분과 바르트의 어려운 개념들을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서 써준대다가 구조주의 철학자의 저작을 꺼내서 읽고 싶게 만드는건 이 책의 초초 강점!
요즘 큰 즐거움이 되고 있는 두권의 책을 2010년 올해의 책 페이퍼로 추천해준 빵가게 재습격님께 감사의 배꼽인사를 드린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19세기 영국의 상황, 오전에 온 사람이든 오후에 온 사람이든 같은 1데나리우스로 합의한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이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간디, 톨스토이, 버나드 쇼까지 존경한다는 사상가의 책이라니. 왠지 권위에 호소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헌데, 도덕 교과서 같은 선언과 좋은 취지를 소개하는데서 그치고만 이 책은 그다지 재미있지 않다. 19세기 영국이라면 모르겠지만 자본의 속성을 자세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다 자본주의 이후와 대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과는 어울리지 않는달까. 어쩌면 자료를 파고들고 책 자체가 완결성을 갖고 있는걸 좋아하는 내 취향 탓일지도. 적극 추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 아닌 것도 아니기에 출판사의 책 정보를 붙여놓는다.
 |
|
|
| |
성경의 한 구절로부터 시작한 존 러스킨의 이야기는 사회경제체계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약자의 고통과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안는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중에 온 사람’이란 사회경제적 약자의 다른 이름이다. 마지막 남은 일자리라도 붙잡기 위해 해질녘까지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노동자, 냉혹한 경쟁 속에서 능력으로 인간성마저 심판받아야 하는 고용인들, 그리고 불안한 처지에 놓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존 러스킨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물음을 던진다. 사회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러스킨은 노동자의 노동할 권리와 공평한 보수로써 생존할 권리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선택받는 것은 유능한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이다. 또한 존 러스킨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동등하게 배려 받는 ‘조화로운 불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가 더 큰 사회적 부(富)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과 고용문제들을 돌아보게 한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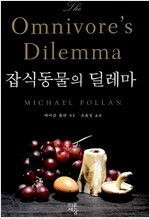


식품주식회사는 익히 마이클 폴란과 에릭 슐로저에 의해 얘기되어온 식품산업을 영화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이다. 에릭 슐로저의 인터뷰와 식품주식회사를 영화화한 내용까지 읽고나니 다수의 저자 글이 나온다.
식품산업에 흠집을 내고, 유기농을 주장하고, 근거리 농산물을 생산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책에서 보이는 일관된 줄기가 안 보이니 좀 답답하다. 여러 명의 저자가 참여하는 책의 경우 그 모든 내용들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종의 짜집기같은 느낌이 드는건 어쩔 수가 없다. 우리의 경우라며 소개한 내용도 좀 부실한 느낌이고.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절반 정도 읽은 느낌은 이 정도.
한권의 완벽한 책이 탄생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한걸까. '저자의 죽음' 이후 '독자의 탄생'을 선언했던 바르트의 말대로라면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앎이나 지적 만족뿐 아니라 의미를 재생산하고 복사해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어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의 품평에 갈증나면서도 두 번 읽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게으르다. 어쩌면 책을 추천하는건 그 책이 완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성향 문제일 수도 있겠다. 뭔가 좀 어렵고, 몇번은 읽어야만 될 것 같은 책들이래야, 흠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있어도 내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책들이래야 추천할 수 있는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