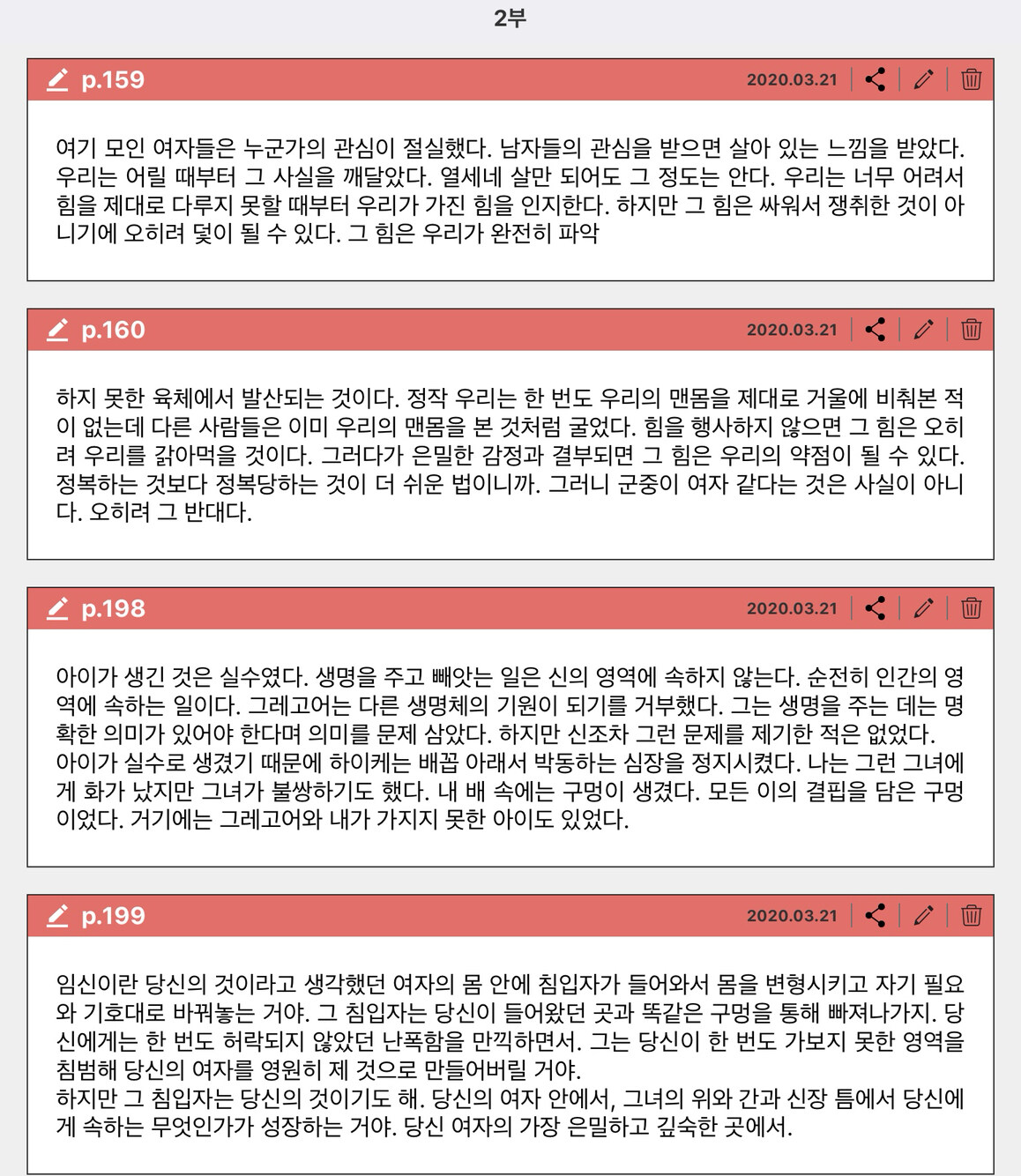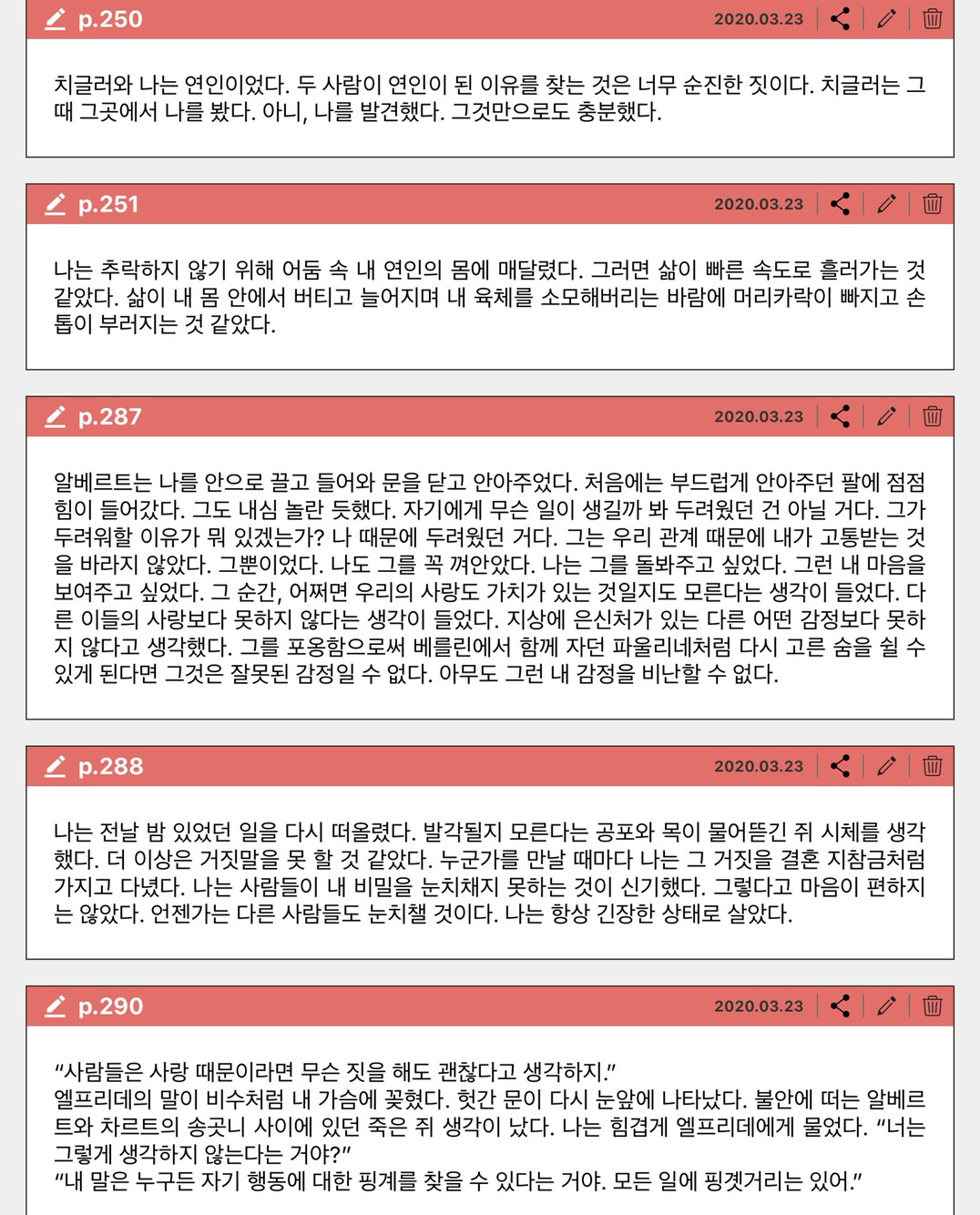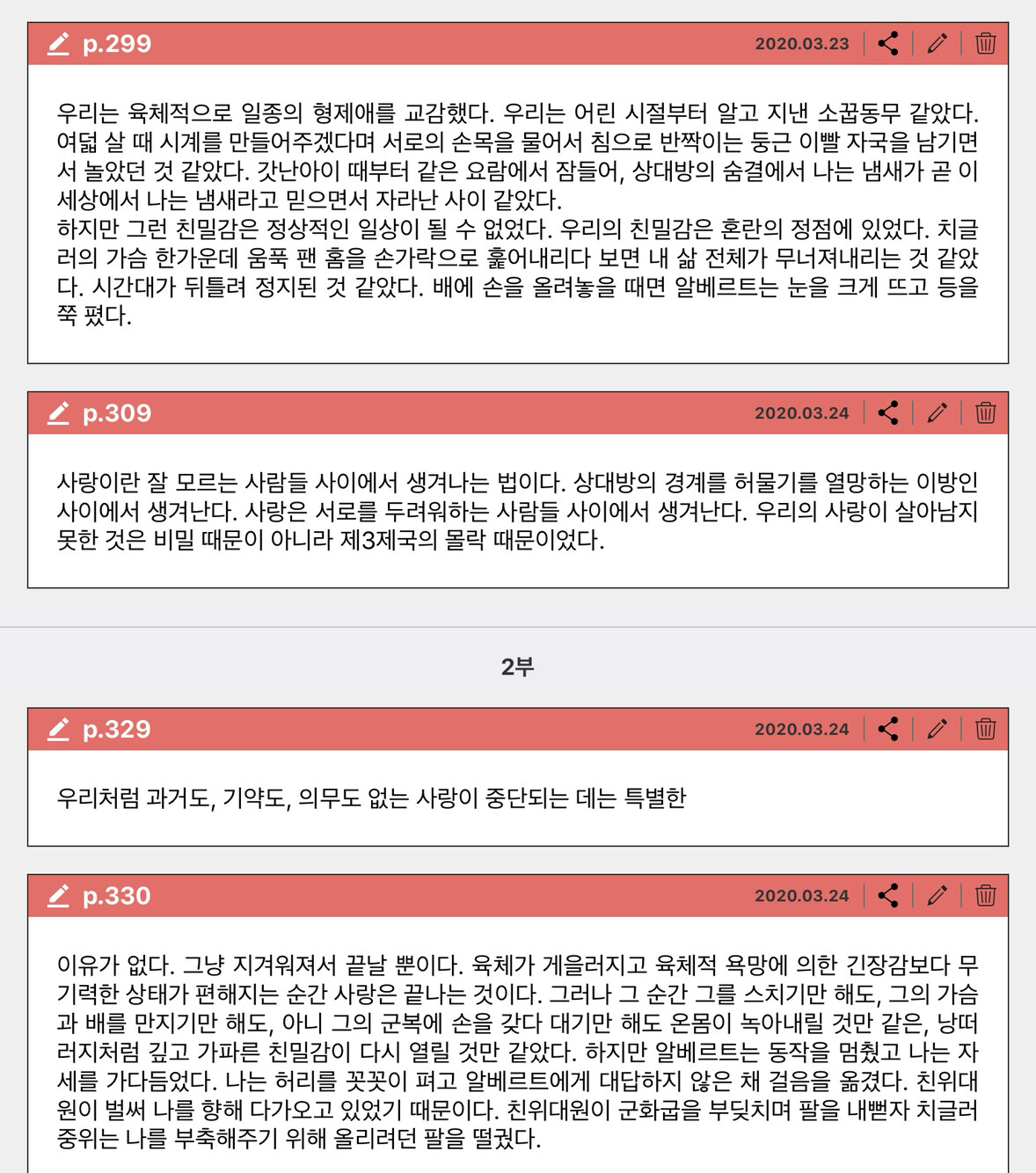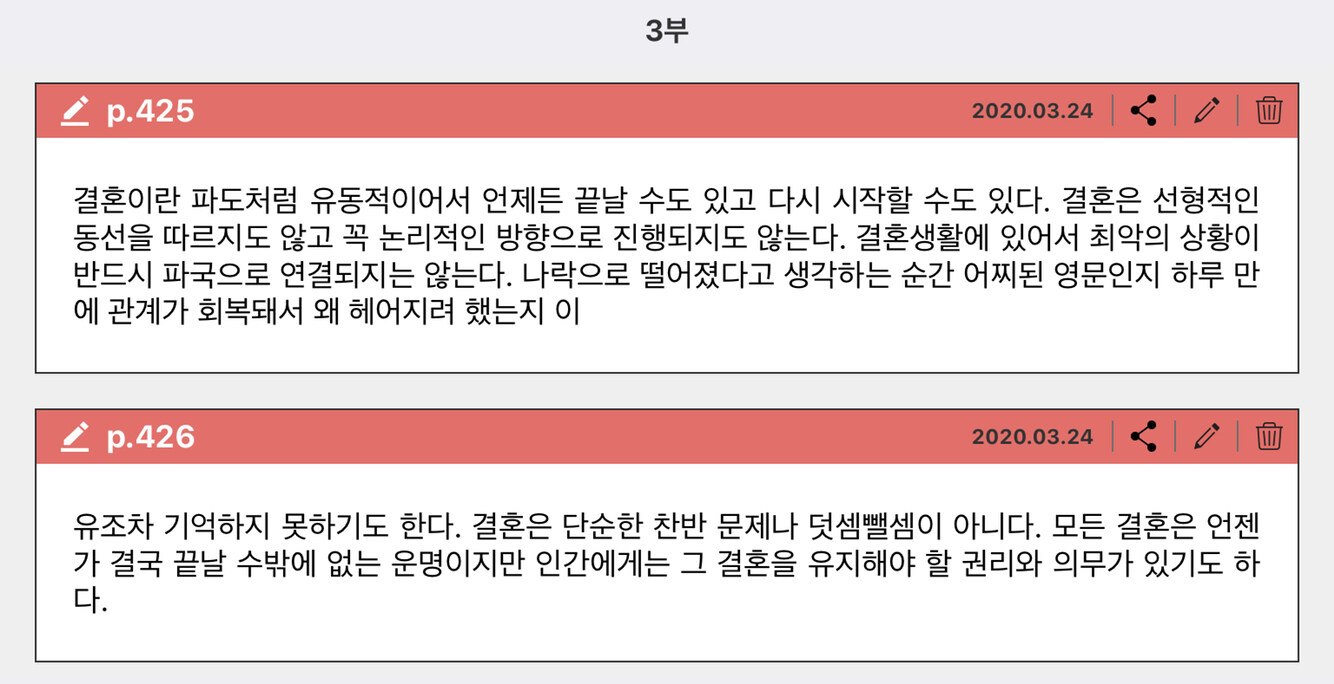-

-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
로셀라 포스토리노 지음, 김지우 옮김 / 문예출판사 / 2019년 12월
평점 :



-20200324 로셀라 포스토리노.
나치 독일 아래 학살당하거나, 사랑하는 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을 다룬 이야기는 많이 접했다. 초등학생 때 읽은 안네의 일기, 중학생 때 본 아트슈피겔만의 만화 쥐, 조금 더 커서 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피아니스트, 쉰들러리스트 등. 나치에게 부역했던 연인이 나오는 영화 더 리더(소설은 아직 못 읽었다)가 조금 특이한 소재였다. 전범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읽는 내내 어려웠지만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생각보다 쉽게 악한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이 책은 같은 시기를 겪은 독일인의 이야기이다. 대다수 독일인이 나치당에게 정권을 맡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데 일조했지만, 모두가 나치를 좋아하고 전쟁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며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틈새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경험은 새로웠다.
이탈리아 제목 Le assaggiatrici. 번역해보니 감별사, 시식가쯤 되겠다.
영어 제목 At the Wolf‘s Table. 늑대의 식탁에서. 늑대는 히틀러를 일컫는다.
히틀러가 달라 붙은 한국어 제목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소설 앞 부분에서 히틀러의 음식, 히틀러의 뭐시기, 하는 서술이 반복되는데 작위적이고 낯간지러운 기분이 들었다. 책의 소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제목이긴 하다. 자기가 뭘 읽게 될지 알고 펼치는 건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초반을 읽는 동안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하면서 약간 지루하고 유치하게 느꼈다. 그래도 참고 읽었더니 2,3부는 그럭저럭 재미있었다.
베를린에 살던 로자는 신혼 1년 만에 남편 그레고어가 전장으로 떠나고 함께 지내던 어머니가 공습으로 죽자 그레고어의 부모 헤르타와 요제프가 있는 그로스-파르치로 옮겨 가 그들과 함께 그레고어를 기다린다.
인근의 라스텐부르크 볼프스샨체에 히틀러가 머물고 있었다. 로자는 히틀러의 음식을 시식하라는 명령을 받고 군인들 손에 이끌려 매일 크라우젠도르프의 병영에 출입한다. 로자 말고도 레니, 엘프리데, 하이네, 베아케, 아우구스티네, 울라, 게르투르데, 자비네, 테오도라 총 10명의 여자들이 시식을 담당한다. 독살을 사전에 막는 총알받이 역할이라 여자들은 넉넉한 급여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안에 떨었다. 식재료 절도, 식중독, 원치 않는 임신, 중절, 데이트 강간, 신분 위장과 발각 등 온갖 일을 겪으며 여자들은 서로를 경계하기도 하고 우정과 사랑을 쌓기도 한다. 1부까지 음식을 둘러싸고 마치 여학교 학생들처럼 신경전 벌이다 친해지다 하는 모습은 별로 공감이 가지 않고 내 취향이 아니다 싶었다.
참전한 그레고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자는 삶의 희망을 잃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귀환만 믿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의 부모와 지내기 위해 왔는데, 기다림은 기약이 없어지고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한다면 절망하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2부에서 새로 병영에 부임한 알베르트 치글러 중위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가 다시 흥미로워졌다. 여자들에게 고압적이고 통제하려 드는 치글러 중위는 처음에는 그저 비호감 덩어리였다. 그런데 요제프가 정원일을 해주던 마리아 남작부인의 저택 파티에 로자가 초대받았을 때, 로자는 치글러와 마주친다. 이후 치글러는 밤마다 로자의 방 바깥에 와서 서성이고, 결국 마음이 움직인 로자는 그를 헛간으로 이끌어 육체 관계를 맺는다.
남편이 실종 상태이긴 하지만 로자는 시부모집에 얹혀사는 처지이고, 알베르트 치글러 역시 유부남인데다 나치군 소속이다. 로자는 알베르트에게 몸과 마음이 이끌리면서도 증오하던 나치, 자신과 시식가 여성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군인과 친밀한 관계가 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레고어가 돌아올 것을 걱정하고, 임신을 걱정하고, 시부모나 엘프리데가 알아차릴까 봐 두려워한다. 그것도 사랑인데, 로자와 치글러의 사랑은 모두에게 숨겨야 하고 서로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어쩌면 그런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둘은 서로에게 빠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종전과 독일군의 패전이 뚜렷해질 무렵 치글러는 로자를 베를린행 기차에 태워 피신시킨다. 로자는 이후 시부모도, 치글러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후일담처럼 짤막한 3부는 읽는 내내 찡했다. 50년 가량의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로자가 누군가를 만나러 하노버로 향한다. 죽어가는 옛 사랑을 보러 가는 일. 마지막에 로자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은 오래 전 시식하던 시절과 겹쳐지는데 그럴 듯한 마무리였다. 이 책의 중심 이야기는 전쟁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도라는 생각을 했다. 로자는 사랑하는 부모와 동생을, 친구 엘프리데를, 그레고어를, 치글러를 전쟁 때문에 잃었다. 그녀가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노년의 그녀는 혼자인 듯하다. 아이도 없고 사랑하는 이도 없이 늙어버린 미래.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온다. 치글러가 로자를 베를린행 기차에 태우려 했을 때 ‘나를 제외한 전 인류가 정말로 죽음 대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목에 바위를 매단 채 모이 호수 바닥에 가라앉는 대신 궁핍하고 외로운 삶을 선택할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사랑 없이, 영원히 혼자라도 살아 있는 편이 정말 나은 것일까. 긴 외로움 속에 그저 숨만 쉬는 게 아닐까.
그래도 그녀가 살아 남은 이유 또한 사랑 덕분이다. 치글러가 그녀를 살렸다. 그녀 또한 전쟁이 끝난 뒤 사랑했던 사람을 살려낸다. 그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녀가 살려낸 사람은 또다른 사랑을 찾아서 제법 긴 여생을 보냈다.
살아있다면, 운이 좋다면 그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끝내 혼자 남더라도, 정말 끝까지 혼자일 거라는 단정과 포기 없이 사랑할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걸지도.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전쟁의 가장 나쁜 점은 사랑의 그런 가능성조차 자비 없이 박살내 버린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