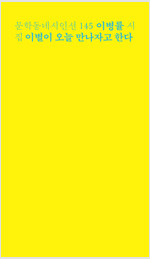몇 해 전, 이제 몸 챙겨야 할 때라며 사과즙 한 상자를 생일선물로 보내준 친구가 있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고, 인생을 더 겪고 나면 함께 나눌 이야기도 더 많아지지 않겠냐고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때마다 생각나겠지. 감정이 메마른 내가 울보가 된 건 순전히 그녀석 탓, 이라고.
생에 미련 같은 건 없다고, 되도록 짧고 가볍게만 살고 싶다 한 건 나였는데 왜...


차곡차곡 쌓아뒀던 장바구니를 생일을 핑계로 이제야 비워냈다.
좋아하는 작가님들 신간을 이 계절에 모두 만나게 된 건, 그 친구의 선물일까 싶을 정도로 한꺼번에 우르르.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게 계절을 닮은 그 친구의 이름이 오늘따라 그립네.
내년 생일에도, 내후년 생일에도 아마 같은 추억을 또 곱씹겠지만,
잊으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대로 두겠다고 말하면서도 허전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서 또 얄궂지만, 괜찮아지겠지.
툭하면 울컥하는 이 그리움의 후유증도 점점 웃으며 즐길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겠지.
나 혼자 멈춰있다고 해서 세월이 흐르지 않는 건 아닌데, 더 나빠지기 전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