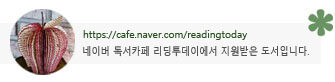-

-
마음의 푸른 상흔 ㅣ 프랑수아즈 사강 리커버 개정판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권지현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22년 2월
평점 :



『 마음의 푸른 상흔 』
프랑수아즈 사강 / 소담출판사

한적한 어느하루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 소설을 그려낸 무척 독창적인 에세이였다.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책의 느낌을 가장 적합하게 말 할 수 있을까? 집에서 매일 믹스커피를 마셨는데 오늘따라 조용한 카페의 라테가 생각나 몸을 움직였고, 같이 동행한 한권의 책은 집과 다르지 않은 여전히 같은 날을 보내는 듯한 느낌? 장소만 다를 뿐 항상 책과 함께 하고 있는 나... 하지만... 정말 그럴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카페에서 반가운 지인을 만났다는 거... 읽던 책을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느낌이랄까? <마음의 푸른 상흔>은 그런 느낌이었다. 저자 프랑수아즈 사강이 오늘의 일상을 보내면서 자신이 해야하는 소설을 끄적이는 일... 같은 일상이지만 자신의 사상 속에 극중 등장인물을 대입시켜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작가로서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다만, 자신의 삶에 대한 사상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발언하며 그에 반하는 허구의 인물을 탄생시켜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민족주의사상에 근접한 아주 작은 집단에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소외된 인물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이라고 하기엔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저자가 극중인물로 등장시킨 스웨덴 남매는 그 사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척 난해하고 답답한 그들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책은 이미 과거에 현재를 예견한 듯 앞으로 나아갈 의지조차 없는 젊은이들의 초상과도 같았다.

"참, 이상하죠. 세바스티앵은 정말 저예요.
엘레오노르는 완전히 저예요."
독자들의 이런 자기 동일시는 진절머리가 난다.
그것이 적어도 나에게는 성공의 밑거름이었던 같아 안타깝다.
프랑수아즈 사강이 생각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모든 인간은 언제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에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는거... 문제는 현실 앞에서 뒷걸음질치는 나약함 그리고 늙는다는 것에 무릎꿇고 더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말하는 그녀의 어느 하루의 끄적임이 이 책에 들어있었다.
어느시간 어느곳에 있던지 작가로서의 그녀는 글을 쓰는 행위를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소환한 극중인물은 과거 <스웨덴의 성>에 나왔던 인물들이었다. 유쾌한 남매라고 소개했지만 독자의 입장에선 전혀 유쾌하지 않았던 인물... 바로 스웨덴 남매... 남매라고는 하지만 연인과도 같았도 어떤 밀월의 방황을 하더라도 언제든 돌아올 휴식처같은 곳,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단단한 끈으로 엮어진 남매의 우애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할 생각없이 기회를 옅보며 타인에게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한심한 인물들이었다.
바람둥이도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지만 여자와 술의 조합은 좋아한 세바스티앵 그리고 삼십대의 끝자락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뭇남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닌 엘레오노르... 서로에 의해 삶의 경계가 그어지고 하룻밤의 환락으로 하루를 버티는 그들은 현실을 마주하려 하지않았다. 벼룩처럼 빌붙어 사는 그들의 마지막은 과연...
일년의 기간동안 잊을만하면 이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프랑수아즈 사강의 사색은 자전적 소설처럼 자신의 삶을 이야기 속에 반영하고 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스웨덴 남매의 여의치않은 상황과 게으름을 말하며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삶에 대해 비판하는 듯 했으나 어쩌면 자신이 가진 이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던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돌봐주지 않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돌봐야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건 아닐까? 어느 한순간 따뜻한 손을 내어줄 수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