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트] 행성 1~2 - 전2권 ㅣ 고양이 시리즈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전미연 옮김 / 열린책들 / 2022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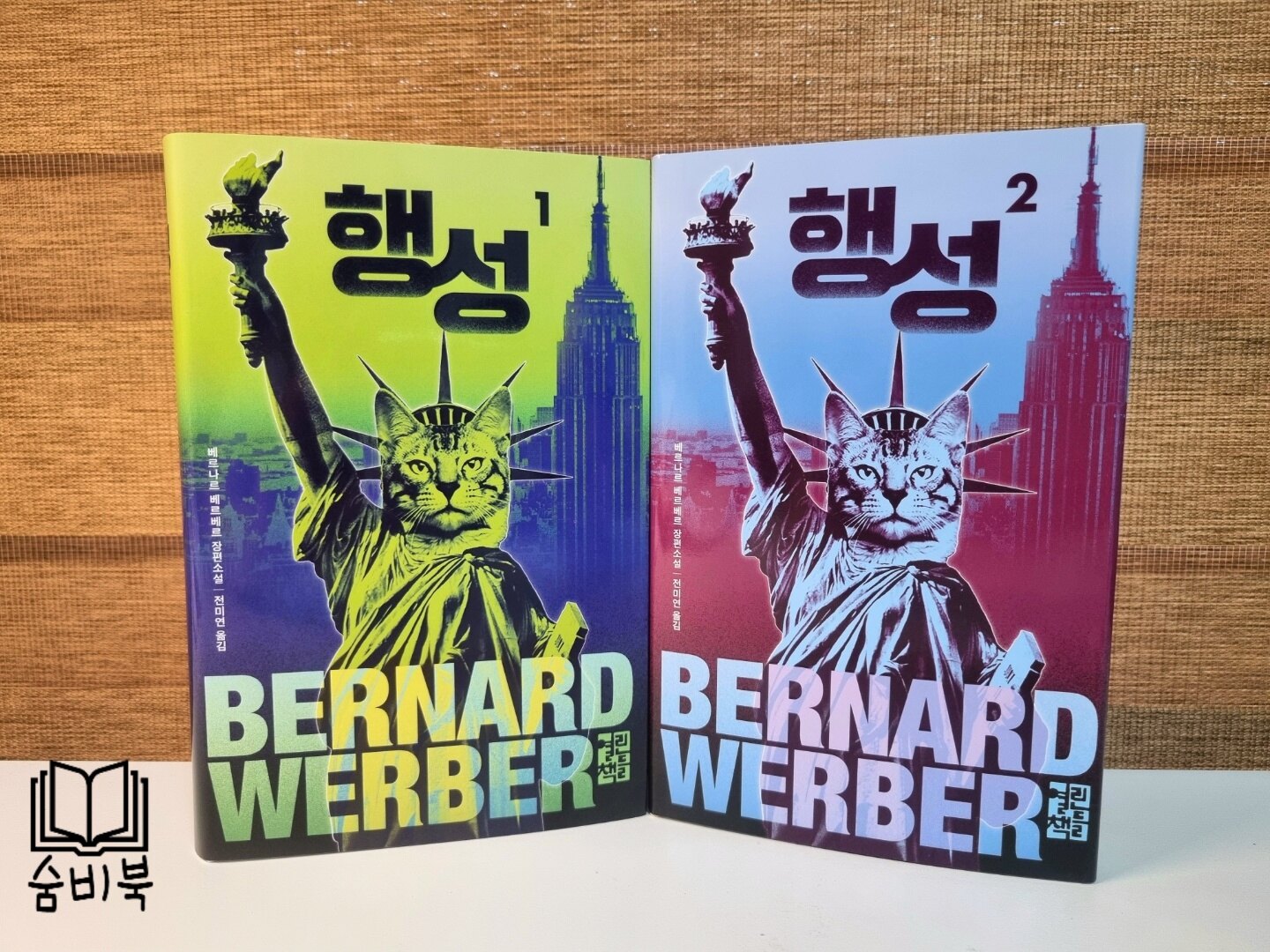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이다. <행성>은 <고양이>,<문명>에 이어지는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명성만 듣다가 처음으로 그의 책을 만난다. 독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스토리텔링의 대가답게 처음부터 흡입력이 대단하다.
한 광신주의자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단초가 되어 내전이 발발했고, 인류 문명은 순식간에 와해된다. 문명이 사라진 세상은 설치류인 쥐들의 세상으로 뒤덮였다. 주인공은 화자로서 인간이 아닌 암고양이 '바스테트'다. 이마에 제3의 눈이라는 기계장치를 이식했고, 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며 인간의 지식을 배우고 흡수할 수 있는 일종의 초능력을 지닌 비범한 고양이다.
온 세상이 쥐 떼로 뒤덮인 가운데 바스테트 일행은 자신들의 고향 프랑스를 떠나 배를 타고 항해하여 미국 뉴욕에 이른다. 전작 <고양이>와 <문명>의 이야기가 끝나고 <행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전작과 연속성이 있지만 굳이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만큼 작가의 스토리 구성력이 환상적이리만치 탁월하다.
35일의 항해 끝에 도착한 뉴욕 또한 쥐 떼로 덮여있다. 남은 인간들은 뉴욕의 높은 빌딩에 갇혀 쥐 군단의 공격을 방어하며 연명한다. 바스테트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뉴욕 빌딩의 인간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고 이후 시시각각 조여오는 쥐 군단의 공격에 맞서 위기에 빠진 인류 문명의 회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모험을 시도하게 되는데...
고양이 바스테트가 가진 제3의 눈은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을 연상케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전지적 지혜의 전시안을 가진 바스테트는 그가 가진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통해 인류의 모든 지혜에 접속한다.
책의 곳곳에서는 바스테트가 위기의 순간을 맞아 지구와의 소통, 자연과의 합일, 우주와의 교류를 행하는 장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바스테트는 육체에 갇혀있지 않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순수한 정신을 통해 인류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내는 구세주로서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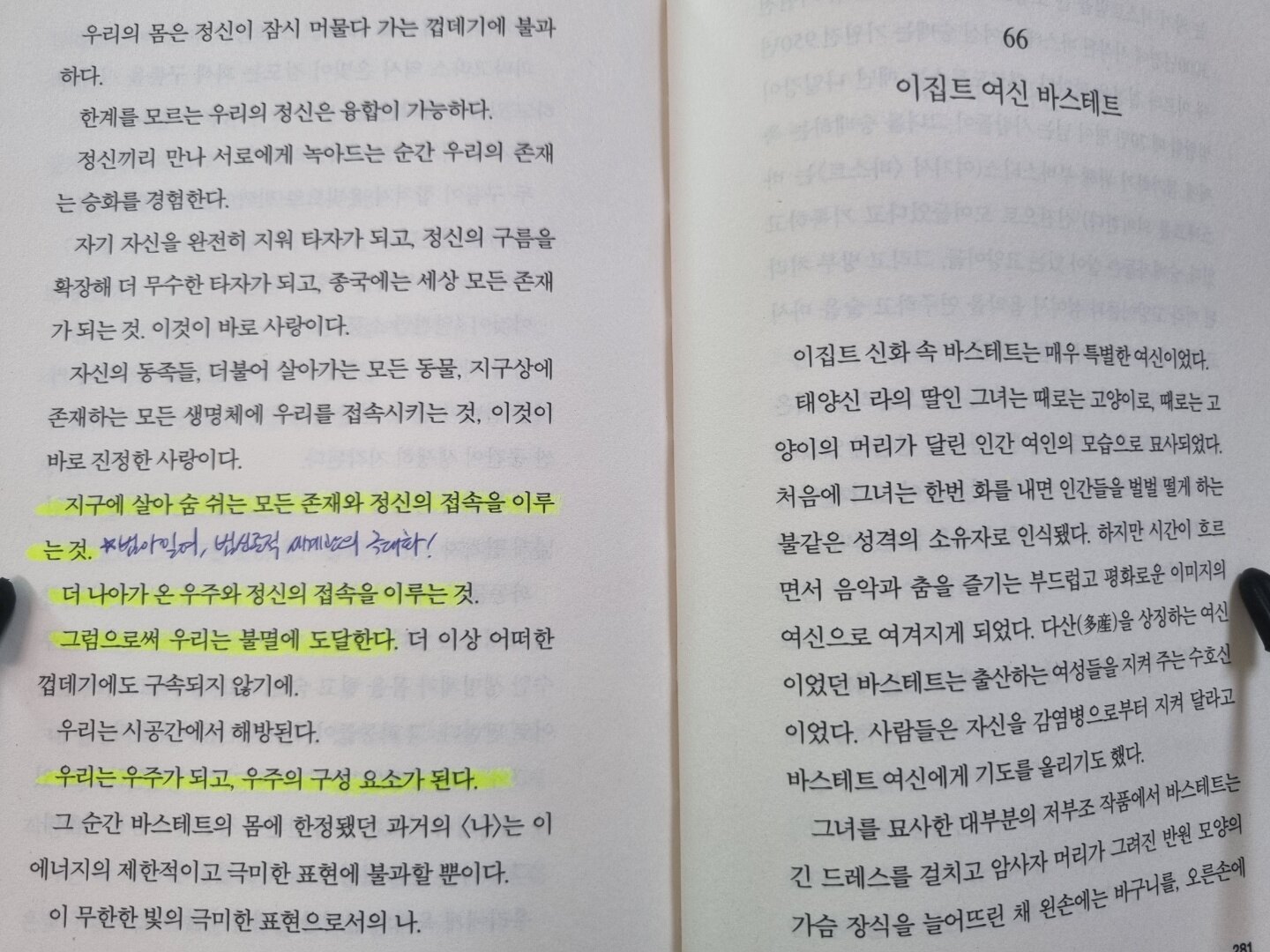
저자는 촌각을 다투는 쥐 군단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살아남은 인간 집단의 모습을 통해 인간 문명의 패악성과 내면적 취약성을 비꼼과 동시에 종간 소통을 말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의 소통과 평등, 모든 차별의 종식이다. 신이라는 절대자가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가 가진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충분히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책의 메시지는 범아일여, 범신론적 세계관의 극치다. 만물 안에 깃든 신성,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인간이 곧 우주이며 신이라는 인간 잠재력의 극대화를 외치며 내면 안에 잠든 신성을 깨운다. "절대적인 신적 존재는 없다. 당신이 곧 신이다!"
이렇듯 살아남은 항서류와 설치류의 대결구도 속 책의 이면에 숨겨진 저자의 메시지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독자 포인트다. 온 땅을 뒤덮은 쥐 군단은 병든 인간 본성의 상징이며 결과물이다. 세계의 절멸이라는 직접적 도화선이 된 내전은 어느 광신주의자의 어린이 학살로 시작되었다. 참된 정신이 마비된 광적 행위가 인간을 파멸로 몰았다. 결과는 뼈아프다.
저자는 아나키스트이며 무신론자로서 인간 이성의 빼어남과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허구의 신을 마음껏 희화화하며 인간의 절대성과 무한 잠재력을 신뢰한다. 반면 참된 이성을 망각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동시에 일갈한다.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의 결과가 빚어낸 끔찍한 현상을 목도케하는 장치로 쥐를 사용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작중 인간들은 쥐고기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취식한다. 자신들이 만들어 낸 '죄로서의 쥐'를 먹는 인류에 대한 풍자이며 문학적 메타포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베르나르를 연호하고 그의 작품에 열광하는지 이유를 알 것만 같다. 흥미 있는 킬링타임용 소설로만 정의하기에는 책이 너무 아깝고 집필에 들어갔을 저자의 노력이 허망하다. 요 며칠 재미있게 잘 쓰인 종교 철학서 한 권을 만난 것 같다.
역사와 자연 철학, 영지주의와 같은 고대종교와 불교, 힌두교, 기독교, 뉴에이지 세계관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패러디한 작가의 박학다식함과 문학적 상상력, 위트가 신선하다. 역시 세계적 글쟁이 다운 면모다. 책의 곳곳에 숨겨진 인문학적, 종교적 코드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하기에 그의 전작들이 궁금하고 후속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