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면을 끓이며
김훈 지음 / 문학동네 / 2015년 9월
평점 :




김훈. 이 시대의 몇 안 남은 글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작가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며 배우고 싶은 작가다. <칼의 노래>이후 <현의노래>, <남한산성>, <밥벌이의 지겨움>, <달 너머로 달리는 말>, <개>등을 읽었다. 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 흑암 속 글들은 김훈의 손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고 하얀 원고지 위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지닌 채 한바탕 신명 나게 춤사위를 펼친다. 글의 움직임은 개별적이지만 통합적이다. 그러나 그 통합 속에는 강제와 억압, 개별성의 마모는 없다. 대신 어울림과 연합으로서 한 몸으로의 나아감이 있을 뿐.
그렇기에 김훈의 글은 낱알과 같이 흩어지지만 어느 순간 찰지고 비린 밥 한 공기와 같이 뭉쳐져 읽는 이의 의식 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묵직함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역사 소설과 단편, 에세이 등을 썼다. 이제는 절판되어 김훈의 마니아들이 중고서점을 돌며 발품을 팔아 구했다는 <밥벌이의 지겨움>은 이미 전설적이다. 최근 들어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절판된 몇 권의 책들과 새롭게 쓴 글들을 엮어 두 권의 산문집을 냈다. 그중 한 권이 <라면을 끓이며>다.
나의 '김훈 바라기'는 그의 산문집을 서가에 들어 앉힘을 기꺼이 허용한다. 글이 막힐 때 그의 책들을 꺼내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죽어있던 상념의 어휘들이 살아 꿈틀대는 좀비와 같이 징그럽게 부활한다. 어쩌면 이런 불경스러운 이유가 나를 김훈으로 이끄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
<라면을 끓이며>는 작가가 자신과 일상, 세계 심지어 사물에까지 사유를 확장시킨 결과물이다. 김훈이 김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같은 범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고 미치지 못하는 그 생각의 깊이다. 타이틀 작 '라면을 끓이며'에서 작가는 라면이라는 소시민들의 허한 창자를 달래주는 싸구려 음식에 대한 그만의 깊은 상념과 사유의 나래를 펼친다. 라면 한 봉지를 통해 배고픔이 일상화된 서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논한다. 못 먹고 살던 시대에 대한 그만의 건조하고 짧게 쳐낸 문체가 라면 스프의 MSG 만큼이나 중독적이다. 먹다 보면 아니 읽다 보면 중독되니 나 같은 서평 나부랭이의 입에서는 한탄만 나올 뿐이다. 어찌하면 가진 생각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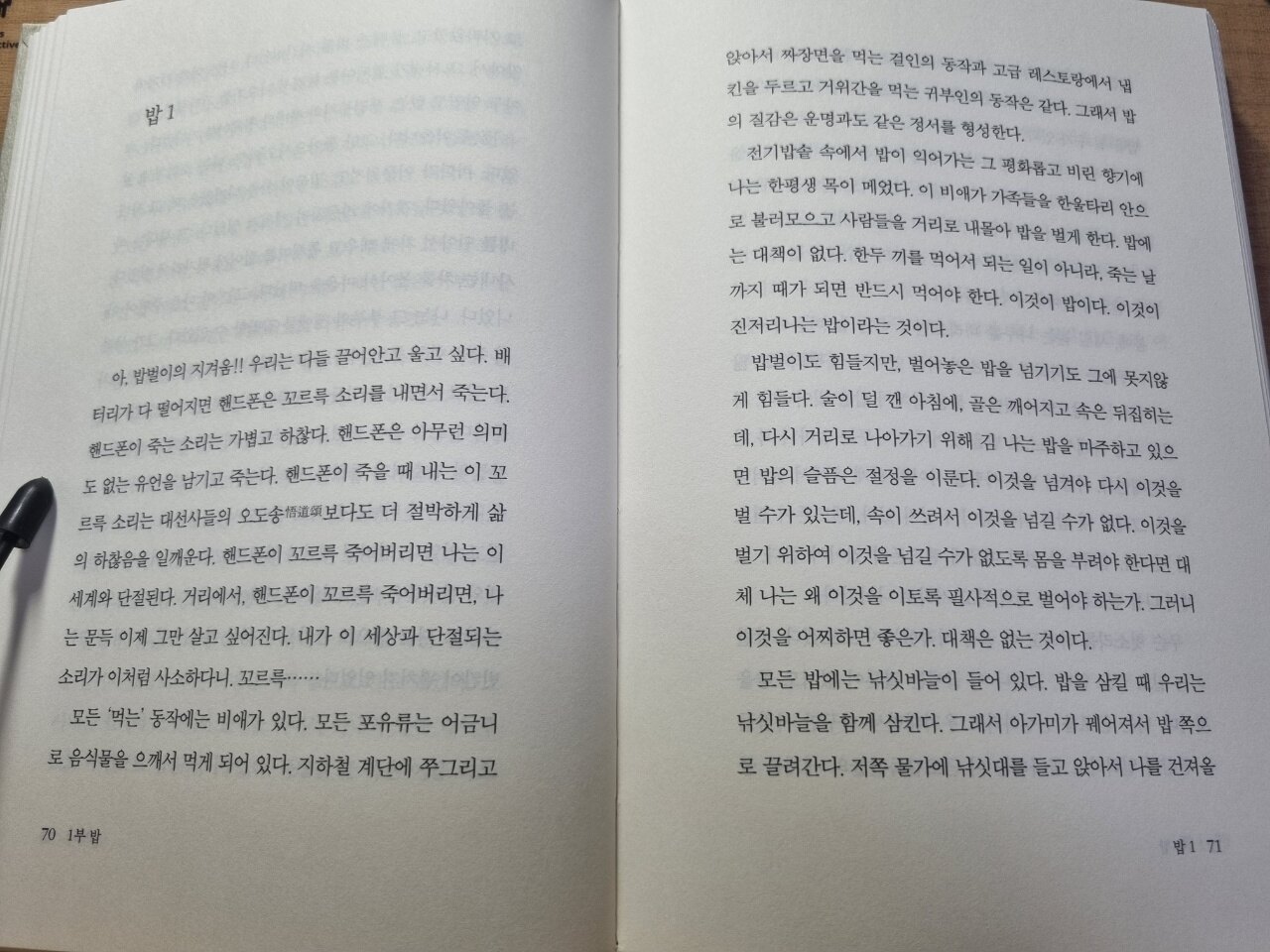
총 5부로 묵였다. 전부 명필 명문이기에 어느 하나 폐기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밥에 대한 김훈의 상념은 치열하다. 문학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일갈했던 작가의 인터뷰 전문을 읽은 적이 있기에 그의 밥과 일상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짐작이 간다. 결코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철저히 현실적이다. 땅이 주는 저항과 압력을 받아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재를 인정한 사람이다. 따라서 먹고사는 일상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입안으로 밥알을 넘기는 일을 천박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고귀하고 성스러운 일로서 미화했다. 그것이 그의 전설적 산문집 <밥벌이의 지겨움>에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책에서 그의 산문 몇 개를 체에 걸렀다. 벌어 놓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는 밥이 주는 고뇌와 삭힌 비애가 남다르다. "이것을 넘겨야지만 또 이것을 벌 수 있을 텐데"라고 탄식하는 문장에서 눈물이 난다. 먹고살아야 하기에 끊어질 듯한 몸뚱이를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한다. 내가 경험해 봤고 그 경험이 현재진행형이기에 밥에 관한 작가의 단상이 책을 읽는 내내 저민 슬픔으로 마음을 후빈다.
또한 펜을 잡은 사람의 역할을 이 땅의 실제에 한정시킨 작가가 자신의 펜을 겨눈 곳은 2014년 4월의 팽목항이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김훈의 생각이 실려있기에 책의 가치가 남다르다. 정치적 색안경을 벗고 객관성을 유지한 채 읽어보라! 범접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글쟁이가 바라본 세월호 침몰에 대한 글이 소름 돋는다. 마음에 묻은 아픔이 순장되어 땅속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울부짖는 자들의 뒤척임과 같이 생생하다.
글이 무섭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책. 김훈의 글이 무섭다. 세월호라는 건국 이래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지극히 건조한 문체로 감정을 절제하며 써 내려간 흔적이 역력하기에 닭살 돋는다. 삭풍에 바싼 말린 어물과 같이 주관과 감정을 걷어낸 체 시쳇말로 팩폭한다.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말쟁이들의 억지스러운 비아냥과 어설픈 변명이 원천봉쇄된다. 행여 덤볐다가는 살아나올 수 없는 글의 부비트랩이 도처에 깔려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개별적 아픔을 보편적 아픔으로 승화시킴으로서 글쟁이의 역할을 다한다. 명불허전! 김훈!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철학적 사유의 깊이는 이제 더는 올라갈 곳이 없다. 풀어놓는 글의 향연은 이미 경지다. 현실에 뿌리박혀 있는 작가의 시대를 인식하고 조망하는 식견을 따라갈 재간이 없다. 몸으로 부딪쳤고 그 안에서 느끼며 울었다. 그 잦은 울음 속 공간을 헤집고 들어와 저만의 똬리를 튼 채 자리한 상념들이 사물과 일상, 인간과 세계, 사건과 사고라는 주제를 배태하고 출산한다. 글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가! 이런 작가와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야말로 축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