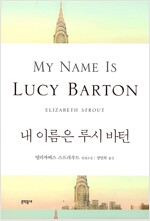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무작정 무엇이든 쓰고 싶어진다. 루시가 쓰는 사람이고, 어떤 어긋난 순간이라도, 일단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나의 것, 내가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기억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루시는 일상의 균열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평온한 한때를 예고 없이 기습하는 어두운 감정,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용, 관계의 본질에 대한 거의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는 마법 같은 찰나를 잡아채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박제한다.
비비언 고닉의 에세이를 읽으며, 이 사람은 타인이 보지 못하는 세계의 미묘한 틈새를 보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루시를 보고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루시 바턴'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창조한 소설 속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고 있음직해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에세이를 쓴 것처럼 느껴졌다. 배경이 뉴욕이고 뒤틀린 모녀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닉이 연상된다.


실존 인물 루시 바턴이 쓴 에세이 같다는 느낌은 이 소설의 메타텍스트성에서도 기인한다. 루시는 본인이 왜 이 글(우리에게는 소설이지만 루시에게는 자전적 기록)을 쓰기 시작했는지 그 계기를 밝히기도 하고, 본인이 쓴 글을 세라 페인이라는 작가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세라 페인은 루시의 글을 논평한다. 소설 속 인물의 논평이지만 현실의 독자에게도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석으로 기능한다.
그래도 당신은 절대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요. 자기 글을 절대 방어하지 말아요.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건 당신도 알 거예요. 이건 자신이 전쟁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괴로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건 그의 곁을 지켰던 한 아내의 이야기예요. 그 세대에 속한 아내들은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녀가 딸의 병실에 찾아와 모두의 결혼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맺었다는 이야기들을 강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그녀 자신도 몰라요. 이건 딸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불완전한 사랑이긴 하지만요. (124)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가장 절박하게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던 것,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저 좀 저기서 빼내주세요. (97)” 절박한 필요에도 끝내 그런 말을 뱉지 못한 것,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집에서 탈출한 것, 모든 게 괜찮을 때도, 오히려 모든 게 괜찮아서, 악몽을 꾸는 것. 내게는 이런 부분이 다 내 이야기로 읽혔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아이였을 때 품게 되는 아픔에 대해, 그 아픔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며 너무 커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갈망을 남겨놓는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꼭 끌어안는다. 펄떡거리는 심장이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끌어안는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거야. (217)
루시가 하게 될 단 하나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간의 이면을 알고도, 결핍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따스함을 갈구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곁에 있다면 루시는 내가 동류인 걸 알아보았을 것이다.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서늘한 고독을 눈치채고 배려와 다정함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성글게 아문 자리에 불이 있는지 얼음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나는 루시에게만은 다 털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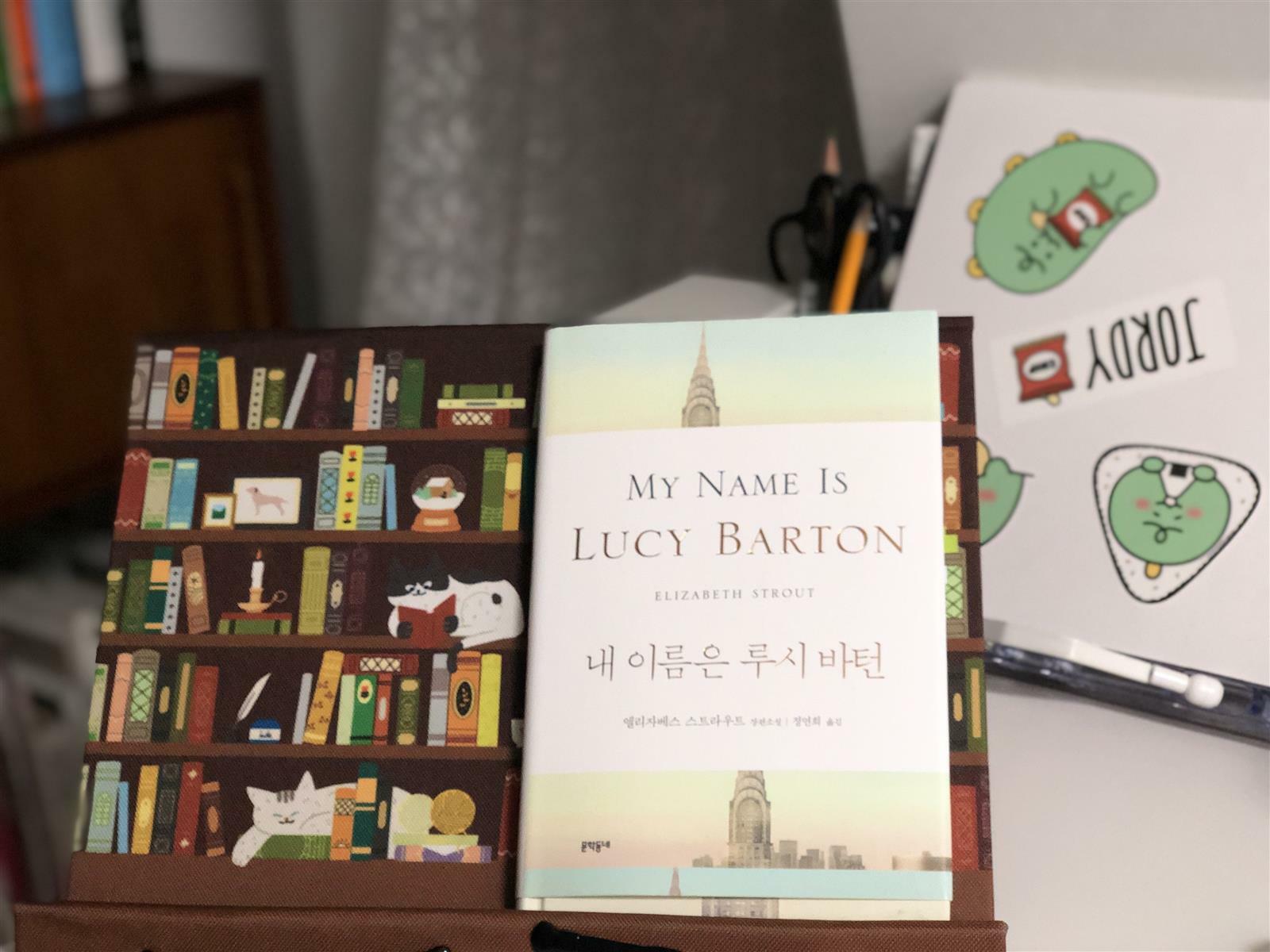

+언젠가 읽고 싶어질 게 틀림없음을 예견하고 미리 스트라우트의 소설을 모아두었던 내 자신을 격하게 칭찬한다!! (이걸 왜 이제 읽어쒀..) 어떤 소설을 읽기 전의 나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으리란 이런 강렬한 계시는 정말 오래간만이다.


하지만 나는 진정, 냉혹함은 나 자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게 나야. 나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곳--일리노이 주 앰개시--에는 가지 않을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생활은 하지 않을 거고, 나 자신을 움켜잡고 인생을 헤치며 앞으로, 눈먼 박쥐처럼 그렇게 계속 나아갈 거야!, 라고. 이것이 그 냉혹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P204
앞에서도 한 말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보다 스스로를 더 우월하게 느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지가 내게는 흥미롭다. 그런 일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일어난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건, 나는 그것이, 내리누를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저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P111
누군가가 그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망신거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많은 순간에 그런 사람이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P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