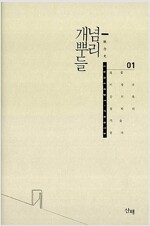"'주체', '벗어남'을 넘어, '바꾸어-나감'으로!!"
<주체란 무엇인가>의 강사 이정우 선생님의 인터뷰입니다. 본 인터뷰는 도서출판 그린비에서 제공합니다.
학부에서 전공은 '공학'이셨고, 대학원에서부터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방향 전환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공학에서 철학으로 옮긴 것에는 대체로 두 가지 맥락이 있다. 하나는 이론적인 맥락에서인데…… 공학을 하다 보니까 물리학, 화학, 수학 그리고 양자역학 같은 순수과학에 흥미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오는 과학철학적인 것을 접하게 되었다. (그때는 ‘과학철학’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말이다.) 그 런 존재론적인 요소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맥락은 그 당시에, 내가 대학교 2학년 때가 1980년대인데, 그때 여러 가지 사회현실을 보면서 공학에 안주해 있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런 현실을 나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돌파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미학강좌, 예술철학 강좌를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실 미학과를 가려는 생각도 있었다. 그랬었는데, 당시 선생님이셨던 오병남 교수님께서 미학을 하려면 어차피 철학을 해야 하니까 철학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다.
주제를 '주체'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체라는 개념을 쓰게 된 이유는 『사건의 철학』에서 ‘무위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가로지르기』에서는 ‘가로지르기’를 살릴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런 말들을 던져 놓았는데,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명료화 해보고 싶었다. ‘주체’는 사실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늘 만나게 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말하면서 ‘무위인’이라는 개념을 명료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철학 공부는 막연히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철학적 담론에 접근하는 개인의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철학이 전개된 순서, 철학의 분야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기보다는 관심사에 직접 뛰어들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과목들, 수학이나 영어와 같이 학교에서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철학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땐 늘 부딪히게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의 폭이 넓은 그런 개념들을 각자의 맥락과 주제, 문제의식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사유를 전개한다. 그런 개념-뿌리들에 익숙해지는 것, 예컨대 시간이라고 하면 이 개념이 철학사에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익혀야만 하이데거의 시간론이나, 들뢰즈의 시간론, 마르크스의 시간론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공부를 무시하고 중간에 뛰어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철학담론을 읽을 때 언어의 복잡한 결과 두께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념어총서 WHAT>을 통해 철학, 인문학 공부를 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어떤 개념을 봤을 때, 그것을 그 말에 들어있는 두께를 생략한 채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인상을 가지고 쉽게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가령 ‘소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지 ‘수적으로 적은 사람’을 가리키는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 어떤 언어가 자기에게 주는 인상을 가지고 곧장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 데서 정말 많은 오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 이정우 선생님 소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과 미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로 석사학위를, 미셸 푸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철학아카데미 원장으로 시민 교육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념—뿌리들 1, 2』(2008, 2009),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2008), 『천하나의 고원』(2008), 『세계의 모든 얼굴』(2007), 『탐독』(2006), 『담론의 공간』(2000), 『들뢰즈 사상의 분화』(공저, 2007) 등을 썼고, 『지식의 고고학』(2000), 『의미의 논리』(1999),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공역, 2009), 『들뢰즈, 유동의 철학』(공역, 2008) 등을 번역했다.
저자의 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시대, 해방 이후,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배치들은 계속 변화해 왔다. 배치-사건들의 이러한 변화, 그 변화를 둘러싼 국가-자본주의의 지배와 민중의 저항, 오늘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삶의 각종 배치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수놓을/수놓아야 할 각종 배치들을 사유하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들뢰즈 사상의 분화』머리말 중에서)
인간은 단순한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생명체로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란 주체로서 존재한다. 인간은 개체이자 생명체이자 주체이지만, 전자의 두 층위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마지막 층위만이 고유하고 충분한 것이다.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다보면서 사유할 때 주체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으며, 어떤 논의를 하든 사유의 핵심에 놓여 있는 문제라 하겠다.
(『주체란 무엇인가』, 「맺음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