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밤에 잠도 안오고 술 마시기도 귀찮아 책방 정리를 했다.
그러다 오랜만에 이문구 선생의 <우리동네>를 원래 꽂혀있던 책장에서
다른 책 섹션으로 옮겼다. 아마 이 책의 판본은 1990년도나 1991년도 판본일것이다.
(그 이전 판들의 표지에는 11이라는 숫자가 없다.)
나와 23년을 함께 했네. 어디서 샀던가.
1991년도면 복학해서 이젠 정신차리고 살아야지 매일 밤 술김에 다짐을 하지만
그 다음 날이면 또 맹탕으로 살던 시절이었을게다.
처음 읽고 나서 너무 좋았다. 느려터지고 의뭉스러운 충청도 대천 사투리를
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리듬과 가락이 좋았다. 국어 사전을 옆에다 두고
한달에 두 번도 읽고 1년에 네번도 읽고 심심하면 읽었다.
그 시절 연애하던 선배하고 데이트하면서도 읽고 술 마시고 나서도 읽었다.
그러다 우리동네 김씨, 이씨, 황씨들과 정이 들었다.
나는 '글줄이나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이문구 선생과 <우리동네>를 알고 또 그 책을 읽었는가로 판별한다.
(내 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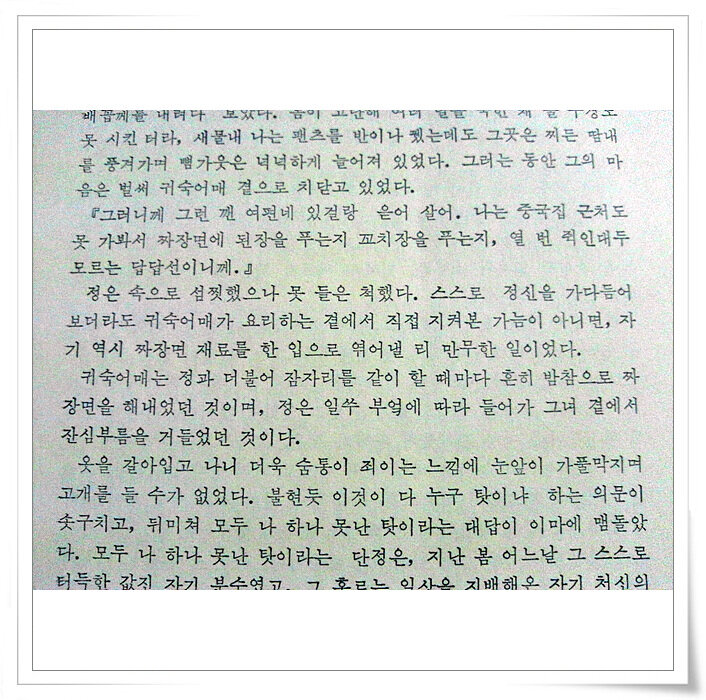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터부터 이 땅 밖에서 일하는 기회가 많았다.
가지고 가야 할 기본 장비 운송료 때문에 개인 화물을 최소화해야 했기에
옷가지 몇벌 외에 가져갈 수 있는 개인 짐은 최소화해야 하는 게 당시 지침이었다.
그때 내가 챙긴 것이 디스 담배 다섯 갑과 이문구의 <우리동네>였다.
그때부터 여태껏 멀리 떠나는 출장이나 여행 짐을 챙길 때 나는 제일 먼저 담배 한보루와
이 책을 가방 맨 아래에 넣어 둔다. 그래야 짐을 다 챙긴 것 같다.
말 그대로 먼 길 떠나는 나에게 Linius' blanket인 셈이다.

대부분 몸 팔아 돈벌러 다니는 길이었지만 이 책을 들고 세상의 절반을 다녔다.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정글도 갔다
싸늘한 사막의 밤에 돗자리를 깔고서 이 책을 읽었던 날도 있었고
눈과 얼음이 '막 날아다니는' 산 정상에서도 읽었다.
미국에 1년 가까이 살 때는 영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우리동네> 김씨편을 큰 소리로 낭송하며 동네를 걸어다니기도 했다.
내 부박한 생의 위로가 되었다.
나는 연전에 이문구 선생이 세상 떠났을 때 이 책을 앞에다 두고
선생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재배하고 자작 음복했다.
곧 이 책을 다시 가방에 넣어야 할 날이 다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