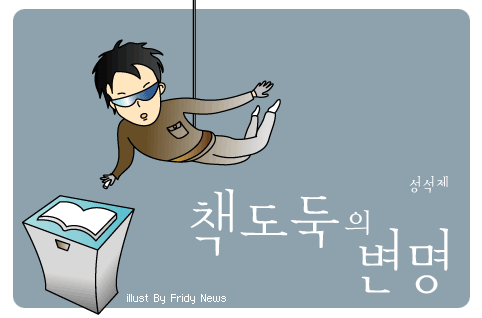
한때 나는 책 도둑이었다. 십대 중반에서
이십대 초반까지 닥치는 대로 도둑질을 해댔는데 그 무렵에는 다른 도둑은 몰라도 책 도둑에 대해서만은 좀 너그러운 분위기라서
손모가지를 자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 쉽게 훔쳤는지도 모르겠다.
처음 책을 훔친 건 중학교 때였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맨 처음 발견한
건 본관에서 떨어진 아담한 건물에 있는 도서관이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도서관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
도서관은 문과 창문을 제외하고는 사면이 천장까지 서가로 꽉 차 있었고 서가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었다. 입학식을 한 다음날
나는 수업이 끝난 뒤 그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발견했나니 첫 번째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책꽂이에서 아무렇게나 뽑아든 그 책은 ‘하므리카’라는 가상적인 세계를
탐험하는 박사와 그의 조수의 이야기로 하므리카인들의 양식은 꽃향기인데 꽃의 비료는 사람의 방귀라는 식의 황당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내 수준에는 딱 맞았다. 문제는 그 책이 좀 두꺼워서 단숨에 다 읽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책을 빌려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책을 내 소유로 하고 싶다는 충동에 어처구니없이 간단하게 지고 말았다. 집에 가지고 가서 읽고 또
읽을 작정이었다, 오직 나 혼자서만! 그때부터 건성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주변을 살폈는데 그제서야 입구 근처의 탁자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눈에 띈 게 아니라 내 망막과 시신경과 뇌에 광속으로
진주해왔다.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밥도 안 먹고 방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았다. 책을 훔치다 들킨다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경멸할 것인지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오, 재미냐, 아름다움이냐. 아, 소유냐, 삶이냐. 고민을 하고 있던 내게
선생님이 기회를 주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나는 번개처럼 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런데 입구에서 누군가 팔을 턱 내밀어 나를 가로막았다. 2학년이었고 도서반원이었다. 그 와중에 질투가 날
정도로 잘 생겼던 게 기억난다.
그 연적, 아니 잘나 빠진 도서반원은 내 이름과 반을 적고 무릎을 꿇은 채
팔을 들게 했다. 곧 선생님이 돌아왔다. 화장실에 다녀왔는지 손에 물기가 있었다. 선생님은 분홍 꽃무늬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를 일어서게 한 다음 “책 훔친 것을 큰 소리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가게 해주겠다”고
무관심하고 의례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무관심이 나를 책도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책임전가일까. 나는 관심을 얻으려고 책을
훔쳐왔노라! 20대 초반 군대를 가서야 책도둑질이 멈춰졌는데 그 무렵 그 선생님처럼 완미한 사람을 만나고 그의 관심을
얻었는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재능 있는 책도둑은 아무 책이나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훔친다. 다른 것이 아닌 책을 훔침으로써 문명과 역사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지식과 감성의 이종교배로 유전자를 개량할
수 있다. 훔친 책은 가슴을 뛰게 하는 긴장이 부작용처럼 곁들여지고 잘 읽히고 쉽사리 잊히지 않았다. 나보다 수준 높은
책도둑의 서고에서 동굴 속의 알리바바처럼 넋이 나가 서 있던 적도 두어 번 있다. 그 정선된 보물을 다시 훔침으로써 우리
책도둑들은 시대정신을 공유했다.
책을 훔치면서 알게 된 진리가 하나 있다. 훔친 책은 언젠가는 도둑질을
당한다는 것이다. 군대에 갔다왔더니 어떤 녀석인지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가며 훔쳐 모은 책만 골라 가져가 버렸다. 샀거나
물려받은 책은 귀신처럼 알고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