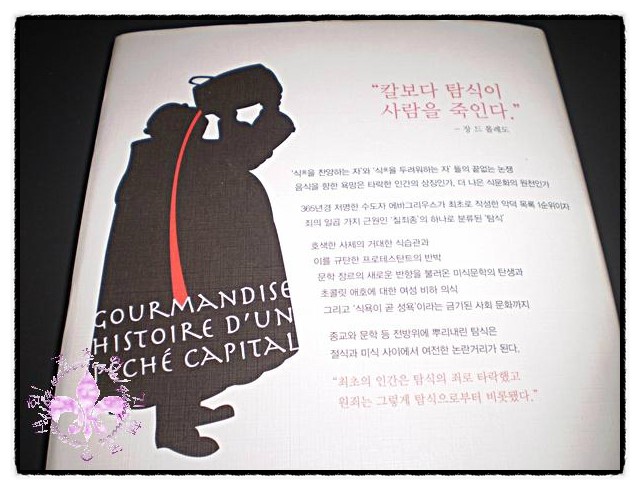-

-
제7대 죄악, 탐식 - 죄의 근원이냐 미식의 문명화냐
플로랑 켈리에 지음, 박나리 옮김 / 예경 / 2011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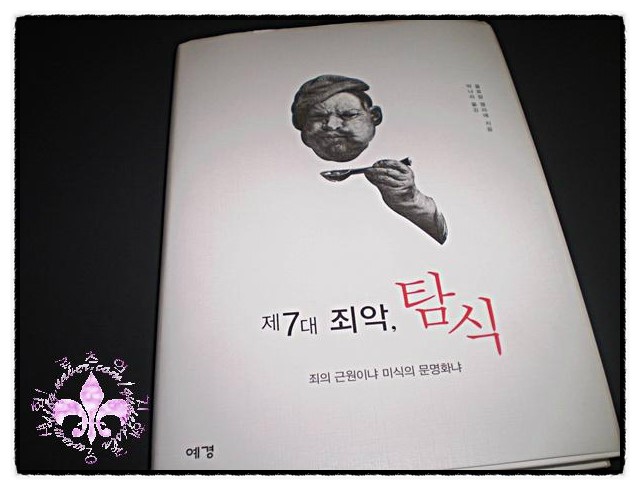
중세 서양의 기독교 신앙은 그 시대의 "사상,정치"즉, 정신적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종교의 원죄(첫번째 죄악) 은 바로 "탐식"이였다.
아담과 이브는 간악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신이 금지한 "금단의 사과"를 먹게된다.
그들은 금단은 과실을 탐하여, 수치심을 알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나, 신의 분노를 받아, 결국 추방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종교인들이 "음식을 탐하는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했고,
금식과 소박한 식사를 권하였으며, 맛을 탐구하는 행위를 막았다.
그러나 "다크 에이지" 중세의 "암흑시대는"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있는 안정적인 시대가 아니였다.
결과적으로 교리의 "검소함"은 부유한 기사, 귀족,영주,왕들의 금욕적 생활을 강제하는 제동장치 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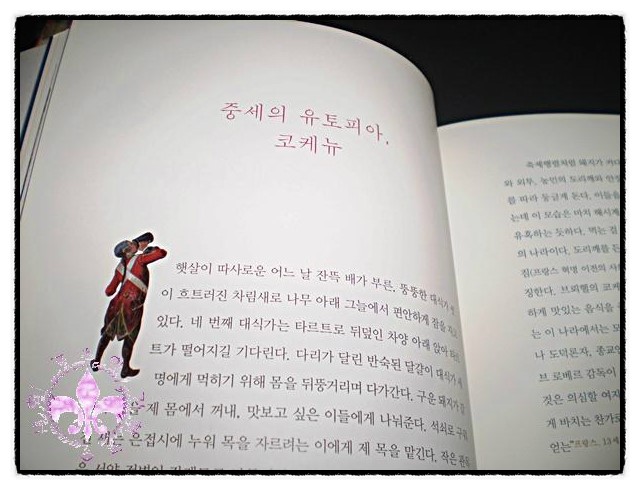
그러나 "맛" 은 인간이 갈망하는 원초적인 욕구중 하나이다.
중세의 "우스갯 이야기"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신께서 농노에게 그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약조를 했다.
농노는 소원으로 "자기가 올라 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순대"(소시지) 를 원했다. 자랑스럽게 부인에게 소시지를
자랑하자, 부인은 버럭 화를 내며, 바가지를 긁는다.
"강력한 왕국도, 화려한 보석도, 따뜻한 옷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서 고작 소시지 하나를 얻었단 말이냐!!!
당신은 농노의 이러한 소원을 이해 할 수 있는가??
중세의 대다수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렸다. 배불리 먹는것은 하나의 특권이였고, 요리의 다양함은 권력과 힘의
상징이였다. 중세인은 영양보다 맛을 추구했다. 재료의 맛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 일종의 연금술처럼
전혀 새로운 맛을 추구했다. 대부분 요리들은 신맛,매운맛,단맛이 나게 하였고, 향신료와 조미료를 "가득"
넣는것이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였다.
중세말 이러한 "사치"는 의미가 없어졌다.
"미식"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사건건 검소함을 추구하는 교리와 충돌했다.
이제 미식가들은 재료의 맛을 이끌어내고, 와인의 맛을 구별해내며, 복잡미묘한 숨김맛을 찿아내는, 오늘날의 "미식가"
와 같은 능력과 지식을 축척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교리는 약화되고, 젠트리의 영향력 확대
왕권의 약화로 인한 요리법과 기술자들의 유출로 인하여 "맛" 을 추구하는 음식문화 는 나날이 발전하게 된다.
그 결과 "배불리 먹는 행위" "적당히 통통한 몸매" 는 그시대의 긍정적인 기준이 되었고, 한국 만 해도, 80~90년대까지
배가 나온다는 것은 "관록" 이라하여 그리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보다.
오늘날에도 많이 먹는 행위 "탐식"은 자기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로 비추어진다.
과거 종교의 교리가 "소식"을 권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문화와 의료"가 소식을 권장한다.
마른 몸매가 건강함의 상징으로, 담백하고 적당한 요리가 다시 부각받는 "웰빙시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탐식"은 환영받지 못하는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