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슬프지만 안녕 - New Edition
황경신 지음 / 큐리어스(Qrious) / 2015년 10월
평점 :



2006년 같은 제목의 <슬프지만 안녕>이
출간된 지 딱 10년 만이다. 리뉴얼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느낌이 나는 것은, 내가 이전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무언가
많이 고쳐졌다는 느낌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2006년에 출간 된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제목이 주는 느낌과 책
표지의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읽어보고 싶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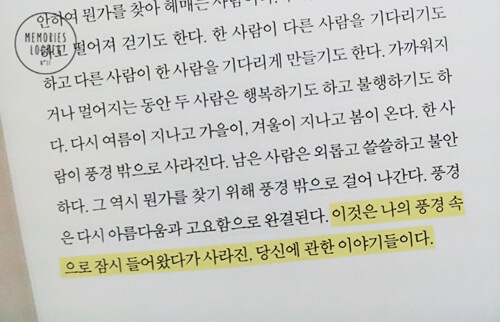
<슬프지만 안녕>은
짧은 17개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막 꽃 피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덤덤하지만 아픈 '이별 이야기'이기도
하다. 혹은 사랑과 이별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다. 뭔가 세련된 느낌을 받았던 책 표지와는 다르게 내용들은 꽤나
아날로그적이다. LP판, 타자기, 낡은기타, 오래된 카페, 기차도 잘 서지 않는 기차역 등. 그렇게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이야기들은 한사코
안녕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듯,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만남과 이별을 한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나의 풍경 속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사라진, 당신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라고. 이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자세히 들춰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한 것이다.
소소하지만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자세히 보면 알고싶은. 책을 펼치면 보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그랬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가장 상큼하게
읽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인지 모르게 내용이 따스한 느낌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서 마음에 들었다. 이야기의 제목은 '녹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다.
커피숍 앞 레코드 가게.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가 며칠 째 와서 레코드 가게의 주인에게 말을 건다. 무관심한 듯 책을 읽던 레코드 가게의
주인과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하는 여자아이가 보인다. 한달 후 레코드 가게 문은 닫혀 있는데 이번엔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인다. 그리고
그 여자를 발견한 예전 그 여자아이가 마주한다. ㅡ장면으로 치면 고작 2~3장면 밖에 되지 않았을 장면이다. 아마도 작가는 커피숍에 앉아서 봤던
몇 장면만으로 이야기에 살을 붙였던 게 아닌가 싶다. '나의 풍경으로 들어왔다 사라졌다'라는 작가의 말을 자꾸 곱씹어보면, 자신이 스쳐갔던
지켜봤던 풍경 속에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니 말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몇 장면으로 이루어진 스톱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자신의 마음을 숨길 줄 모르는 여고생의 순수함과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 순수한
여고생이 던지는 "그 정도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라는 촌철살인의 멘트까지. 자신들의 흘러간 사랑에 대한
존중과 미련을 한데 묶어 시간 속에 날려버린 어른들의 모습은 따뜻했고, 여자아이의 일방적인 고백은 데이트로 승격하여 보는이를 웃음짓게 해서 이
이야기가 좋다. 쇼팽의 녹턴의 부드러움을 닮은 그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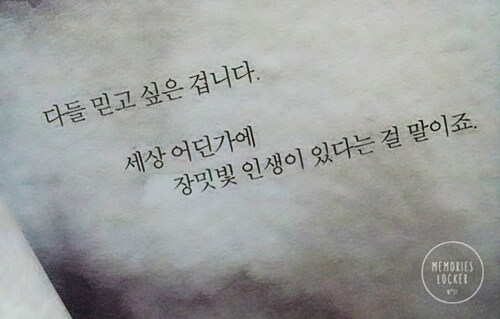
또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는
'장밋빛 인생'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좋다. '선배'라 칭하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 속에 등장하는 카페 '장밋빛 인생'.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했던 화자인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이 카페는 조금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앉고 걷고 춤추고 가끔은 웃는 인형 '마리'가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폴라로이드 사진에는 찍히는 1인 밴드 '폴'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가득하기도 한 조금은 낯설고 이세계가 아닌 듯한
느낌의 공간. "다들 믿고 싶은 겁니다. 세상 어딘가에 장밋빛 인생이 있다는 걸 말이죠." 란 이야기를 해
주는 주인이 있는 카페 '장밋빛 인생'. 왜인지 이 세상에는 없는 듯 하지만 하나쯤은 존재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 이 소설에서 적어두고 싶은 구절을 발견해 적어 놓는다.
인생이란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후환들과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어떤 노래는, 그토록 단단한 시간의
벽에 균열을 만들어 우리를 다시 한 번 불안하고 서러운 그 시절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1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