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는 그곳에서 행복을 만납니다 - 추억.시간.의미.철학이 담긴 21개의 특별한 삶과 공간
홍상만.주우미.박산하 지음 / 꿈결 / 2015년 1월
평점 :



'행복'이라는 게 별 거 있을까.
책을 다 읽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왜 그 공간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걸까, 하고. 확실히 현실은 삭막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말을 하고 누구나가 소통하길 원하지만, 막상 소통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소통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스마트폰 속 세상에 의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다. 그런 것이 익숙해져서 현실의 누군가와 소통할때도 어색해하고, 눈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시대- 저자들은 사람을 보고 느끼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쩌면 그 삭막함을 날려버리고 조금이나마 행복을 전해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책에는 21개의 공간들이 나온다. 그 공간들이 무슨 마법을 부린다거나 휘황찬란하다거나 값비싸다거나 하는 곳들은 아니다. 오히려 품을 들이거나(공정여행사) 황당하거나(무인카페) 나눔을 실천하는(열린옷장) 곳들이다. 또한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허름한 누군가의 공방(가게)들도 등장한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발을 들이밀고 싶은 그런 곳들. 하나같이 소소하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추억. 시간. 의미. 철학이 담긴 공간들"이라는 책의 소개가 책을 처음 받아들 때보다 더 확 와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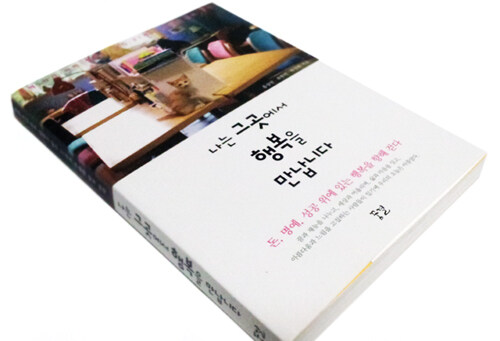
<열린옷장>은 TV에 출연한 적 있는 공간이어서 유독 눈길이 갔다. 자리잡고 있는 곳은 누군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만들어질 때부터 따뜻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에피소드들보다 유난히 눈에 더 들어왔다. 내가 직접 가서 무언가를 빌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 만으로도 충분히 있어야 마땅한 공간. 사실 면접 볼 때 꼭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딱히 입을 일이 없는 '정장'은 청년들에게는 계륵같은 존재가 아니던가. 이럴때 잠깐 빌려 입는 것은 저렴하고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쉽게 바꿔 말하자면 마치 이런거다.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세탁소 아저씨와 친분이 있는 주인공이 세탁 맡겨져 있는 옷을 잠시 주인몰래 빌려입었던 그런 것의 발전형. 재활용의 좋은 예. 집에 안 입는 정장들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 대학교 졸업할 때나 입학할 때 부모님께 선물로 받았거나, 혹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젠 내 몸에 맞지 않는다거나, 유행이 지나 촌스러워졌다거나 등등 각각의 사연을 담은 그 정장들이 <열린옷장>으로 들어와 새롭게 탈바꿈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두근거림 위로 하나의 두근거림을 더한다. 그 두근거림들을 늘 들을 수 있는 그 곳. 라디오도 아닌데 무수한 사연이 켜켜이 쌓이는 특이한 공간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숲반> 에피소드는 단연 내 마음을 빼앗아 간 원탑! 에피소드다.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숲반>은 국내 최초의 '숲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숲에서 생활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은 숲으로 '등교'한다. 굉장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아이들은 숲 속에서 생활한다. 울퉁불퉁 길을 걸으면서 평형감각을 익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유치원. 그저 숲에서 노는 것 뿐이고 커리큘럼은 없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음은 저자와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집중과 몰두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숲반의 원칙"이라는 말이 되게 낯설게 다가왔다. 아이니까 아이라서 간섭하고 대신 이야기해주는 요즘 교육방식과는 180도 다른 교육방식이다.
"오늘은 무엇이 되고 싶어요?"라는 교사의 질문에 "나무요!"라고 아이가 외치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가능하다. 자연과 같이 생활하고,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깨닫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며,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숲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배우는 곳.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로 생활하며, 조금만 눈을 돌리면 널리고 널린 것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 속에서, 어른들을 좌절로 만든 빈부를 만들어 내어 아이들 간의 괴리감을 만들어내는 현실과는 달리 숲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가지고 있는 흙을 나누며 함께 뛰어놀고, 할 일이 없는 친구에게 같이 할 일거리(?)를 주는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놀거리는 무궁무진하며 왕따는 상상할 수도 없다.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지저분해지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자연과 가까이에 있어 병치레도 끄떡없는 뜬뜬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내가 아이도 없으면서 오늘부터 참 탐내게 되는 유치원. 참 인상 깊으면서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이 책 속에 곳곳 묻어 있어 엄마미소를 짓게 만든 에피소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공간은 누군가가 있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있기에 그 공간이 빛날 수 있음이고, 그로 인해서 더 소중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인상적이지 않은 공간이 없다. 그 곳에서 풍기는 '사람냄새' 덕분이다. 너가 있고 내가 있어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 하는 소소한 행복이 존재하는 곳들. 누구를 만나도 좋고 그저 그 곳의 분위기를 즐겨도 좋다. 그냥, 지금 이대로만 여기 소개된 곳들이 유지되고 이런 비슷한 곳들이 하나씩 늘어나다보면 대한민국은 조금 더 사람냄새 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함께'의 가치 + '소통'의 즐거움 = 행복
오늘도 여전히 그곳에서 행복을 만나는 사람들이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