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 사람은 살지 - 교유서가 소설
김종광 지음 / 교유서가 / 2021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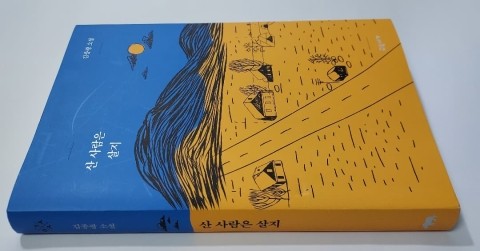
p.281.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닌데, 나도 하고 싶은 일, 꿈이 있던 젊음이
있었다. 늙고 병들고 망가진 모습, 나 자신도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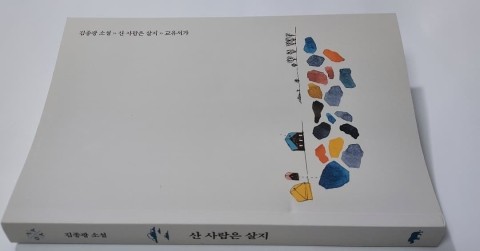
나이 들어
늙어가는 모습은 천양지차다. 누구나 맞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모두가 다르다. 하지만 모두가 늙고 죽는다는 것은 같다. 살아온
날들이 남은 날보다 적은 한 노인의 삶을 <산
사람은 살지>를 통해 엿보았다. 작가 김종광은 이 소설이 시골장편소설
시리즈 '면민
실록' 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의 배경은 시골 마을이다. 주인공은 70대 기분 할머니이다. 그런데
기분이 사는 마을 이름이 '안녕시
육경면 역경리' 이다. 역경. 우리 사회 노년들 특히 할머니들의 삶은 역경 그 자체였을 것이다. 기분 할머니도
힘겨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오늘을 산다.
p.7.
터 기(基) 가루 분(粉), 기분은 뜸하게 글을
썼다.
소설의 첫 문장이
알려주듯이 이야기는 기분의
기록으로 시작한다. 60 이 넘은 나이에 매일은 아니지만 일기처럼 일상을 담은 기분의 기록이 이야기의
큰 흐름이다. 또 다른 흐름은 기분의 꿈속에 찾아오는 남편, 시누이 그리고
동서들이다. 그들은 기분을 찾아와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하소연하며 기분은 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말한다. 꿈속에서 만나는 이들은 죽은 이들도 있고
살아있는 이들도 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살아오던 기분에게 큰 상심이 생긴다. 남편의 죽음. 살았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던 사람이었지만 옆에 있을 때 몰랐던 무언지 모를 감정들이 기분을 혼란스럽게 한다.
기분의 삶은
힘들고 또 고달팠다. 농사 일하고 손위 동서들 눈치 보고 엄한 남편 시중들며 그렇게 노년을 맞았다. 그런데 기분은 선천적으로 약했고 병을 달고
살았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다. 그래서 돈을 모을 여력도 없었고 그렇게 근근이 힘든 노동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효심이 남다른
삼남매가 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기분을 지켜주던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식들의 효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분이 늘 걱정하며 안쓰러워하는 자식 사랑이 더 큰 까닭에
자식들의 이야기는 부수적인 것이 된다. 남편에 대한 기분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기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겨있는 책이다.
언제부터인가 늙고
병든 노년의
삶은 요양원에서 끝을 맺는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도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하고 만다. 하지만 기분은
아직은 고향 집에 머물고 있다. 이야기의 말미에 기분은 남편의 산소를 찾아 큰 시누이의 부고를 알리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과 요양병원에
있는 동서뿐이라고 말한다. 지치고 병든 노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곧 우리에게도 닥쳐올 것이다. 어린아이를 돌보던 어머니를
아이가 컸다고 서로 모시지 않게다고 서로 등 떠미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슬펐다. 아팠다.
가난 때문에 교육
기회를 잃어버리고 먹고살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의 노년이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여관방을 전전하는 노년의 이야기는 처절하기까지 하다. 기분의 기록과 꿈을 통해 만나본 노년의 삶은 쓸쓸하고 힘겹다. 또 고단하다. 이제는 조금
덜하지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안타깝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조금 더 부모님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p.332. 살 것이다. 힘껏 살 것이다.
안타깝고 가슴
시린 이야기는 마지막 문장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준다. 누구보다 힘겨운, 고달픈, 아픈 삶을 살아온 70대의 기분 할머니도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삶을 조금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다. 삶을, 어른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다.
"교유서가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