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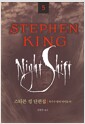
-
스티븐 킹 단편집 ㅣ 스티븐 킹 걸작선 5
스티븐 킹 지음, 김현우 옮김 / 황금가지 / 2003년 11월
평점 :



이제 와서 스티븐 킹에 입문하자니 적잖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한 장르의 대가라 불리는 사람인데, 고작 용기를 내서 읽었다가 재미없으면 나만 찌질이 취급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제가 무모하게 가운데 손가락 치켜들기를 좋아하는 인간이라 해도, 이런 종류의 공포와는 평생 친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장르 소설을 읽는 데 뭐 그리 힘들 게 있다고 이렇게 엄살까지 떨어야 하는지. 어차피 한 번 신나게 놀아보자고 쓴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장르물이든, <율리시즈>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든, 여하튼 '거장 XX의 작품'이라고 하면 한 번쯤 스쳐지나갈 법한 공포라고 봐요. 요는, '한 작가가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받고 있으며, 그 작가를 씹는 게 얼마나 몰지각한 행위로 비춰질 것인가'입니다. 확실히 이런 기준이라면 스티븐 킹도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담이 센 분들은 예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흠, 은근히 부러운데요?
한 작가를 알아가는 데도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데뷔작, 대표작, 아니면 단편집. 뭐, 이런 접근법쯤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시각을 먼저 취하든, 스티븐 킹은 상당히 괜찮은 솜씨를 보여 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생생하게 그려지는 대사와 배경묘사는 최고예요. 얼핏 약간 무질서하고 무심하게 느껴지는 문장이지만, 현장감 넘치는 리얼함 덕분에 스티븐 킹의 소설이 왜 이토록 빈번하게 영화화되는지, 그 이유도 쉽사리 납득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전 <캐리>도, <톰 고든을 사랑한 소녀>도, 또 <스티븐 킹 단편집>도 흥미진진하게 읽었으니까요(물론 "<톰 고든을 사랑한 소녀>가 대표작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모르겠습니다"지만요;).
횡설수설 쓸데없는 소리가 조금 길었지만, <스티븐 킹 단편집>은 소위 거장의 초기 단편집이라 보기에는 전반적인 완성도가 월등히 높아요. 보통 이런 건 책값이나 두둑하게 챙기려고 작품의 질은 차치하고 페이지수만 잔뜩 늘여놓는 경우가 태반인데 말이죠. 사실 18편 중 6편 내외로만 건져도 성공적인 독서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마음에 안 드는 소설을 헤아리는 게 훨씬 더 빠르더군요. 저는 '밤의 파도'와 '나는 통로이다'만 빼고 다 웬만큼 좋았습니다.
개중에서 '예루살렘 롯', '맹글러', '옥수수 밭의 아이들', '사다리의 마지막 단'은 특히나 훌륭했어요. <스티븐 킹 단편집> 본문에 앞서 모 호러 소설가가 '사다리의 마지막 단'을 최고의 소설로 꼽았던데, 후후, 이거, 굉장하신 로맨티스트?(저 스스로도 좋다고 했으니 물론 비꼬는 건 아니에요) '맹글러'는 과연 B급 상상력 냄새가 풀풀나서 그런지, 꽤 거칠지만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롯'과 '옥수수 밭의 아이들'은 작풍으로 본다면 같이 묶어버리긴 힘들지만, 종교적 광기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 아주 틀린 분류는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 롯'에서는 고딕 소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옥수수 밭의 아이들'은 여러 모로 다분히 현대적인 감성으로 무장됐지만, 둘 다 무섭긴 정말 무서웠어요(이딴 걸 공통점이라고 묶다니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