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스토예프스키의 돌
문영심 지음 / 가즈토이(God'sToy) / 2010년 10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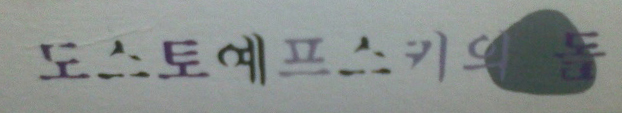
도스토예프스키.
학창시절,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이름. 도당최 입에 붙지 않는 단어의 섞임이라고 생각했던 이름.
그러다 막상 입에 붙으니 뭔가 있어보였던 이름이었다. 문학에 박식한 사람이나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해서였으리라.
유명한 작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소설도 읽지 않던 내가 유일하게 잠깐 맛 본 '죄와 벌'
괜스레 두꺼운 책이라 마음이 이끌렸고, 나의 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빌려놓고 잠깐씩 봤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고 사려고 하니, 그 때 보던 그 책의 표지조차 가물가물하고, 출판사도 모르겠다.
그 당시,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이야기였지만 강렬했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세계문학을 읽는다면 반드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먼저 읽겠다고 생각하던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나보다.
다른 것은 다 변했는데, 그 취향 하나 남아있음이 새삼스레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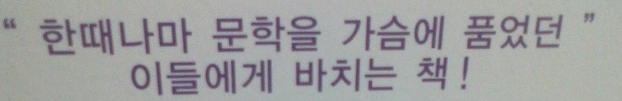
지금에서야 문학소녀가 되고 싶은 나를 심장 두근거리게 만드는 소설. 이 소설이 두번째이다.
첫번째는 신경숙 작가님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줄여서 어.나.벨)'
어나벨을 보고서 문학을 품고 싶어졌고, 한국문학을 다시 나의 청춘소설로 삼고 싶어졌었다.
그 느낌 고스란히 이 소설이 나에게로 와 문학을 안겨주었다.

처음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돌로 인해 무언가 큰 헤프닝이 일어나주길 바랐다. 아니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매혹적인 느낌과 무조건적으로 그의 책을 읽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저 이 소설이 쓰여지게 되는 계기가 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바라던 내용과 다르다 할지라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감옥에서 작가의 손으로 옮겨지게 된 돌의 효력(?)은 어떤 글을 쓰게 할지, 궁금해졌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유형생활을 했던 옴스크 감옥에 있던 그 돌은 문학지망생이라면 누구나 탐낼 정도의 기념품이라고 한다. 그 돌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룬다고 하여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 나에게도 그 돌이 있다면 쓰고 싶어 미치는 욕구가 마구마구 끌어올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열정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렇게 쓰여진 글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글이 써진다는 이유하나로 만족할 것 같다. 이따금씩 예전보다는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짧은 감상을 남기면서 글이라는 것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상문에 불과하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풀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글이 써지지도 않는다. 그러기에 글쓰기 어려움을 늘 마주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그 돌이 나에게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더 다른 색의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랄까. 노력을 하기는 커녕, 거저 얻으려고 하는 속셈이긴 하다. ;;
이 책 안에서는 정신이 없었다. 분명 잘 읽힌다. 얼마전, 정말 잘 읽히는 소설을 읽고 실망한 적이 있어 잘 읽힘에 반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들이 작품을 쓰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있는 사랑, 우정, 청춘을 그 당시에 즐겨 읽던 문학작품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공유하고. 어쩌면 내가 원하던 대학 캠퍼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반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언제 그랬냐는듯 푸욱 빠져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소설이 존재하고, 그 이야기 밖에도 소설이 존재한다. 벗겨도 벗겨도 혹은 다듬어졌다가도 조금씩 뭉뚱그려지는 소설이 마구마구 풀어져있다. 양파같은 소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한다.
어떤 것이 현재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소설과 소설 속을 오가며 다양한 이야기에 흠뻑 취했다. 괜히 문학을 가슴에 품었던 이들에게 바친다고 했겠는가 싶다. 어나벨 같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나벨 또한 문학이 소설속에 존재하기에- 그들의 청춘이 싱그러웠고, 글을 창작하고자 하는 그들의 고뇌가 아름다웠고 부러웠다. 이 책을 손에 든 순간부터, 덮을 때까지 내내 흥미로웠다. 이런 소설. 가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칫, 그녀가 살아가며 썼던 소설이 소외된 사람들을 소재로 쓰여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느낌의 연민이 살아있기에 비슷한 느낌일 수는 있으나 같지는 않았다. 방송작가로서 써야하는 글과 창작하는 소설을 쓰는 작가의 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고뇌도 함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시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내가 과연 해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 읽고 느낄 수는 있으나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여전히 나의 글. 나의 색채가 뚜렷한 글을 한번쯤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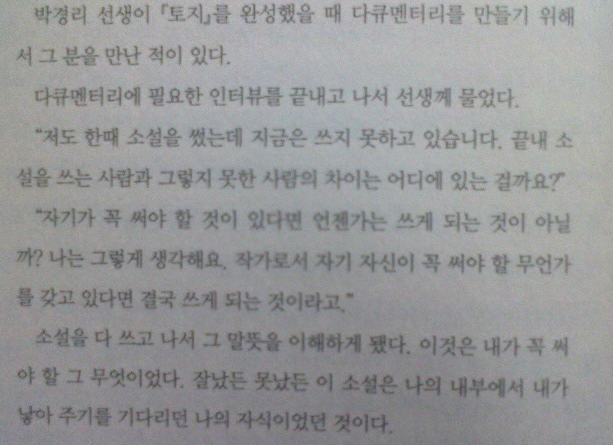
<작가의 말>에 쓰여있는 글귀들이다. "자기가 꼭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말이 몇번이나 소용돌이치고 내 가슴에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내가 꼭 쓰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가? 우선은 그것부터 찾아야 될 터였다. 그리고 쓰면 되는거다. 작가의 말처럼 잘났든 못났든 (...) 나의 자식 이니까 말이다. 한번 사는 삶인만큼, 나의 색을 마음껏 나의 도화지 위에 뿌려놓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이 소설에 감사드린다. 함께 했던 문학소녀들과의 시간들은 나에게 두근거림이었고, 문학을 더욱 받아들이게 해주는 값진 시간이었다.
문영심 작가님의 글을 처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빠져듦에 깜짝 놀랐다. 다음에도 또 이런 소설을 읽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