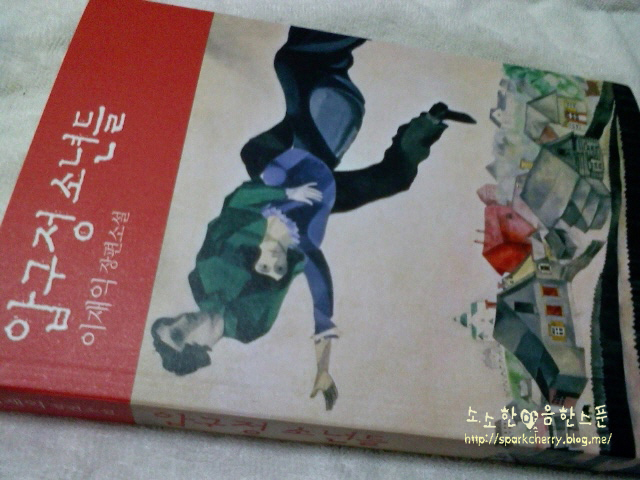
'카시오페아 공주'로 평이 꽤 괜찮았던 작가이기에 앞, 뒤 잴 것 없이 무한 기대와 관심을 가졌었다. 사실 제목이 좀 촌스러워 살짝 고민은 했었지만 너도 나도 읽고 싶어하는 분위기에 나 또한 휩쓸렸다. 카시오페아 공주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이 내 기대에 조금만 부응을 해준다면이야 카시오페아 공주 이외에도 읽어주겠노라고 눈을 번뜩이며 이 책을 집어들었더랬다.
별 많은 밤하늘에 신비로운 초승달이 머물고 열여덟 살 소년이 사랑의 감정과 질투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순간, 깊은 어둠과 희뿌연 빛 속에서 소년의 인생은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다. 항로가 바뀐 배는 변경된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도 항해 중이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먼 훗날에 알게 되겠지. - 62쪽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장소설의 느낌. 어디로 가야할지 결정의 기로에 서서 그 어디쯤은 꼭 헤매야 하는 시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머무를 수 없이 끊임없이 방황해야만 하는 우리네 인생을 조금 맛보았다고나 할까. 함께 회상하기에 좋은 구절이었다.
"록은 죽었어. 마찬가지로, 우린 더 이상 소년이 아니야. 끝내야 할 때 못 끝내면 인생이라는 기차가 멈춰버리는 거야." - 106쪽
민감한 시기. 함께 했던 그들의 음악을 이제 더 이상은 끌고 갈 수 없음에 대한 현실과 꿈사이의 갈등. 록은 그들에게 있어 그들 삶의 일부이지만 부유하고 윤택한 생활을 타고났다하더라도 그들의 앞에 입시라는 벽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기에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겨두어야만 하는,
"결핍은 타인이 채워줄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 뿐이지." - 214쪽
실제로는 사랑만이 전부라고 믿어버릴 수 있었던 어린 시절. 하지만 사회에 조금씩 물들어 가면서 다른 것들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 마냥 예전을 회상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속물이 되어가는 내가 싫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의 부딪침. 또 그것에서 뿜어져나오는 상실감. 또 다시 고독.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들리니? 소리가 너무 크면 들리지 않아. 슬픔도 마찬가지야. 슬픔이 너무 크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 327쪽
마냥 행복해 보이는 것들도 속은 빈 강정일 경우가 많다. 화려해보여도 그 속엔 쉽게 채울 수 없는 따뜻함과 진심어린 애정. 나 힘들다. 하고 소리치고 싶어도 주변에는 들리지 않고 메아리가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요즘은, 슬픔을 공유하려고 해도 진정으로 슬픔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없다. 다 제 속에 모르는 벽을 일정하게 내려놓고 있어 진심이 가더라도 부딪쳐 다시 왔던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공허하게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며, 진심이 무엇인지,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겨를도 없이 혼자 판단해버리고 상황은 종료된다. 저 글귀를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고독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감싸줄 수 없었다. 그대로 치유되기를, 그냥 내버려두기를 바라는 외침같아서..
조금은 민감한 소재. 연예인. 엔터테인먼트를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머, 음악계의 실상 등이 빠질 수는 없겠지. 익히 알고 있는 루머라 하더라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많아 읽는 내내 인터넷 마녀사냥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언급한 연예인의 이름. 혹은 다른 이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지 확연히 알만큼의 알려진 내용들. 이것을 소설화 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궁금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쓰였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너무 많았고, 이것이 소설의 소재로 적절한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그리고 불쾌했다. 이 책속에서 또 한 번 그들의 상처를 후벼판 것 같아서, 실제 주인공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 등의 걱정스러움. '작가의 글'에 언급된 것 처럼 소설과 실제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써놓고 있지만 겹쳐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가봐도 알만한 내용들이 실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런 루머들이 바탕이 되어 음모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 잡다한 요소가 너무 많다. 아무래도 이 책안에 원하는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는 욕심이 불러온 화가 아닐까 싶다. 스릴러와 청춘, 사랑이야기, 신파까지 모두 집어 넣으려고 하니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감이 오질 않는다. 잘 읽힌다는 것 외에, 록에 대해 잘 모르기에 오는 거리감, 이것저것 뒤섞여버린 이야기. 쉽게 예측되는 결말. (결말 또한 어떤 영화와 흡사하다. 언급은 하지 않겠다.) 하나씩 하고 싶은 글들을 썼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분명, 글에 공기는 있다. 하지만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저 살아야 하기에 쉬는 숨일 뿐, 달콤하거나 아련하거나 하는 소설 특유의 공기내음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