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빈 잔의 시놉시스
이석규 지음 / 해드림출판사 / 2014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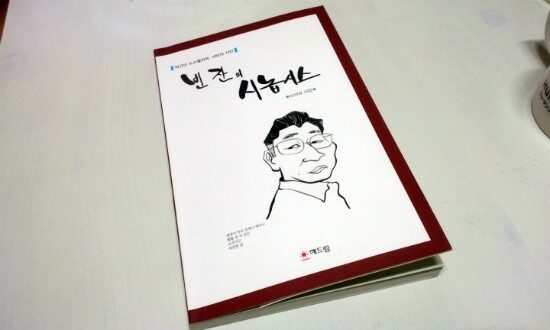
시집을 대할 때면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쓰여진 책을 앞에 놓은 것 마냥 어렵다.
나에게 시의 이미지는 학창시절 국어책에 나오던 시를 해부하듯 갈기갈기 찟어
한마디 한마디 한줄 한줄을 해석하던 국어 시간이 먼저 떠오른다.
마치 토막낸 생선구이를 잔가시 하나 허용치 않고 발라내는 집요함이랄까..
그렇게 속절없이 접시위에 오롯이 발려진 허망한 살점들은
물끄러미 보고 있으며 이게 어떤 생선이였는 조차 가물거린다.
나는 시가 토막난 생선구이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국어 수업시간에 해체되고 해부되어진 시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런 시를 대할때의 당혹감이란 감수성 많은 그때의
나에게 참 당혹스러운 일이였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내가 시를 어렵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
나는 내가 들어서 좋은 곡이 명곡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먹어서 좋은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영화가 명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읽어서 내 마음을 울리는 시가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석규 시인의 '빈잔의 시놉시스'는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진짜 시다.
시인의 가슴을 태워서 만든 시다.
시를 쓰는 시인의 고뇌가 보인다.
그래,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아침으로 가는
파도를 타고
지금 막 생각난 詩의 한 구절을
질걸질겅 씹습니다.
그 구절 앞세워 섬에 갑니다.
날마다 詩 한 줄 쓰려고
그가 부재인 섬을 바라보며
난 빈 배를 탑니다.
파도치는 뱃머리 아직 견딜만 합니다.
< 바다에서 中>
시 한구절 질겅질겅 씹어 단맛, 쓴맛, 신맛까지 마지막 맛까지 알아보기 위해
입안에서 씹고 또 씹는다는 그 구절이 나에게 와서 박혔다.
시인은 머리속에서 또 가슴속에서 그 시 한구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둥글렸다 늘렸다 붙였다 뗐다 온갖 짓을 다 했을 것이다.
녹녹치 않는 시를 짓는 작업을 매일 매일 고행하듯 해내고 있을 시인의 작업이
고단해 보이지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대장장이의 쇠망치 처럼 그의 시도 매일매일 담금질에 단단하고 반짝이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시를 좋아하는 나로써는
처음 그의 시를 대했을때는 조금 거친듯한 느낌을 받았다.
휘리릭 읽고 쉽게 넘어가는 시가 아니라는 것을 시집 몇장을 넘기면서
알게 되었고 질겅질겅 씹어보며 맛을 볼려고 했다.
그러자 그의 시들에서 온갖 맛들과 냄새가 나오기 시작했다.
달큰하기도 하고 짭짤하기고 하고 비릿한 바다냄새가 났다가 시큼한 땀냄새도 났다.
한편 한편 시를 나 나름대로 음미하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한 사내는 아구찜 집을 열심히 찾아가다가 복국집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쉬지 않고 아구찜 집으로 내달아 가오
마, 전어 축제할 때 한 번 더 오이소 그러면어쩌다가 멀어진 그대
국화꽃 꽃마울에 냉틈 올라타고 내게로 막 내달아 가오
<마산 어시장 中>
이것저것 다 마땅치 않아
무작정 걷다보니
벚꽃이 그대 같고
나는 나무 같아서
그댈 올려보느데
바람이 세게 불고
벚꽃이 떨어지고
술이 고프고
달이 떠올랐다
<진해 벚꽃 장 中>
세상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기는 얼마나 당당한 일인가
이윽고 밤이 와 하늘에 멍석을 깔면
멍석의 세포마다 별이 박혀 반짝이고
닻이 풀닌 나의 배는
멀리 와서 그리워할 것을 그리워하느니.
<등대 中>
제목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의 고향은 마산이다.
마산에서 자랐고 대학을 서울로 오기까지 푸른 바다를 원없이 보고 자랐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지내게 된 서울생활은 즐거움과 버거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였다.
해질녁 한꺼번에 외로움이 몰려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때
문득 바다 냄새가 미치도록 그리워 버스를 타고 영동대교를 몇번이나 건너다녔는지 모른다.
퍼석거리던 내 마음이 강에서 뿜어내는 축축한 습기로 노골노골 해질때까지..
나에게 바다는 고향이고 그리움이다.
나는 시인의 시에서 잠시 잊고 지내던 그리움의 맛을 보았다.
거친듯 정겨운 경상도 사투리와 비릿한 바다 내음.
혀가 호강하는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회 한점을 먹을 수 있는 마산 어시장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봄이면 온 사방이 온통 분홍빛이였던 진해 벚꽃장
어릴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진해 군항제에서의 사람들의 웅성거림와
아빠 엄마와 함께 먹던 짜장면의 그 놀라운 맛과
가슴이 짜릿하도록 아름다웠던 분홍 벚꽃..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턱 막혔다.
나는 내가 공감 할 수 있는 시를 그의 시집에서 찾았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가 나에겐 진짜 시다.
어렵게만 느꼈던 시가 시인을 통해 조금은 야들하게 느껴졌으니
나에겐 가장 소중한 시집이 되었다.
두고 두고 조금씩 그의 시를 음미하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