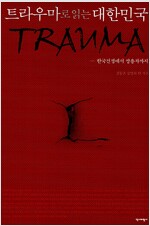올 한 해 꽤 많은 책들을 사들였다. 물론 개인적인 기준일테지만..주문내역서를 보니 다섯개의 주문을 한 페이지로 봤을 때, 스무페이지가 넘어간다. 내게로 온것만..기프티북이나 친구에게 선물로 보내준 보따리들은 다 제외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택배씨와 카톡에서 친구먹고 있을만큼 가까워진 까닭도 이때문일것이다. 일주일에 두세번은 마주보았으니까..
허전해서 그랬을거다.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아프고 아파서..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넘어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만큼 물기를 빼앗긴 몸뚱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그랬을거다.
책으로라도 무너지는 균형을 잡아보려고, 기울어진 그곳에 받침처럼 끼워넣고 싶었던 것이다.
도서정가제..이후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시작된 책 사들이기..그래 명품 백이며 화장품이며 옷가지를 사들여 낭창하게 지내는 것보다야 낫지..라는 이젠 낡아빠질대로 낡아빠진 변명을 여전히 해대면서 말이다.

억울한 죽음들 앞에서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고대로 하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여북했을까...'결국 같은 말을 두번이나 다르게 표현함으로 정말 답답한 지경을 표현하셨던것일거다. 그래..며칠 전 우리는 이전투구, 혹은 궁중암투같은 요상한 일을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밀리던 사람 하나가 그렇게 떠났다. 21세기를 살면서 십상시라니..
자존의 철학이라고 한다. '반자살론'이라고..
뭔가 살아야할 당위를 찾고 싶어진다. 그렇다고 죽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살되..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다.


후마니타스의 신간이 나왔다고 했다. '자백' 그것도 '허위자백'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백'은 엄청난 구속력을 갖는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많은 사건들이, 특히나 사상의 문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문제들이 급히 종결되어질 때, '자백'은 유용하게 쓰인다. 그 자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우리는 자백이라는 말보다 '실토'라는 말에 더 익숙하다.
어찌할 수 없이 뱉어버리는 사실..혹은 진실..
중요한 건 "어찌할 수 없"던 그 상황이다. 그 상황이 인권이 존중되고 합목적적이었으며, 합리적이고 , 억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가를 묻게 된다.
강요된 자백은 아닐까?
생각이 많아진다. 연말이라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떠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지..



별 연관성은 없는 조합이지만..요즘들어 부쩍 눈에 밟힌다.
그쪽은 어때요? 괜찮은가요?
괜히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사실은..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건지도 모른다.
유난히 추운 날..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저들을 또 잃을까 두려워서 말이다.
쌍용자동차..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내야할텐데..저 시린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어야 할텐데..저 떨리는 입술을 멈추게 해야할텐데..
어쩌면 더는 갈데가 없는 건..저들이나 이 나라나 마찬가지일것 같다.
미안함이..허전함이..안타까움과 분노가..자꾸 빈 가슴을 만들고 나는 자꾸 사들인다.
내년에도 이러면 어떻게 하지? 쫓겨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