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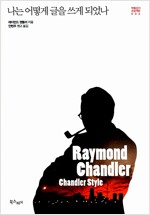
마치 원죄를 품고 태어난다는 끔찍한 신탁처럼..혹은 그 원죄의 일부분으로 글쓰기의 욕구가 들어있는건 아닌가 싶은 의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처음 글을 배우고, 글쓰기를 하나의 기술처럼 바르게 쓰는데에만 연연하던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을 끄적거리기 시작하는 건, 아마도 사춘기 즈음이 아닐까 싶다. 물론, 타고난 재능을 어찌할 수 없어 아주 어린나이에도 글을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다. 그 사유의 깊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곧 그 멋진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치기에 휩싸이는 건 당연한 귀결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끄적인 것들은 하나의 글로 종결하지 못하고 낡은 공책의 한 공간에서 누렇게 시간을 먹으며 버티고 있거나 혹은 까맣게 잊혀진 채 승은을 바라는 궁녀처럼 내 시선을 갈구하고 있을 뿐이다.
몇권의 책을 읽음으로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신이 잘 쓰지 못할거란걸 인정하게 되는 길일지도 모른다. 인정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나면? 글을 쓸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기교따위, 거창한 문장력따위 필요하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로 써내는 글.
글을 쓴다는 건, 단순히 문자를 적어내리는 행위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글을 쓰는 펜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책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시간..무모했던 그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듯, 나 역시 혼자 끄적이던 노트가 있었다.
그런 노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