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을 한권 지인에게 선물하고 복수(?)당하는 차원에서 선물받은 시집이다.
한때는 문학동네 시인선을 따박따박 찾아 읽으며 책장 한줄이 색동저고리처럼 알록달록해 지는 것이 예쁘고 좋았었다.
표절이니 문학권력이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동의 책을 더는 읽지 않았다.
책장은 한쪽 팔만 있는 색동저고리의 꼴로 거기서 멈췄다.
선물받은 시집을 넘겨보며 이렇게 타협하는건가?
자신에게 몇번을 묻고 대답을 미룬다.
이은규.
봄과 꽃과 달력과 겨울. 그리고 짧은 여름과 가을.
몇개의 기대어 쓴 시들.
투명한 봄날의 눈부심 같은 시집이라고 생각했다.
전작이었을 ‘다정한 호칭‘을 필사하거나 인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이 시집도 그렇지 않을까?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지만 아는 맛인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다.
나타샤를 만난건 뜻밖의 반가움이었고..
다음 시집에선 조금은 날카롭게 벼려진 표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몇몇 지점에서 발견한다.
문동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찾아 읽고 싶은 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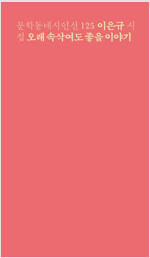
- 오는 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중력이었다.
사과한알이 떨어졌다. 지구는부서질 정도로 아팠다.최후.이미여하한정신도발아하지 아니한다. *
가도 가도
봄이 계속 돌아왔다.
(*이상의 시 ‘최후‘에서)
모든 꽃은
안 들리는 한 점 향기를
수없이 두드린 봄의 노동
대장장이가 쇠처럼 무른 것은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노래한다, 꽃잎처럼 단단한 것도 없음을
오늘의 노동을 다하지 못한 시인에게
세상이 바뀔 거라는 소식 대신 날아든 소식
문득 도착한 곳
아직 들리지 않는 향기, 꽃이 없다.
(꽃소식입니까. 중에서)
눈은 푹푹 내리고 시인은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오지 않을 리 없다 .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고조곤히
눈 내리는 마을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 버리지 못하는
고요한 세계, 시인이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 응앙응앙 울 것
눈 내리는 마을 스노볼이 놓여 있다.
책장 한편
(스노볼* 중에서
*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기대어 쓰다)
모든 봄은 지난봄을 간직한 채 피어오르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마라
경고에 가깝거나
안내보다 먼 문장들에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지난 사건을 발견하며
그 사건으로부터 뒤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봄꽃을 줄게, 꽃봄을 다오
저만치 기억이 오고 있다 선언하는 사이
(봄이 달력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