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스 인 더블린 -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의 도시, 더블린. ㅣ Fantasy Series 2
곽민지 지음 / 브레인스토어 / 2014년 5월
평점 :

절판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정말 좋아했던 교수님께서 <원스>라는 영화를 한 편 수업 중에 보여주셨다. 전공 수업과 전혀 관계없던 그 영화를 왜 보여주시나 싶기도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 뭔가 의미가 있겠지 싶어 보았지만, 영화가 중반을 향해 가면서 교수님이 자리를 비우면서 이내 곧 강의실은 시끄러워졌고, 다들 그 영화에 집중하지 못한 채 떠드느라 정해진 수업 시간을 모두 흘려보냈던 기억이 난다. 영화가 워낙 잔잔했고, 감성적이었던 탓에 다들 집중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인가 그 주말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계기로 밤잠을 설치던 밤에 혼자 그 영화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고, 학교에서 볼 때는 느끼지 못 했던 그 영화 속에 담겨있던 주옥같던 노래에 빠져 날밤을 꼬박 세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굉장히 빠져, 하고 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배경음악으로 이 영화 OST로 도배를 하고, 다이어리에 주저리주저리 글을 남기며 친구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라고 추천도 하면서 한동안 <원사>앓이를 했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그동안 몰랐다. 그저 노래가 좋아 이 영화에 빠져있던 나에게 솔직히 외국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었을 뿐 그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원스>는 나에게 명곡들이 많았던 영화로만 기억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더블린'이라는 정말 처음 듣는 낯선 도시에 누군가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 에세이를 냈다고 하여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더블린'이 한동안 내가 앓았던 <원스>의 무대가 되었던 그 도시라는 사실을 이번에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뭔가 조용하고 잔잔했던, 그러면서도 약간은 안개가 끼인 듯 뿌연 풍경을 간직하고 있던 그곳이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사실을.
<원스 인 더블린>을 쓴 저자는 여행 전문가가 아닌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던 어느 20대 청춘 중 한 명이었다. 이름있는 대기업에 취직해 나름 평탄하고 탄탄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무료함을 느끼고, 행복을 찾아 사표를 던진 채 멀리 '더블린'이라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선 도시로 훌쩍 떠난다. 그녀가 그 먼 곳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을 향한 기대, 시선, 그리고 고층 빌딩이 없는 곳에서 몇 달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녀에게도 지금 나에게 분 청춘의 성장통이 당시 그녀를 찾아왔던 것 같다. 어쨌든 그녀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머나먼 더블린까지 혼자 찾아간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블린이라는 도시에 빠져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블린 사람들의 특유의 여유로움을 접하면서 그동안 치열하게 사느라 지쳐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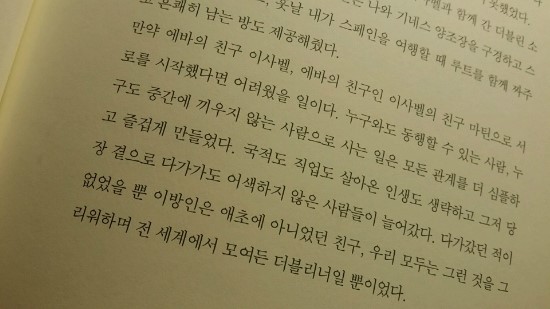
이 에세이집은 한국을 떠나 더블린까지 가게 되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전하고 있다. 어떤 경로로 집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행기 티켓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지 등등 실제로 더블린에 간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녀가 처음에 더블린에 갔을 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열쇠로 문 열기와 버스 타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지냈던 부분들이라 더욱 유용하게 느껴졌다.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그곳 문들로 인해 애를 먹었던 이야기나 뭐든 자동으로 되는 한국과 달리 더블린의 버스는 차비도 탑승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야하고, 방송도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자신이 내려야 하는 곳에 내려야 하며 탑승시에도 택시를 잡든 엄지를 세워 버스를 세워야 했었다는 사실들은 정말 생소하면서도 모르고 겪었다면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 더블린에 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블리너, 더블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어 더블리너들에 대한 호감도 생기기도 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더블린으로 간 그녀였기 때문에 솔직히 더블린의 많은 관광명소라든가 맛집 소개 따위는 없었다. 자신이 자주 갔던 맥주집 소개와 몇 개 안되는 음식점 소개도 있기는 했지만, 관광 가이드용이다 싶을 정도로의 소개는 없었다. 대신 자신이 더블린에서 더블리너로 생활하면서 접했던 생활 속 이야기를 그저 더블린처럼 잔잔하니 평범하듯 읊고 있다. 그래서 이 에세이집이 난 좋았던 것 같다. 손님이 아닌 더블리너가 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가.
더블린의 무엇이 좋으냐고 묻던 더블린에서 만난 친구의 물음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좋았다던 그녀의 대답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 많이 기억에 남는다. 그녀에게 정말 휴식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 그 휴식 장소로 더블린은 정말 최고의 휴양지였고 말이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녀의 말에서 그녀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블린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그곳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짐작케 했다.
이방인에게 한없이 친절했던 택시 기사 아저씨들과 누구누구의 친구라는 개념 없이 형성되던 더블리너들의 사교성이 나 역시 직접 보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더블린".
영화 <원스>처럼 잔잔하고 여유로운 '더블린'이 참 수수한 도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사람과 자유로운 음악과 풍경이 있는 곳. 이번에는 그 더블린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원스>를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