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에 대한 인간의 예의 -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소영 지음 / 뜨인돌 / 2020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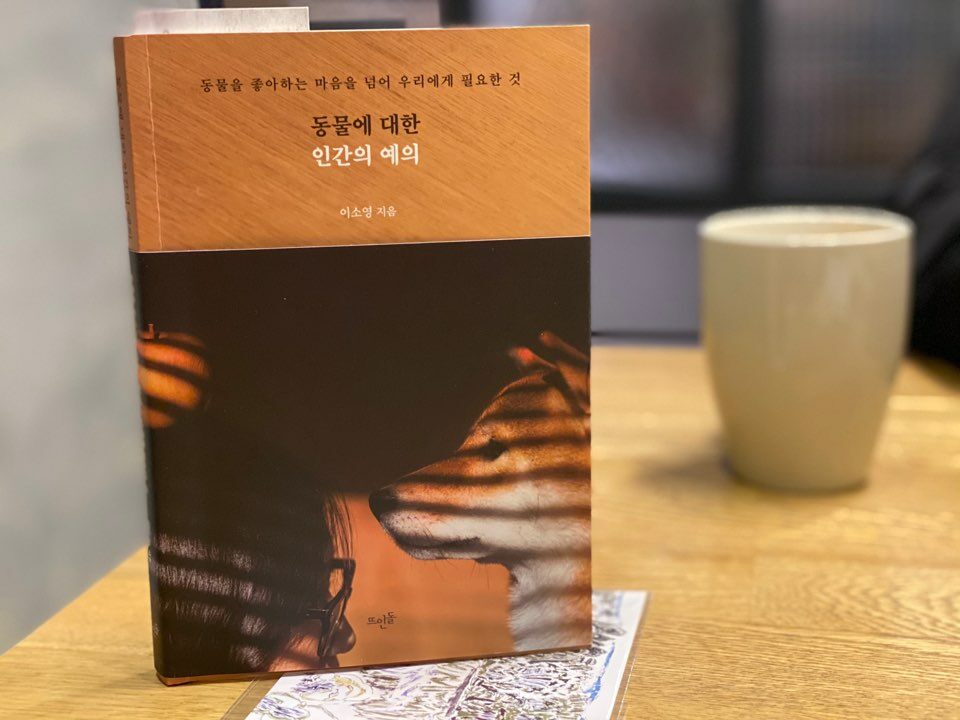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꼭 읽고 싶었다. 예전에는 네 발달린 짐승은 무섭고 징그러워서 가까이도 안갔었는데 고양이 집사가 얼떨결에 되면서 동물 애호가가 된 나이기 때문에 이런 책은 관심이 많이 갔다. 동물보호 단체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을 쓴 것 같아서 더 읽고 싶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동물을 학대하는 충격적인 실태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사람들의 혐오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도 아직 발담그고 서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건가.
이 에세이는 저자의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애니멀 호더에게 갇혀있는 몇 마리의 고양이나 강아지들, 아니면 식용 개들을 구조하는 작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식당의 좁은 수조에 갇혀서 남의 눈요기가 되고 있는 악어, 서랍 속에 갇혀있는 뱀, 동물원에서 쇼를 하는 원숭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가는 그렇게 고백한다. '뱀 따위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고 싶었다고. 원숭이나 개, 고양이 같은 포유류에게 우리 인간은 거울뉴런을 작동시켜 지극한 애정과 긍휼을 발동하지만, 뱀이나 개구리 같은 상대적으로 징그럽게 느껴지는 동물에 대해서는 별로 불쌍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저자에게 마음이 확갔다. 이런 성향을 종차별주의자라고 한다. 나도 그런적 많은데!!
사람들은 동물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관해 스키마를 갖고 있다.
우리가 특정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사냥할지, 도망칠지, 박멸할지, 사랑할지, 먹을지' 가 결정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으로 분류한다. p.37
-멜라니 조이[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중에서
어떤 동물인가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자. 생각해보면 나도 동물에 대해 나름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정말이지 내가 마음이 가는 동물만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 혐오스러운 외관을 가진 - 동물들의 안전이나 종 보전은 그저 되면 좋고 안되면 말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육식을 중지해야하는 것은 알지만 끊지 못했으며, 그것의 원래 생김새나 어떻게 죽는지의 과정은 알고 싶지가 않다. 언제나 마트에서 다 포장된 깔끔한 것을 사다가 구워서 먹은 후에야 만족을 경험하면서 학대받는 동물군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는 모순과 위선이 다시 한 번 생각났다.
그렇다면 나같은 사람은 동물을 생각하면 안되는가. 지금 당장 비건이 되기 전까지 이런 책도 읽으면 안되는가.
저자는 지금 당장 오리털 점퍼를 다 갖다 버리고, 바로 채소만 먹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번이라도 육식을 제외한 식사를 차려보라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캣맘, 캣대디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있다. 일각에서는 동물 보호 차원인데 이해해 줘야 한다고 하지만 내 집 베란다 바로 밑이 길고양이 밥상이라면 고양이를 원래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스트레스일 수 밖에 없다. 좋아하는 것을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혐오의 방망이를 흔들어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싫은 것을 싫다고 말했다고 악랄하다고 호도당할 필요는 없다.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도 본인이 옳은 일을 한다는 것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
개가 짖는 게 싫다고 그 개의 성대를 수술하자고 하지말고 개가 짖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원 한켠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내가 낸 세금' 운운할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시각을 조금만 더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견주들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대신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상생하는 사회 아닌가. 저자는 그런 목소리를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전개하고 있다. 참 마음에 드는 책이다.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몇몇 개인의 '좋은 마음' 으로만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할수록 그 질문을 시민단체나 개인이 아닌
정부나 국회에 던져야 한다.
개인들이 서로의 한계를 탓하는 것으로 달라질 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p.180
이 책을 읽고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나도 동물 구조는 119에서 해도 유기견 구조나 동물 학대의 문제는 동물보호연대에서 해결 하는 줄 알았다. 안타깝게도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동물보호연대에 전화해서 업무태만을 운운하거나 뜻모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의 무례를 저자는 지적한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질게 아니라 정책도 잘 알아두어야겠다. 그리고 제발 아무 지자체나 전화해서 적은 분노를 아무렇지않게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거리를 많이 던지는 책이다. 독서모임에서 다뤄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