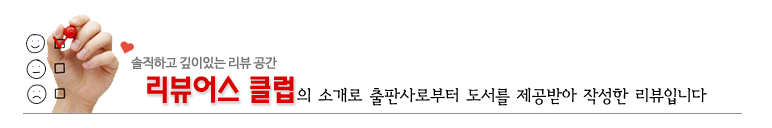-

-
빅 픽쳐 - 양자와 시공간, 생명의 기원까지 모든 것의 우주적 의미에 관하여, 장하석 교수 추천 과학책
션 캐럴 지음, 최가영 옮김 / 글루온 / 2019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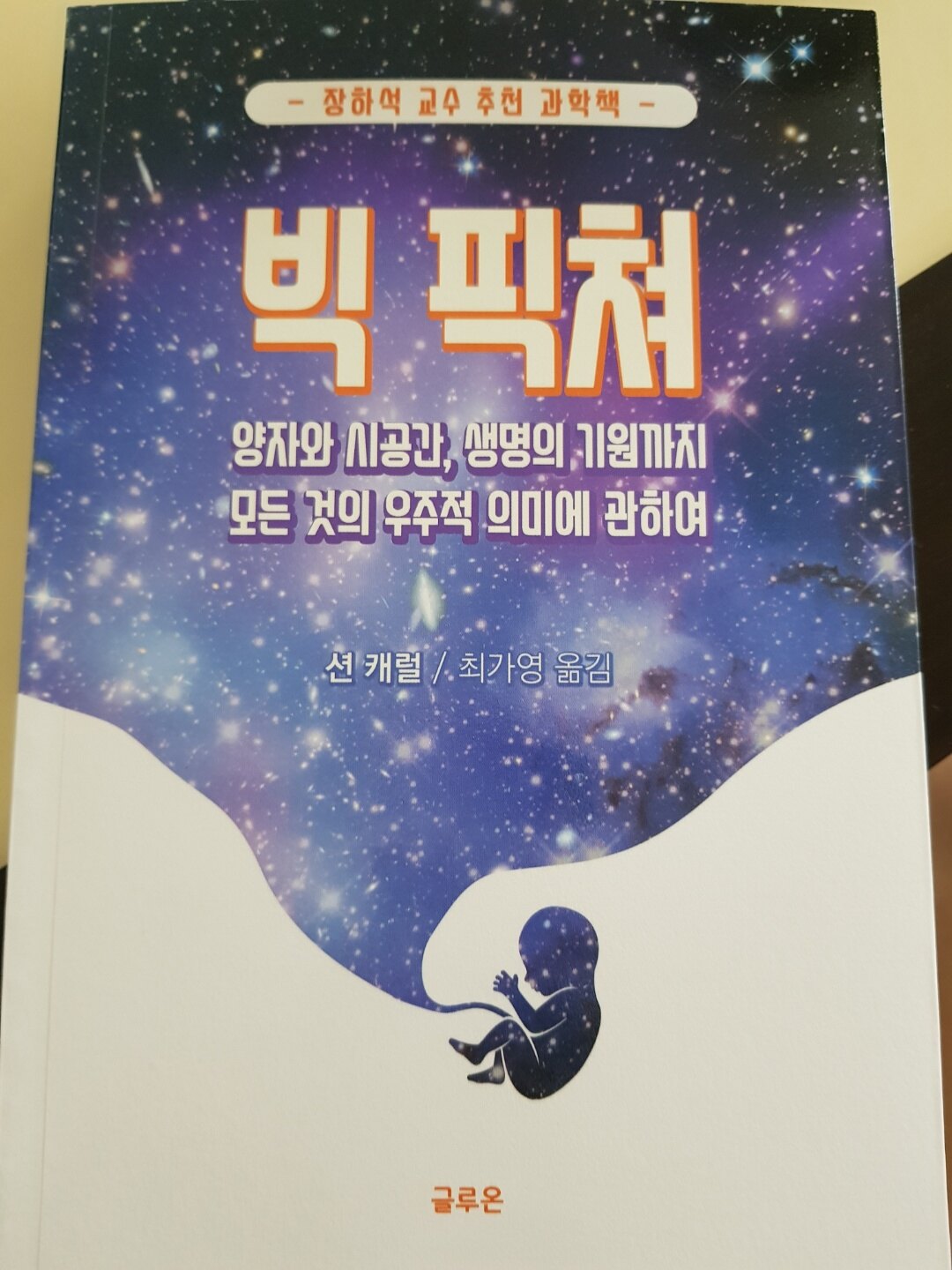
약간 아쉬운 이야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책을 고를 때 가장 눈 여겨 보는 것은 바로 표지다. 책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책의 표지는 책을 얼굴이고, 이제는 사람의 얼굴에서만이 아니라 루키즘은 만물의 첫인상을 결절짓는 천번째 도구가 됐다.
하지만 이 책 <빅 픽쳐>의 표지를 보라. 아기가 있고, 그 아기와 탯줄로 연결된 우주가 보인다. 솔직히 나는 아이가 우주와 탯줄을 통해 연결된 모습이 너무 싫다. 과거 낙태 관련 이야기를 몇 번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책의 표지와 탯줄 그리고 아기의 모습은 괜한 불쾌감을 일으킨다. 그리고 책의 표지 또한 세련된 글씨체도 아니도, 세련된 디자인도 아니다. 마치 1990년도에 도서관에 있는 책과 딱히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다.
디자인에 대한 말이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의 표지와는 전혀 다르다. 뇌색남의 최신 과학 지식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나 해야 할까.
대부분의 과학책들은 대개 확고한 특수성 혹은 독창성을 보기 힘들다. 상대성 이론을 다룬 책이든 양자물리학을 다룬 책이든 아니면 일반 물리를 다룬 책이든. 대개의 책들은 대개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게 딱히 보이지 않는다. 다루는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과거 양자 이론과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책을 읽을 때, 나는 왠지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반복해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더 이상 이공계 관련 책으 안 사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몇자 바꾼 것 혹은, 내용과 내용 사이 약간의 틈세에 있는 약간의 저자의 시선만 읽을 수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 책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책 <빅 픽쳐>는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 과거 이 책을 추천했던 장하석 교수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ebs에서 진행했던 장 교수의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 이었는데, 이전까지 대개 내용이 똑같았던 과학과는 너무나도 다른 책 이었다. 과학 철학과 과학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 했으니 당연하다.
이 책 또한 장하석 교수가 충분히 추천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책을 갖고 있다. 단순히 똑같은 과학의 여러 이론들을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한 책들과 달리, 이 책은 과학의 넓은 범위 즉 과학의 흐름에 대한 역사적 윤리적 통찰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의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됐는지를 넘어서, 과학이라는 세계를 문화학자가 혹은 인류학자가 탐구하고 연구했으며, 과학의 결과물들이 문화적 인류학적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통찰한 책이 이 책 <빅 빅쳐>가 아닌가 싶다.
책의 표지는 애매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책꽂이게 꽂혀져 있을 책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