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 제4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김종옥 외 지음 / 문학동네 / 2013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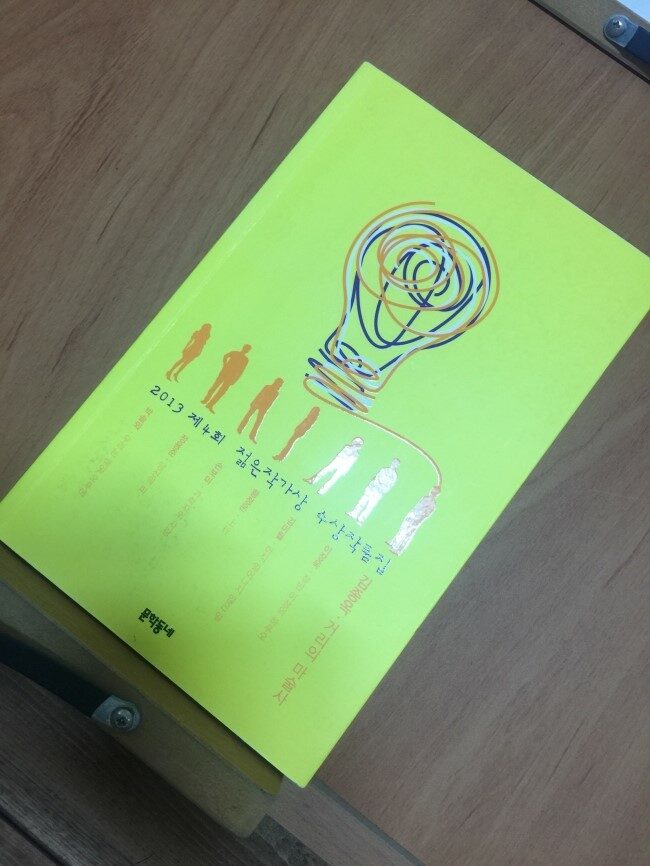
※ 이상한 감상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읽어보는 그런.
스스로에게 일 년에 한 번 씩은 꼭 묻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읽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 쓰는가?"입니다.
근 6년 간, 한 해에 두 번 이상 묻는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묻지 않은 해가 없던 물음입니다.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그때마다 다르면서, 그리 다르지 않아서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져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거라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숙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휘갈기면 그만인 감상(구상은 물론이고, 퇴고는커녕, 다시 읽어보지 않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과 횡설수설이란 말이 대단히 적절하게 느껴지는 칼럼이라 끄적인 글들과 감정과 현상을 뒤섞어 충동적으로 내질러 놓은 시의 아류들.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나 많이, 끊임없이 쏟아내었던가, 오늘 맞닥뜨린 물음은 "왜 쓰는가?"였습니다.
한국의 작가들, 젊은 작가들 중에서도 그 가능성의 싹이 돋보이는 작가들의 작품 발굴이 '젊은작가상'의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작가들은 한국문학의 기대주, 혹은 한국 문학의 현주소 정도의 의미는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기대주들' 이 작가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던 "왜 쓰는가?"하는 질문이 이들 젊은 작가들에게 옮겨간다고 해도 기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궁금한 것뿐이니 말입니다.
『2013년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실린 일곱 편의 단편들은 다른 해에 실린 작품들보다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더 균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옥, 이장욱, 김미월, 손보미, 박솔뫼, 정용준, 황정은.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게도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잘 쓰는 사람들일 겁니다.
김종옥과 이장욱, 정용준과 박솔뫼의 작품은 한참 전에 읽었고, 이번에 마저 읽은 게 김미월, 황정은, 손보미였습니다.
기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반발감, 반항심이 일어난 건 황정은의 <上行>을 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하여, 작가의 노트까지를 읽어보니 작가의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라 합니다. 그 경험이란 나이 든 모녀, 그러니까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마당에 나란히 서서 배웅하던 모습이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上行>은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와 오제가 오제의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 고추를 따고, 감을 따고, 호박이며, 배추며, 은행까지를 받아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읽은 것이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피곤하다며 누운 자세로 읽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를 생각을 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우연',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대단히 충동적인 반항심은 그렇게 불거졌습니다.
처음의 반항심은 시골을 향해 내려가는 차 안의 풍경을 그린 장면에서 생겨났습니다. 첫 장도 넘기지 않았던 시점이니, 어쩌면 처음부터 반항심을 숨기고 페이지를 펼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감정도 없으면서, 참 못된 마음입니다.
오제의 어머니는 나에게 토마토를 먹으라고 건네줍니다. 나는 토마토를 쥐고 있다가 조금씩 먹습니다. 여기서 떠올린 생각이란 역시 엉뚱하고 억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토마토를 만만히 보는 거야? 토마토가 차 안에서 먹기 얼마나 힘든데!"
줄여 적으면 이 정도의 생각을 떠올렸던 겁니다.
아, 토마토는 잘 익어도 여전히 껍질이 질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속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한쪽을 잘못 깨물면 씨와 함께 즙이 터져 나가거나 흘리기 쉽습니다. 그런 토마토를 나에게 건넨 오제의 어머니에게 반항심이 생긴 건지, 감히 차 안에서 소설의 인물에게 토마토를 먹인 작가를 향한 반항심인지 솔직히 지금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차 안에서는 토마토를 먹거나 먹으라고 건네지 말아야지 하고 엉뚱한 다짐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반항심이 일었던 장면도 토마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 밖으로 토마토 꼭지를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깃털처럼 기척도 없이 허공을 날아'갔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꼭지가 말입니다. 차 안에서 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건 기본 소양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꼭지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력'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토마토 꼭지를 창 밖으로 버리다니?"
"게다가, 토마토 꼭지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황당하고 부당한 의문입니다마는 떠올려 버렸으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적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으니 간략히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반항심이 일었던 건 '여긴 00 사람도 없다'라고 자꾸만 거듭 되뇌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골이라고, 사람이 없다고, 자꾸만자꾸만 되뇌는 게 싫었습니다.
그다음은 시골 할머니를 두고 '노부인, 두 부인'하고 부인칭 하는 거였습니다.
서울 사람의 알량한 표현이라는 베베꼬인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했음을 밝힙니다. 촌에 사는 할머니에게 '부인'하는 호칭을 붙이는 시골 사람을 본 일이 없는 제 견문이 좁은 건지 모르겠으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호칭을 쓰다니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저, 다만 '노인'이라고 하면 됐을 것을 굳이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 건너뛰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마르지 않은 고추는 무겁습니다. 자루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루가 가득 찰 때까지 고추밭을 끌고 다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자루를 가득 채워 끌고 다녔다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울 사람의 시골 판타지 소설처럼 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작 이 한 문장을 적기 위해 구구절절 그렇게 많은 말을 해야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래야 했다고, 필요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으면 모를 테니까 말입니다.
"왜 쓰는가?"하는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엉뚱하게도 황정은의 <上行>에서 느낀 반항심을 이어 적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필요했습니다. 조금 전에 적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모를 테니 말입니다.
올해의 "왜 쓰는가?"하는 물음에 적을 대답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입니다.
적지 않으면 모르니까라고 바꿔 적어도 그 의미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누구냐?"하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 어느 쪽이냐 하면 둘 다입니다.
둘이 누구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 자신과 적은 걸 읽는 이, 둘이라고 답할 생각입니다.
사실, "왜 쓰는가?"를 묻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의감'입니다.
"내가 이것을 적어서 무엇이 달라질까?"
"결국 완성시키지도 못하고 언제나 대충 휘갈기고 마는 이 몇 마디 문장의 나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그래서, 누가 이 글을 읽게 될까?"
"이걸 읽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알게 될까?"
"알게 된다고 해서 어떤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무수한 물음에 답하기를 그만두고자 하는 회의감 말입니다.
글이 없으면 물을 이유도 사라질 것이고, 이유가 사라진다면 회의감이 생겨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구구절절,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참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쓰는 걸 간단히 멈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쓰는지 이유도 제대로 모르면서, 뚜렷한 목적도 없으면서 자꾸만 쓰려고 드는 자신이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왜 쓰는가?"하는 물음에 나름의 답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결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왜 읽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글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읽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