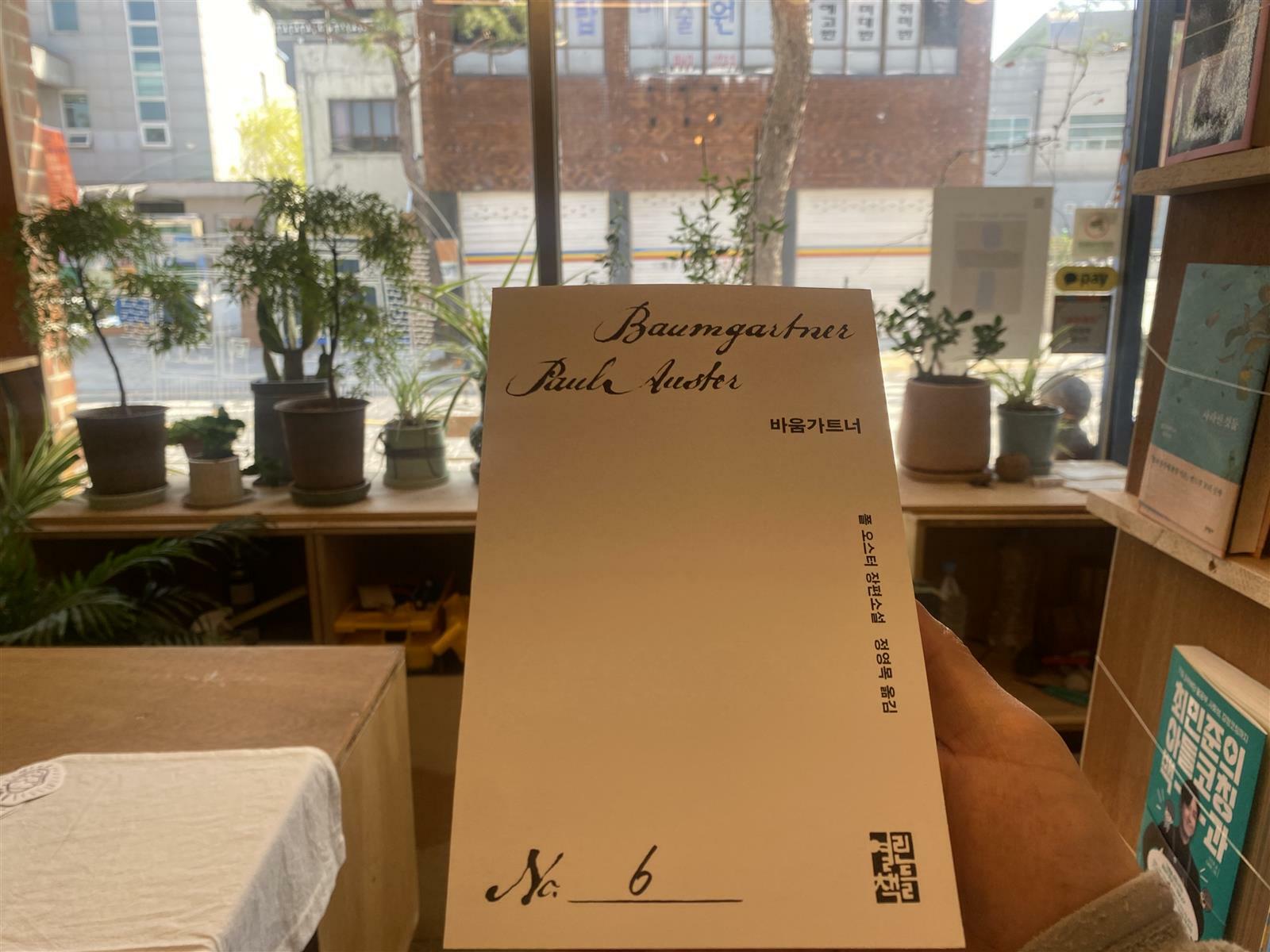-

-
바움가트너
폴 오스터 지음, 정영목 옮김 / 열린책들 / 2025년 4월
평점 :



소설은 혼자 살고 있는 바움가트너가 논문에 인용할 책이 아래층에 있다는 걸 떠올리면서 시작된다. 책을 가지러 내려오는 중에 동생에게 전화하기로 한 걸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마침 전화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 전화를 걸러 가다가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버너에 계란을 올려두고 잊어버렸다는 걸 떠올리고 급한 마음에 맨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아버려 순간 느껴진 뜨거움에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고 비명을 지르며 화상을 입었을지 모를 손을 찬물로 식히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리기에 동생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전기 회사 계량기 검침원이고 통화를 마치고 이번에야말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마침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고 보니 책을 배송하러 온 배달원이었는데 그와 소소한 즐거움인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다시 전화벨이 울려서,,,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바움가트너의 적나라한 삶, 소설 『바움가트너』는 그런 이야기다. 흐르는 시간처럼 끊기지 않고 한 문장으로 구구절절이 이어나갈 수 있는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일어났거나 일어났을 보통의 삶.
10년 전쯤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70대 남자, 그 남자 이름은 바움가트너로 그는 교수였고 지금은 논문이며 글을 쓰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먼저 떠나버린 아내와의 마지막을 회상하며 후회하거나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변화를 주고 싶은, 더 깊은 의미로 지금과 다르면서 과거와 같은 삶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고 있다. 마치 10대 아이들이 호감 가는 사람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고서는 기대하거나 걱정하면서 자기가 고백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를 찾는 것처럼.
만약 한 사람이 평생 가장 사랑한 존재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다면 그를 애도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1년이면 될까, 10년이어도 부족할까. 바움가트너에게는 1년이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10년이 지났어도 부족한 것만 같다. 어지럽게 떠오르고 이어지는 일상의 생각들이 언뜻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거의 모든 순간 아내의 부재를 어떤 식으로든 메꾸기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져서다. 나라면, 내게 소중한 누군가를 아무것도, 아무 말도 못 하고 떠나보냈다면, 상상하는 것조차 싫은 이 생각이 현실이라면 삶은 계속되는 걸까.
소설은 마치 바움가트너 자신의 삶은 이미 10년 전에 끝이 났고 지금은 다만 살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날것 그대로 흐르는 시간을 이어 붙인다. 문장이 길어지거나 반복되거나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것도 그게 삶이어 서일 것이다. 사람이 없는데,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는데 다 늦게, 그토록 나이 든 사람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이 찾아올 수 있는가 묻는 것처럼.
소설 제목이 사람의 이름이 되면 늘 이렇게 고요한 듯 깊고 긴 여운이 되는 걸까. 법이 된 사람의 이름이 그의 사연과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듯, 나와 전혀 무관한, 애초에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허구의 인물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걸까. 어쩌면 작가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때로 작가는 어떤 완벽한 예언을 하기도 하니까.
소설은 살아내는 바움가트너의 마음과 무관하게 너무 간단히, 쉽게, 술술 읽힌다. 의문도 고민도 없이 작가가 펼쳐 보여주는 이야기에 영상을 덧입히듯 어제 내 삶에 있던 대화나 오래전 어딘가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페이지가 나아갈수록 남은 종이가 줄어들수록 바움가트너에게 어떤 형태이든 구원, 변화의 계기가 찾아올까 하는 조바심에 시달렸다. 이대로 지지부진, 머뭇거리다 끝장나는 건 아닐까 하는 허무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스포일러는 좋아하지 않아서 꾹꾹 비밀로 하려니 이야기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
아마 이 소설을 읽는 다른 독자의 마음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적나라한 삶을 마주한 사람들의 태도란 대개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바움가트너에게 그가 적응하지 못한, 상상하거나 일으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오기를. 그가 집필 중인 『운전대의 신비』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까지 온전히 완결되기를. 기적은 있음을.
『바움가트너』는 소설이지만 표지 뒤에 적힌 작가의 약력을 본다거나 이미 작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작가 본인의 이야기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작품의 배경과 작가의 출시지역, 등장인물의 가계와 작가의 혈통, 다른 형태의 헤어짐이긴 하지만 아내의 부재와 그 이후에도 이어진 집필. 마치 작가의 자기 고백처럼 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 작가가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 소설은 진실이지만 모든 소설은 허구고 모든 소설은 작가와 떼어놓을 수 없지만 작가의 삶과 완전히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폴 오스터 유작 출간에 앞서 서평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했다. 오직 100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고 해서 덜컥 신청했더니 선정되었다는 메시지가 왔고 도착한 책에는 No. 6이라고 적혀있었다. 여섯 번째. 다 읽어가는 시점에 정식 출간된 도서를 주문해 두고 감상 적기를 미뤘다. 둘을 나란히 두고 찍어야 어떤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만 주문이 늦어서 지금은 함께 올리지 못한다.
업데이트.
덧붙이기 역시 삶에 흔한 일이니까.
함께 찍은 사진은 뒤에 덧붙이기로 하고, 지금은 지금 있는 대로 기록을 마친다.
새삼, 작가, 폴 오스터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