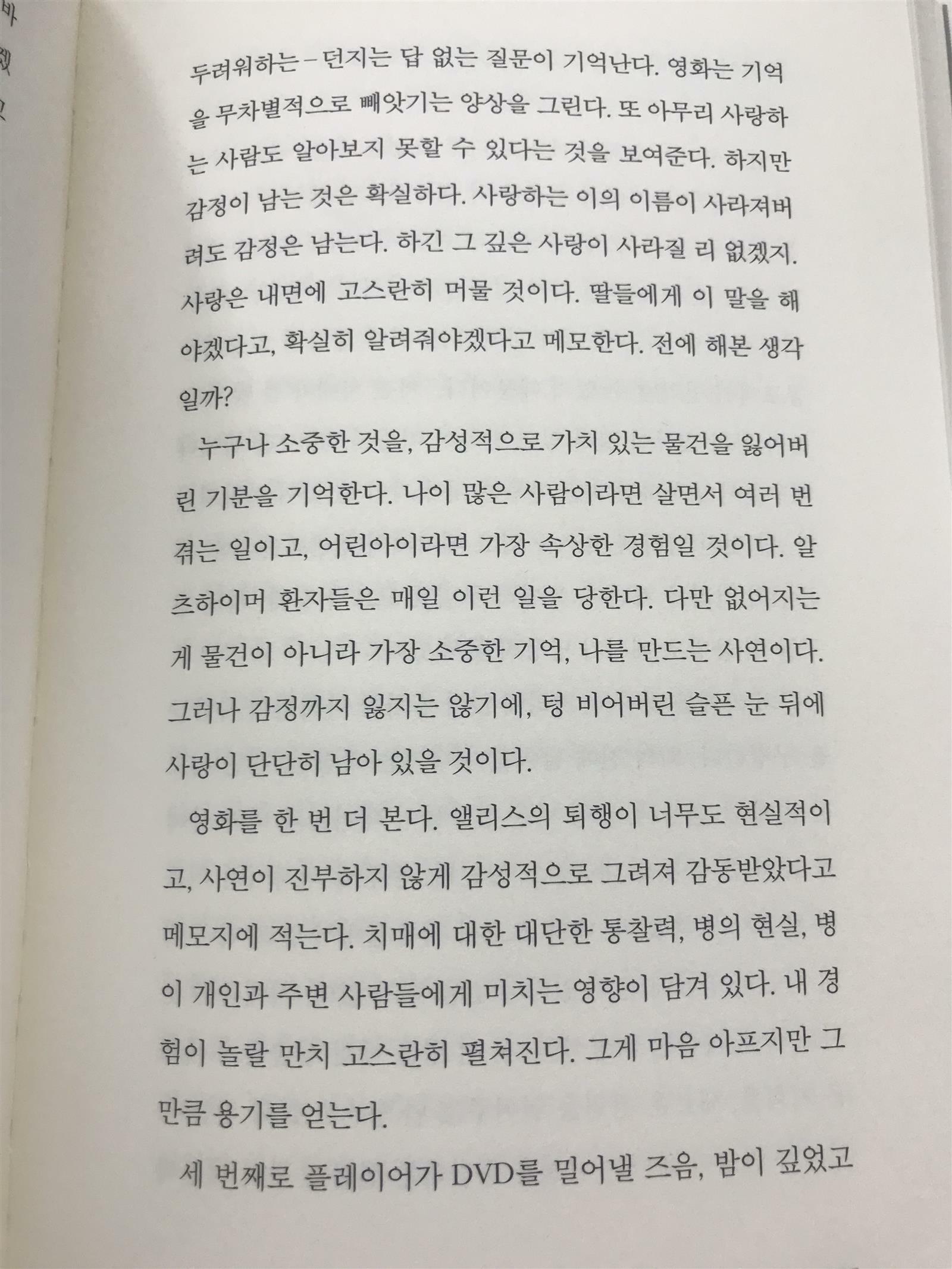-

-
내가 알던 그 사람
웬디 미첼.아나 와튼 지음, 공경희 옮김 / 소소의책 / 2018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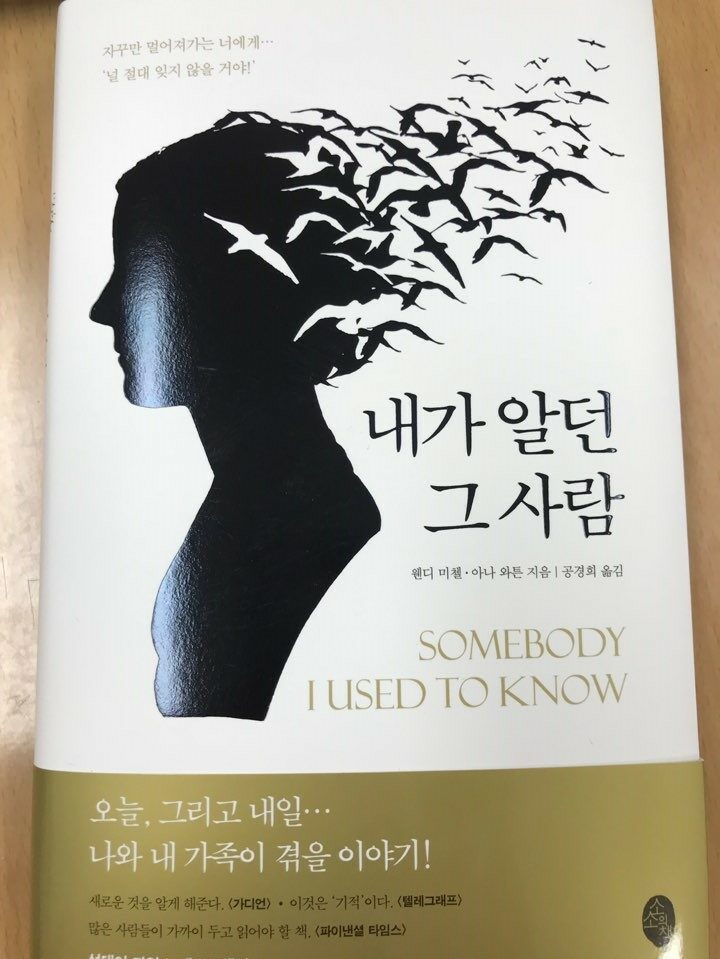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마냥 반갑진 않습니다.
무병장수한다면야 모를까.
쇠잔해지고 노화되는 몸에 질병이 온다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야 만다면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라고 위안해보아도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것만은 결코 사양입니다.
문제는, 몸이나 정신, 마음에 오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마음도 착하게 먹는 등 노력을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질환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알던 사람>의 저자 웬디 미첼이 그런 경우입니다.
58살에 조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
싱글맘으로 두 명의 딸을, 독립적이고도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
NHS(영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의료지원팀장으로
20년 간 그 분야의 '도사'로 불리우며 워커홀릭에 가깝게 일한 사람.
의료분야에서 일한 사람임에도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야
세상과 나라, 정부와 시스템, 심지어는 의료인들 조차도
'치매'에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지 (혹은 포기와 절망적인지) 깨닫는 과정을
차근차근 적어놓으며 '소외감'을 피력하는 부분은
일반인인 우리에게도 거리감을 상쇄시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지위고하,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는 '환자'가 되니까요.
작가가 쓴 책에는 중간중간 '편지글'이 나옵니다.
바로 웬디 본인이 언젠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될 자기에게 쓰는 편지에요.
그 편지를 읽다보면 괜시리 눈물도 나요.
환자 이전의 삶이 모조리 지워지는데, 경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치료약은 요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기억조차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익숙한 '치매환자'하면 떠오르는
병든 노인(주로 여성)이 안개가 가득찬 눈을 초점없이 뜨고
병상의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까봐
두려워 하며, 생의 매 순간을 '나'로 살려는 노력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의 불행이나 아픔을 계기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썩 달갑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노화'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거의 공평하게 주어진 운명이니
남의 일 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읽게 되진 않아요.

영화 [스틸 앨리스]의 큰 에피소드를 제공한
치매 초기, 중기, 말기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기회'가 또 언제 어디서 다가올 지 몰라,
모든 도전과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모습들은
그야말로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혹은 치매 환자가 지인이나 가족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힐링도 되는 에세이 <내가 알던 그 사람>
추워지는 계절, 사람과 삶,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기에 딱 좋은 책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