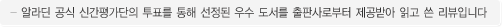[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
김진송 지음 / 난다 / 2012년 12월
평점 :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있다 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과연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예술 분야에서 특히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연극이나 조형물 같은 것을 디자인하면서 일반인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거나 그 만들어낸 조형물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부여 또한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감탄을 자아낼 때가 많다. 간혹 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형 건물의 빌딩 앞에 만들어진 조형물을 볼 때면 저 조형물은 왜 만들어놨는지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다. 나 역시 사물을 보는 것에 있어서 그냥 흘러 넘기지 않고 세세하게 관찰하는 버릇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무언가를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작품 주인공의 창작물로 비로소 완성된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그냥 만들었겠지 하는 생각이 많았지만, 점점 그 분야에 접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나 책을 통해서 접할 때면 대단하다는 사실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 같다. 그들의 생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틀을 항상 벗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독특하기도 하고 무언가 궁금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작가가 이야기보따리를 줄줄 풀어놓고 이야기만 주야장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좀 더 깊이 이 책의 제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책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제목이 궁금해서 책을 읽으라는 의미 또한 아니다. 작가 ‘김진송’ 씨는 시각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목공예를 한 인물이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상상목공소」의 저자이기도 하다. 아직 그의 작품 중 ‘상상목공소’를 접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읽게 된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대단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을 이미지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을 의미한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긴 하지만 흥미롭고 재미있게 생각되는 책이었다. 우리가 대화하던 중 스스럼없이 말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미지로 그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을 모두 나무로 만들어서 기계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도 그가 만든 목공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스케치 역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어쩌면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제가 ‘거미’라면 거미를 똑같이 나무로 만들어 보여 준다거나 ‘물고기에 매달린 여인’이라면 정말 물고기에 매달려 있는 여인과 물고기를 그대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또한, 단지 자신이 만든 목공예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그 주제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처음 접하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의 창작력과 글솜씨나 손재주에 감탄이 절로 나온 것은 사실이다.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기에도 급급할 텐데 어떻게 이야기까지 술술 적어 내려가는지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그의 세심한 작업과정과 그 과정으로 완성된 작품의 완성도는 대단할 정도였고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글이 아닌 이미지로 읽을 수 있는 책을 그는 만들고 싶어했고 도전해보고 싶어했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그는 당당하게 시도한 점도 놀라웠고 그의 손재주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거 말하고자 하는 것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그리고 그가 그 주제의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야기도 사람이 창작이나 실제의 일을 그대로 써내려 간다는 것에 이야기는 사람의 몫이라는 부분이다. 조금 의외의 책이었지만 나무로 만든 기계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읽어내려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색다르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