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행관들
조완선 지음 / 다산책방 / 2021년 2월
평점 :



아무런 사전 정보없이 새로운 소설을 가제본으로 만났다.
조완선이라는 작가를 잘 모른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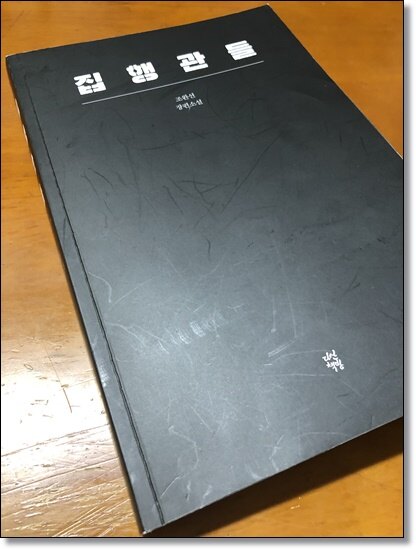
검정 표지가 뭔가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두께에 살짝 당황했다.
4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다.
다산북스의 [집행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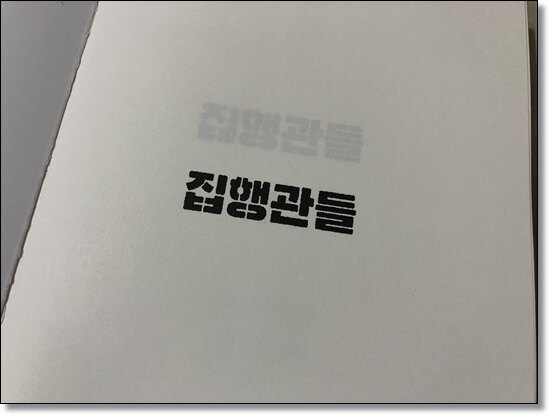
제목을 보고도 아무것도 떠 올리지 못했다.
역사소설이라는 설명은 봤는데 너무 옛이야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차례를 둘러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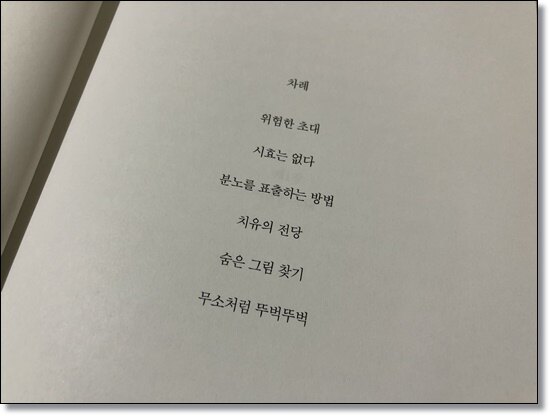
차례를 봐도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럴 때는 읽어 봐야한다.
그리고 한 순간에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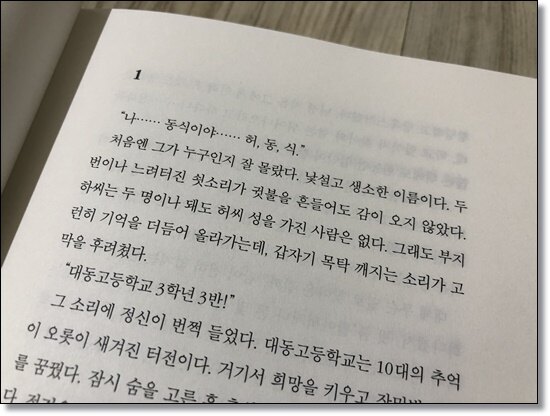
역사학자 최주호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찾아온 고등학교 동창.
(이런 친구들은 조심해야 한다.
소식 한 번 없다가 연락이 오는 친구들 말이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최주호의 칼럼들과 논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인물에 대한 자료를 부탁한다.
인터넷으로는 쓸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부탁이라서 그런지 선뜻 자료를 찾아준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잘 모르는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말이다.
이론 인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쩌면 최주호가 거절을 했더라도 어떻게든 그들과 엮이게 되었을 것 같긴하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전해준 자료 속의 방법대로 한 사람이 살해된다.
흔한 방법이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리고 자신이 전해준 내용이 신문기사로 그대로 인용된다.
누가 봐도 최주호는 살인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긴 이야기를 내가 한 두 줄로 정리하기는 힘들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이 늘 공정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바꿔 나가야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나서서 자신의 화를 표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여기 그 분노를 직접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행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이들은 무리의 이름도 없고, 상징도 없다.
누가 우두머리인지도 잘 모른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 만을 묵묵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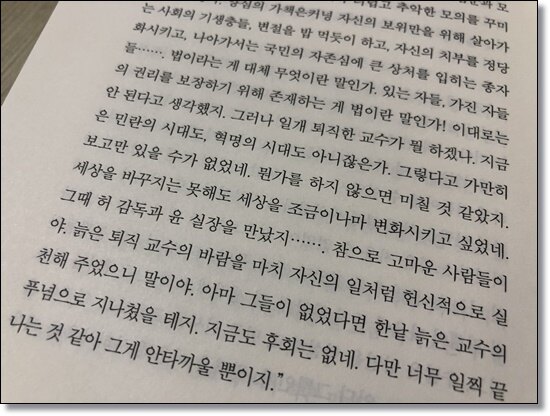
그들의 행적을 쫒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속도가 무진장 빠르다.
책장을 넘겨가다 보면 누구였지? 하고 돌아가서 다시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자세한 설명 없이 이름들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들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속시원함을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나 분노를 안고 산다.
그렇다고 모두 분노를 발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방법도 아니고 말이다.
나에게 집행관의 제안이 온다면?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소시민들이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줄에 메달린 꼭두각시 같은 느낌.
사람들의 분노와 화를 이용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에 화가 났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들을 알고 나서는 앞서 집행관들에게 들었던 감정들이 날아가 버렸다.
세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지려했던 이들도 사실은 누군가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씁쓸한 느낌이다.
잠시라도 통쾌했던 마음이 날아가서 아쉽기는 했다.
이 책을 보고 자기도 집행관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모두에게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위 도서를 추천하면서 다산북스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