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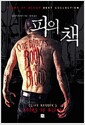
-
피의 책
클라이브 바커 지음, 정탄 옮김 / 끌림 / 2008년 7월
평점 :

품절

공포만 한 즐거움도 없다. (중략) 신의 본질 또는 영생불멸의 가능성을 화제로 삼지 않더라도 우리는 불행의 세세한 면면들을 즐거이 까발린다. 이런 현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탈의실에서처럼 세미나실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된다. 치통이 도지듯, 우리의 입에서는 또다시 공포에 대한 말들이 나온다.배고픈 사람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 앞에서 안달이 난 것처럼. - 286쪽
딱 그런 느낌이었다. 많이 들어 보았던 클라이버 바커라는 이름을 보면서, 벌거벗은 상반신에 새겨진 문자마다 피를 흘리고 있는, 힘이 들어가 굽어진 손가락의 표지를 보면서, '피의 책'이라는 섬뜩한 제목을 보면서, 진수성찬 앞에서 안달이 난 것처럼 나는 <피의 책> (2008, 클라이버 바커 지음, 끌림 펴냄)을 열기도 전에 한껏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대는 460쪽이라는 많은 양의 이야기 내내 충족되었다.
'헬레이저', '캔디맨' 등 호러영화의 감독이자 공포소설의 대가인 클라이브 바커는 <피의 책> 시리즈로 여섯 권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 선별하여 2권 정도로 발간한다고 했다. 원작 시리즈 중 세번째 권까지 중에서 선별한 단편 9편이 이 책에 실려 있다.
시리즈의 제목으로 쓰인 '피의 책'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저승에서 망자들이 한데 섞이고 지나가는 교차로는 현실과 현실을 분리하는 장벽들이 무수한 발길에 닳아 얇아진 곳이다. 이런 저승의 교차로가 있는 폐가에서, 죽은 이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영매 흉내를 내던 애송이 거짓말쟁이가 있었다. 그 사기극을 함께 하던 에식스 대학 초심리학 연구팀의 심리학자 메리 플로레스크는 우연히 저승과 이승의 교차로를 연결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 현실로 다가온 망자들은 거짓 영매의 몸에 문신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 놓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피의 책'은 이 연작 시리즈의 프롤로그와 같다.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 초자연적인 설정, 숨겨진 존재 등을 다루는 시리즈의 내용이, 이 짧은 단편에 모두 들어가 있다.
저자 자신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로 제작하고 있다는 단편들은, 그만큼 세심하고 치밀한 묘사, 숨가쁜 전개가 영화에 꼭 알맞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오는 이야기들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야터링과 잭, 로헤드 렉스),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 (피의 책, 섹스, 죽음 그리고 별빛, 스케이프고트), 집단 광기 (피그 블러드 블루스, 언덕에, 두 도시), 인간의 잔인함 (드레드) 등은 공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담고 있다.
어디를 펼치든 모두 붉다는 설명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의 이야기들에는 피와 공포가 흐른다. 죽은 자와의 입맞춤으로 죽기도 하고, 수만명의 사람이 한 자리에서 죽어 피가 강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사람을 통째로 씹어 삼키는 괴물이 나오기도 한다.
1984년에 처음 쓰여지고, 1998년 개정판에 붙인 저자 서문에서, 과거에는 고함을 치면서 드럼을 두드리고 과장을 일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 우리 영혼에 깃든 어둠과 마주치는 기회들로서의 이 이야기들은 그의 설명처럼 과장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억지스럽거나 우격다짐인 진행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될지 알면서도 눈을 감지도 못하고 멍하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다.
<피의 책> 시리즈 이후에는 저주보다 구원의 이미지에 몰두하고자 하였으나, 데뷔작인 <피의 책>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익숙한 거리에서 어둡고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굽잇길'이고 다만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공포만 한 즐거움도 없다.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면. - 2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