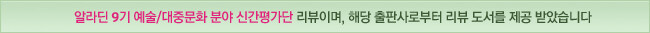[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 기억 속의 색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미셸 파스투로 지음, 최정수 옮김 / 안그라픽스 / 2011년 8월
평점 :



'색' 가지고 이런 에세이를 쓰다니. 이색적이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다. 그것도 저자의 직업이 색과 관련된 직업 이를테면, 화가나 디자이너도 아니다. 특이하게도 역사학자다.
색 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그리도 많을까 싶었는데, 모르긴 해도 저자는 박식하기도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기저기 '색'이란 스펙트럼을 들이대고 잠시도 가만히 쉬질않는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신화, 그중에서도 문장(紋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어떻게 들으면 색과 문장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문장의 화려한 색을 보면 그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하다.
읽다 보니, 어린 시절 내 동생이 생각이 났다. 초등학교를 갓 들어간 동생은, 봄날씨라고 해도 바람은 아직 쌀쌀한 기가 남아 있어 엄마는 셔츠식으로 된 조끼를 입혀 학교에 보냈다. 얼마 전, 가끔 집에 들리는 보따리 장수에게서 산 조낀데, 곤색과 빨간색의 조합이 어린 내가 보아도 제법 괜찮았다. 그런데 동생은 학교 갈 땐 분명 그옷을 입고 갔지만, 돌아 올 땐 벗고 돌아왔다. 엄마로선 의아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을 텐데, 제깐엔 빨간색은 여자색이라고 해서 창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녀석이 그럴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안 그랬다간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 테니 나름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긴 하다. 남자는 뭐 때문에 빨간색을 여자의 색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일까? 그건 여자인 내가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 보통 빨강을 비롯해 분홍이나 주홍색 또는 오렌지색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이고, 파란색이나 하늘색 또는 회색이나 검정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키워지기 보다, 남자와 여자의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 본 것 같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색에 대한 편견이나 미신이 얼마나 많은가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빨간색은 여자색일지는 몰라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들 터부시 하는 색깔이기도 하다. 더구나 악마를 떠올릴 때 검정색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빨간색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 빨간색은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선 할증을 매길 정도였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많다고 해서. 물론 이건 1970년대 프랑스에 해당되는 말이다(91p).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요소도 있으니 나름 그럴만도 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오늘 날, 녹색 계열의 색은 사람의 시각뿐만 아니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각광 받는 색이지만 역사상 이 색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하니 의외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색을 보는 눈이 민감해야 할 역대의 화가들이 색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건 확실히 미술사에 있어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미술사를 연구함에 있어 화가의 작품에 대해 할 말은 많아도 색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고 하니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1970년대까지 그랬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색채가 논의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겠다(172p). 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책에 경의를 표하고 싶어졌다. 저자는 그 사실을 알고 깜짝놀랐다고 한다. 거의 처녀지나 다름없는 색의 역사에 관한 자신의 연구가 학계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거란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에 과감히 자신을 던졌다는 것이 존경스럽지 않은가?
색은 오늘 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스포츠,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풀어 색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낸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서 에세이를 썼다.는 것이 이 책이 갖는 장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문장은 때로 위트가 있기도 하다. 과연 메디치 상 에세이 부문에서 상을 받을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단, 에세이라고 만만히 볼 건 아니다. 쉽진 않지만 지적이기도 하고, 에세이의 새로운 분야를 접한 것 같다 독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이런 책 우리나라 작가도 쓸만하지 않을까? 쓴다면 이책의 저자 보다 훨씬 잘 쓸 것도 같다. 색을 지칭하는 어휘면에서 우리나라를 따를 나라가 없을 테니 말이다. 앞서 빨간색도 한 가지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붉다. 불그스름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색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면 오죽 잘 쓸까? 웬지 저자 보다 선수를 놓친 것 같아 읽으면서 아쉬움이 생겼다. 한번쯤 읽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