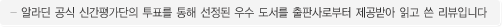[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 - 두번째 무라카미 라디오 ㅣ 무라카미 라디오 2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권남희 옮김, 오하시 아유미 그림 / 비채 / 2012년 6월
평점 :



얼마전에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 다녀왔다. 이런 영화제에 가면, 영화평론가도
아니고, 영화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에 두세편씩
열심히 영화를 보게 된다. 혼자도 보고, 친구랑도 보고.
어느 날은 같이 사는 짝꿍과 영화를 보게 됐다. 시간이 맞아서 친구 둘도 합류해서 총 네 명이
오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다른 영화관으로
옮겨서 한 편을 봤다. 영화관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실 시간은 없었다. 영화 두 편을 보고, 영화관에 쇼핑몰이 붙어 있어서 잠깐 쇼핑을
하고, 부천에 사는 친구네 커플을 불러서 맥주 한 잔을 했다.
영화는 재미있었고, 오랫동안 미룬 쇼핑을 잠깐 사이에 끝냈고,
친구 결혼 뒤 처음으로 커플 모임을 하고, 친구의 신혼집 구경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탔다. 이것저것 알찬 시간을 보내서 보람차고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짝꿍이 “오늘 하루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 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종일 한 게 논 일밖에 없는데.” 하는데, 나도 웬지 피곤했다.
그 다음 주에 보고 싶은 영화가 추가 상영을 해서 다시 부천에 갔다. 간김에, 하는 생각에 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지만, 꾹 참고 한 편만 예매를
했다. 그리고 오전에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 갔다. 날은 여전히 더웠고 카페는 조금 멀리왔다.
커피를 시켜놓고, 5분쯤 앉아있는데, 짝꿍이 “아, 여유있는 시간, 참
좋다.” 하는 것이다.
“뭐야, 달랑 5분만 고요히 앉아있으면 충족되는 욕망이었던 거야?” 하며 웃었는데, 나역시 정말 묘하게 여유있는 하루라는 기분이 들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는 별로 쓸데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어떤 에세이는 정말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장실에 갈 때 가지고 가게 된다. 바쁜 아침 시간에 한 편 읽으면 앞에서 말한 ‘5분’ 그 5분 같은 기분이
든다.
한 편 읽는데 5분쯤밖에 안 걸린 짧은 에세이가 오늘 여유있는 하룬데, 라는 기분이 들게 한다.
제목에 나온 암호같은 문장 ‘채소의 기분’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영화에 대사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화 속 노인이 “꿈을 좇지 않는 인생이란 채소나 다름없다.”는
멋진 말을 내뱉었는데, 남자아이가 “그런데 채소라면 어떤
채소 말이에요?” 하고 돌발질문을 한다. 노인은 당황하며
“글쎄, 어떤 채소일까. 그렇지, 으음, 뭐 양배추 같은 거려나?”
하고 얼버무리는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는 거기서 ‘생각해보면 채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채소마다 마음이 있고 사정이
있다. 하나하나의 채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인간으로서의 내 인생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무심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뭔가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집는 건 좋지 않군요.’라는 결론으로! 엉뚱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개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건 왜일까. 채소의 기분을 생각해보게 된다.
‘바다표범의
키스’는 몸에 좋다는 바다표범 오일을 먹은 이야기다. 그
맛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위로 커다란 바다표범 한 마리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제쳐 억지로
입을 벌리고 뜨뜻미지근한 입김과 함께 축축한 혀를 입안으로 쑥 밀어넣은’ 것처럼 비렸단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자기 에세이에 대한 내용들이다.
‘내게도 에세이를
쓸 때의 원칙, 방침 같은 건 일단 있다. 첫째, 남의 악담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기(귀찮은 일을 늘리고 싶지 않다.) 둘째, 변명과 자랑을 되도록 쓰지 않기(뭐가 자랑에 해당하는지 정의를 내리긴 꽤 복잡하지만) 셋째, 시사적인 화제는 피하기(물론 내게도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그걸 쓰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진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며 에세이를 연재하려고 하니….쓸데없는 이야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비교적 좋아하니 그건 그것대로 상관없지만, 때로 “당신 에세이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다. 흐물거리기나 하고 사상성도
없고 종이 낭비다” 같은 비판을 받을 때가 있다. …
옛날 미국 서부의 술집은 대부분 전속 피아노 연주자를 두어 밝고 티없이 맑은 춤곡을 연주하게 했다. 그
피아노에는 ‘피아니스트를 쏘지 말아주세요. 그도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
피스톨, 갖고 있지 않으시죠.’
아, 이런 글을 봤는데 어찌 당신 에세이는 아무 메시지도 없다.
흐물거리기나 하고 종이 낭비라고 할 수 있겠나.
거기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에세이를 읽지 않겠지만.’ 이라는 문장을 보니 뜨금하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정말로 슬펐던 적이 몇 번 있다. 겪으면서 여기저기 몸의 구조가 변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음악이 있었다, 라고 할까, 그때마다
그 장소에서 나는 뭔가 특별한 음악을 필요로 했다. …음악은 그때 어쩌다보니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걸 무심히 집어들어 보이지 않는 옷으로 몸에 걸쳤다.
사람은 때로 안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음악에 실어 그것의 무게로 제 자신이 낱낱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음악에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 소설에도 역시 같은 기능이
있다. 마음속 고통이나 슬픔은 개인적이고 고립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더욱 깊은 곳에서 누군가와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공통의 넓은 풍경 속에 슬며시 끼워넣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소설은 가르쳐준다.
내가 쓴 글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
짝꿍이 “이 책 재밌어?” 묻는다. “뭐, 급하게 읽을 책은 아니야.
시간날 때 천천히 읽어.” 했다. 카페에서 5분이 필요한 순간, 별쓸데없는 이야기에서 묘한 위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