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보들의 결탁>을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바보들의 결탁>을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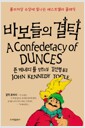
-
바보들의 결탁 - 퓰리처상 수상작
존 케네디 툴 지음, 김선형 옮김 / 도마뱀출판사 / 2010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요근래 왠만큼 끌리지 않으면 책 날개를 읽지 않고 그저 흘깃 보고는 넘겨버리는 좋지 않은 버릇이 들었다. 작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야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을 터인데, 그 통과의례를 나는, 가벼이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이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헌데, 워커 퍼시 -「바보들의 결탁」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가 쓴 서문이 날 멈춰버리게 했다. 책의 끄트머리도 아니고, 서문에서. 내가 책 날개를 다시 펼친 것은 그때였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라도 한 듯, 무척이나 자연스레 또 뻔뻔하게. 「바보들의 결탁」의 저자 ‘존 케네디 툴’은 이 책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원고를 완성시켰으나,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을 거절당하고, 계속되는 원고 수정과 출판사들의 퇴짜, 어머니와의 불화로 생긴 우울증과 편집증으로 1969년 서른두 살이라는 창창한 나이에 자살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멀고 먼 길을 택하게 된다. 본격적인 책의 첫 글자도 읽기 전, 읽으려는 작품의 저자가 생을 마감했다는 문장은 당황스러운 적막을 선사했고, 급기야 숙연함까지 깃들게 했다. 그렇다고 하여, 여지껏 다른 저자의 유작을 읽은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으려던 이 작품은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단 한 권의 유작이라는 점은 안타까움이라는 한 단어로 치부해버리기엔 약간 모자란 듯함을 느끼게 하고, 다 읽고 난 후엔 유문 -이그네이셔스가 자주 칭하던- 속에서 똬리를 트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초록색 사냥모자가 살덩어리 풍선 같은 머리통 윗부분을 쥐어짜듯 꾹 덮고 있었다. (…) 북슬북슬한 검은 콧수염 밑으로는 두툼한 입술이 일자로 앙다문 채 툭 불거져 있었고, 양쪽 입아귀는 불만스런 기색과 포테이토칩 부스러기가 덕지덕지 달린 잔주름이 되어 쑥 꺼져 있었다. (…) 코끼리 같은 몸짓으로 육중한 엉덩이를 한쪽씩 들썩이며 쿵 쿵 제자리걸음을 걷자 부픗부픗한 살들이 트위드 바지와 플란넬 셔츠 밑에서 잔물결을 일으켰고, (…) ㅡ 이토록 괴상망측한 그의 이름은 ‘이그네이셔스J. 라일리’ - 그는 관절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어머니를 홈스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는 중인 게다. 벌써부터 그는 용의주도하게 단어를 고르고 골라 어머니께 퍼부을 비난의 문장을 다듬고 있었다. 후회하게 만들거나, 그게 안되면 혼이라도 쏙 빼놓을 작정이었다. 어머니가 분수를 깨닫도록 자주자주 쓴소리를 해줘야 했다. 이런 막돼먹은 아들을 두다니. 아, 불쌍한 ‘라일리 부인’. 하지만, 라일리 부인도 만만치는 않다. 부인의 과음으로 인한 음주운전은 서른 살에 만년 백수인 아들을 억지로 그가 빅치프 노트에 써놓은 벌이를 해야만 하는 변태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독자는 새로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멀쩡하랴. 책은 그 사회의 일원이 된 이그네이셔스를 조명한다. 아니, 끝이 보이지 없는 그의 벨탄샤웅(세계관)이 더 이상 빅치프 노트가 아닌 현실에 반영되는 순간부터 그가 만들어 내는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을 조명한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읽는 동안, 피식피식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 웃으면서도 마음껏 대놓고 하하하 - 거리며 눈물나게 웃을 수 없고, 그럴 거리도 내게는 없었음을 밝힌다. 또한, 무엇인가가 묵직하게 눌러 앉아있는 느낌 또한 지울 수가 없다. 빅치프 노트에 중세를 흠모하고 타락한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장문의 고발장을 기가 막히도록 써내어 내가 알고 있는 그가 맞나? 하다가도, 그의 저속한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역시나, 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든다. 급기야 도대체 이 인간,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내 눈에 그는, 그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부적응자‘와도 다를 것 없다는 것이다. - ‘존 케네디 툴’이 ‘이그네이셔스’를 통해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를 통렬하게 풍자하려고 만들어 낸 인물이라면 사실 목적은 제대로 달성한 셈이다. ‘이그네이셔스’라는 인물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희생양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라는 사회(혹은 라일리 부인)와 그것을 거부하는 이그네이셔스 - 그것의 간극에 우리는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따르고 있는 현대인인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그네이셔스를 동정할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는 게다. 그런 인간이라면 혼쭐을 내줘야 하는 것이 맞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정신병원에 처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인 까닭이다.
나아가 이그네이셔스라는 인물은 나를 비롯한 현 시대 젊은이들의 군상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대학을 졸업한 동시에 4년을 눌러 앉아 석사 학위까지 땄으며 앞서 말했듯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고발장을 쓸 정도로 -내 보기엔 과대망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유능한(?) 인물임을 간간히 일러주고 있다. 하지만 그의 취직 거부 사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벨탄샤웅(세계관)을 두려워하고, 증오한다는 까닭이다. 게다가 허세는 어찌나 대단하신지.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급료가 적정 수준이 아닌 듯한데요. 석유계의 어떤 거물이 현재 저를 개인비서로 쓰겠다고 수천 달러를 흔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제가 그 사람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받아 들일 수 있을지, 결정을 고민하는 중이죠. 최종적으론 그 사람한테 ‘종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바로 이것이다. 대학, 대학원, 학위.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는 이 곳은 나와 맞지 않아, 내가 원하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니야, 라며 소위 말하는 대기업 - 물론, 이그네이셔스의 목적은 대기업이 아니었지만- 에 취직하려고 눈을 밝히는 영락없는 우리네들 모습인 게다. 그것은 위에 발췌해 놓은 ‘리바이 팬츠’에서 월급을 상향조정하는데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실 난 영미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딱 잘리는 문장들이 힘은 있을지언정 그 흔한 정이 없어 보인다는 것과, 재미있다는 그 문장들의 행간이 내게는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그 까닭이다. 그러나 이 책, 영미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나도 킥킥거리며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다. 읽으면 읽을 수록 작가가 강한 확신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된 까닭도 그곳에 있다. 그의 다음 작품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겠지만, 그만큼 라일리 부인의 ‘대관절’ 타령과 클로드의 ‘빨갱이’ 타령과 무엇보다 이그네이셔스의 이미 단물이 쪽쪽 빨려 나를 웃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유문’ 타령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서문에서 세 번째 읽었을 때가 처음 읽었을 때보다 더 경이로웠다는 워커 퍼시의 말처럼 나도 두번 째 읽을 때가 언젠가는 오길, 기대해본다.
오탈자 : p20 : 15째줄 : 따옴표 ”
p258 : 12째줄 : 이그타니우스 → 이그네이셔스
p464-468 : 따바, 내나, 안대 (라틴 여자의 말이라고 일부러 써놓은 것 같지만, 계속되는 반복에 신경쓰이는 것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