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봄이 왔는데 약간 쌀쌀한 맛이 있어서 '봄기운'이란 걸 만끽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다. 황사는 이제 제발...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은 전부터 봐야지 하면서도 아직까지 손에 쥐질 못했다. 일단 회화와 라캉을 한데 묶어서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느낀 작가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응시'라는 큰 무기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러한 주제보다는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가령 홀바인의 '대사들'이란 그림은 많은 책에서 다뤘는데, 이렇듯 눈요기가 될 만한 그림들과 라캉의 자극을 겹치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성과물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책을 과연 누가 원하겠는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블로그나 페이퍼에 재기 넘치게 써도 될 듯 하다. 그럼 이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은 어떨까? 일단 간단한 책 소개와 목차를 보건대, 예상가능한-가벼운 진행에서 벗어나 있다. 연관된 그림들의 순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캉의 개념에 저자의 시각을 가미해 더 새로운 지적 활력을 불어넣은 듯 하다. 이런 긍정적인 예감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책을 만나야 할 것 같다.
올해는 라캉에 관한 책이 좀 뜸하다 신간이라 할 수 있는 책은 <자크 라캉과 성서 해석> 정도이다. 작년에 나왔지만 라캉과 지젝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라캉과 지젝>도 한 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들뢰즈 책 역시도 요새 신간이 드물다. <들뢰즈 철학과 예술을 말하다>는 제목에서 보듯이 들뢰즈와 예술를 다룬 책이다. 이런 주제는 이미 외국 학자들이 쓴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 저자의 책으로 만날 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소개도 별로 없고 목차도 단순해서 예상하긴 어렵다.
<데리다를 읽는다 / 바울을 생각한다>는 그냥 데리다에 관한 책이라면 흥미가 없었을 텐데, 바울을 겹치기 하면서 '법과 정의'라는 주제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눈이 간다. 이런 책은 담고 있는 지식보다는 그러한 것을 풀어내는 저자의 독창적인 과정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데리다"로 불린다는 키틀러의 <광학적 미디어>는 어떤 책들보다도 더 눈을 사로잡는다. 제목이 주는 '광학'이 한정된 느낌을 주지만, 목차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카메라 옵스큐라'부터 사진, 영화에 걸쳐 저자의 특별한 지적 여행이 펼쳐질 것 같은 예감..
(영상) 미디어 미학에 관심이 있다면, 목차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아는 미디어 이론과 키틀러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 책,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오뒷세이아>도 뭔가 새롭다. 제목만 봐서는 아도르노가 오뒷세이아에 대한 글을 썼는가, 싶은데 그건 아니다. 지은이 클로디 아멜이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의 대표작 <계몽의 변증법>에 맴도는 사유를 통해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의 부분들을 다시 읽는 재미있는 시도가 담긴 책이다.





신경과학(신경생리학)과 정신분석학의 만남이라고도 하는 '신경정신분석학(neuro-psychoanalysis)'에 관한 책이 한 권 보인다. <뇌와 내부세계>가 그것인데, 이쪽 분야의 책이 이렇게 없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내가 못찾아서 그런건지도.. 어쨌든 신경정신분석학에 대한 맛을 느끼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다.
샐리 사텔의 <세뇌>는 신경과학이 과학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너무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았냐 하는 약간의 반성, 비판 의식도 담긴 것 같다. 프로이트 이론들도 이제는 그러한 뇌과학의 위세 앞에서 많이 움츠려들지 않았는가? 과학을 통해 뇌, 심리에 접근하는 학자들 중에는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입김이 강하긴 하다. 그러나 프로이트 이론에서 어느 부분은 수용하려는 학자들도 분명 존재한다. 프로이트에게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야 할지-이러한 분명한 판가름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붓다의 과학 이야기>라는 긴 제목을 가진 책을 잠깐 보자. 제목은 무슨 청소년 대상 도서인가 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부제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진화생물학과 뇌과학 불교를 만나다- 이다. 그럼 대충 어떤 책인지 감이 올 것이다. 목차의 내용을 보면, 여태 불교와 과학을 묶은 책들과는 다른 색다른 풍경이 그려진다.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픈 그런 책이다.
'분열'과 '강박', 이 둘은 정신병에 속한다는 건 대개 알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되짚어가는 재미있는 발상이 담긴 책이 있다. 바로 <분열병과 인류>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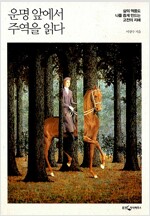
'주역'에 관한 새로운 책들이 보인다. 우선 <역 위대한 미메시스>는 제목에서부터 주역의 고루한 이미지가 씻겨 나간 듯 말끔하고 세련되어 보인다. 현대 인문학의 관점과 글쓰기 스타일이 묻어나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보다는 주역에 대한 현대적 감수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학자의 책 <대역지미 주역의 미학>은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주역'을 미학이라는 줄기로 해석한 책이다. 아마 새로운 방법이고 접근이지 않을까? 주역! 오래되었지만 참 재미있는 그 무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