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6월 독서정산
1. 밀란 쿤데라 저, 이재룡 역, 『정체성』, 민음사(2012), 완독

초반의 서사는 흥미로웠다. '더는 남자들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샹탈의 고백과 그녀를 욕망하는 익명의 편지를 보내는 장마르크의 행동, 그리고 그 익명의 시선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샹탈의 모습. '결국 어떻게 될까?'를 묻게 만드는 초반의 흡입력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현실과 상상, 꿈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읽은 내용이 꿈인지 인물들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호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 흡입력도 사라졌던 것 같다. 솔직히 책을 좀 더 깊이 읽어보지 않는 이상, 쿤데라와 이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어떤 실험을 하고자 했던 건지, 인간 실존의 어떤 부분을 탐구하고자 했던 건지 잘 알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생각해볼 키워드는 많았다. '여성으로서 나이를 먹는다는 일', '정체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정체성과 타인의 시선과의 관계' 등등.
두 달을 돌아보며
1. 책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책을 열어본 후 겨우 그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마침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신없이 읽기 위하여 나의 방에까지 한걸음에 달려가던 그날 저녁으로 나는 되돌아가고 싶다." 좋은 책을 발견해 부푼 마음을 안고 설레하며 달려가 책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자 하는 욕망을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 카뮈가 그르니에의 책 "섬"에 바친 헌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2. 이 구절을 떠올릴 때면 그리움과 아득함이 느껴진다. 책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한 10여년 전, 독서관에서 이런저런 책을 살펴본 후 대출해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던 그 때에 대한 그리움과 아득함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3. 지금은 책에 대한 마음이 양가적이다. 호기심과 지적쾌감, 끝이 없는 욕망의 대상이자 의무감의 대상. 분명 시작은 전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후자가 강하다. 뭐를 읽어야 하는데, 뭐를 읽고 글을 써야 하는데 등등.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그냥 재밌는 책을 읽었고 그 재미남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헛소리를 많이 지껄였다. 개똥 철학을 늘어놓아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매일 읽고 쓸 뿐이었다.
4. 지금은 더 깔끔한 글, 정돈된 글, 써야만 하는 글과 같은 키워드들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려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 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하반기엔 다르게 접근해보기로 했다.
5. 그때 그 설렘을 안고 책을 보던 때로 돌아가보기로 했다. 그때 나를 사로잡았던 인물들, 책들을 다시 보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밀란 쿤데라였다. 특히,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복했던 철학 공부도 이 소설의 앞 부분에 나오는 니체의 영원회귀로부터 시작됐다. 여러모로 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작가와 책이었다. 그래서 정했다. 올 하반기에는 쿤데라 읽기에 집중해보자고.
쿤데라 책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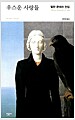
아직 소장하고 있지 않은 책들이 꽤 있었다. 1) 우스운 사랑들 2) 불멸 3) 느림 4) 만남 5) 향수 6) 이별의 왈츠 7) 소설의 기술 8) 배신당한 유언들 9) 자크와 그의 주인. 읽어 본 책들은 1) 참존가 2) 농담 3) 삶은 다른 곳에 4) 정체성 5) 웃음과 망각의 책(읽는 중). 6개월 동안 쿤데라만 볼 건 아니지만 좀 깊게 파볼 생각이다.
기타
이와 별개로 로벨리의 The Order of Time도 같이.